-

-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 - 버럭엄마의 독박육아 일기
이미선 지음 / 믹스커피 / 2019년 7월
평점 :



[리뷰]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독박 육아는 고된 것

예전 세대가 결혼은 반드시 하고 아이는 반드시 둘 이상 낳아야 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최근 젊은 세대는 결혼은 선택이고, 결혼을 한 뒤에도 아이를 갖는 문제는 부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대부분 대가족 형태였기 때문에 엄마가 집안의 다른 구성원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워낙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힘들게 살았다. 하루종일 일에 시달리다 밤이 되어 겨우 잠자리에 누워도 다 함께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려니 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더이상 집에 아이를 봐 줄 사람도 없다. 어떻게는 부부 둘이서 해결해 나가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한 명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소환하거나 이 둘 모두 여의치 않을 때는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물론 직장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드물고 입소하기 위한 경쟁률도 장난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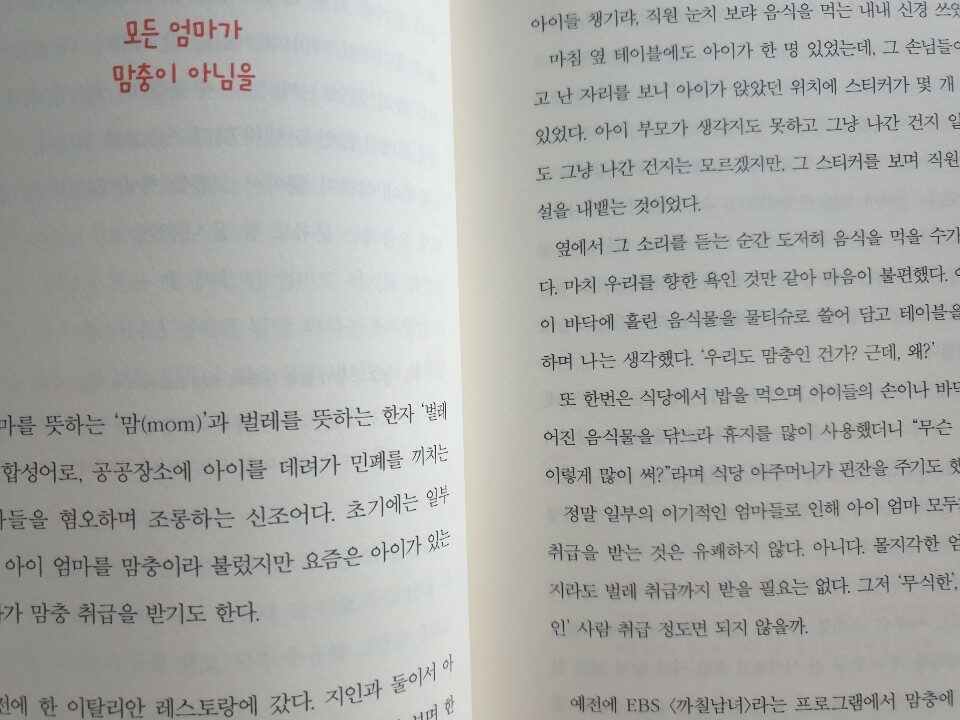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는 이런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다. 제목에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난다. 아마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의 소원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독박육아'라는 단어에서 독박보다는 '육아'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랐다. 저자의 남편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를 낳고 둘째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고, 결국 더 많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를 보면 참, 대한민국 엄마들의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여자'가 아니라 '엄마'라는 무성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육아책을 읽고 아이에게 잘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버럭버럭' 소리지르게 되고 아이들이 잠 들고 나면 후회를 하곤 한다.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의 편, 남편놈이 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따뜻함으로 가득차는 마음,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다.
힘든 육아 생활이 나와 있는데도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를 힐링 도서로 분류하였다.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박육아를 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육아를 하며 살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 이런 공통 경험의 진술이 때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한다. 힘들지만 사랑스러운 내 아이,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니까 말이다.
출산 경험을 살짝 보자면 출산 느낌은 엉덩이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느낌, 또는 항문에 수박이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는 상상했던 것만큼 예쁘지 않다. 쭈글쭈글하고 빨갛고 그렇다. 게다가 커뮤니티에 많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출산 시에는 굴욕 3종 세트를 겪어야 한다. 여자 의사선생님을 원한다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산후조리원의 비싼 비용에 고민하는 모습, 출산 후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해 여기저기 몸이 쑤시는 증상, 분유와 모유 사이의 고민, 예쁜 내 옷보다 아이의 옷에 먼저 손이 가는 증상, 아이를 직접 공부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 우아한 엄마는 커녕 목 늘어나는 티셔츠에 추리닝을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모습, 육아의 고됨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 등 일상적인 모습이 가득하다. 아마 엄마들은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지도 모른다.
나만 육아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육아가 너무 고되게 느껴진다면 <가끔은 엄마도 퇴근하고 싶다>를 읽어보기 바란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엄마들은 대체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시집살이 때문에 다투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아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확인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빨리 크기를, 또 한 편으로는 천천히 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