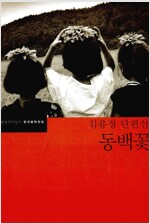공공서재에 다녀오다. 납기일을 갓넘긴 책들을 마저 마무리짓고 반납할 마음으로 산책을 나선다. 제법 쌀쌀하여 모자와 장갑을 챙겨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보름달은 어김없이 구름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동백꽃들은 화투장처럼 화사하게 마중나와 반긴다. 팔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 신간을 뒤적이다 몇권 함께 추스린다.
1. 근대일본의 사상가들을 따로 챙겨볼 만하다 싶고, 그리스에 대한 책 가운데, 보고 있던 책의 소크라테스의 죽음편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전공분야 교수인데도 서술의 관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예전 묵자를 읽으면서 종교를 대입하여 난감했던 상황과 마주치는 것처럼 말이다. 삶이나 인간에 대입하지 않고, 아마 학문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자주 사실들을 끼워넣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관점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주장의 냄새로 자칫 사실도 의도도 읽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2. 동백꽃 단편을 보다. 물론 여기 동백꽃은 김유정이 강원도 사람이니 남쪽의 이꽃이 아니다. 그 동백기름을 바른다고 할때 그 동백은 이 생강나무를 말한다. 읽으면서 우리말의 고움에 다시 눈길이 간다. 읽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달되는 힘이랄까? 이오덕선생님의 글에 대한 논지에 전적인 찬동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 둔탁하고 무미하고 건조해지는 것 같아 우리말을 일상으로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연스럽고 의미전달이 화사하도록 곱게 느껴진다. 지금 흔적을 남기면서도 내말이 거칠다는 느낌이 선다. 뒤에 풀이가 나와 다시 봐도 좋겠다 싶다. 김유정은 폐결핵으로 나이 서른에 운명을 달리했다. 1937년, 1908년생이다.
3. 나희덕의 [야생사과]를 애벌로 다 본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후미 평론가의 말과 저자의 후기처럼 정말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든다. 바밤바님의 [좋은 이별]이란 리뷰도 그렇지만, 늘 나란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지만 내가 흩어지는 꼴을 보지 못하거나 과도한 구심만이 존재해 늘 분산된 나를 구성하려하는 습속에 대한 고민도 겹쳐진다. 늘 남의 심장을 배어 물면서도 나에 대한 집착만 있는 모습이라니... 나를 놓아주는 사이, 사이가 다른 시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비치는 듯 싶다. 나에 대한 과도한 응축이 손내민 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원심이 너를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도 만든다.면 아주 조금 너가 섞일 수 있지는 않을까? 알라딘마을 뜨겁다. 구술이 아니라 문자의 논쟁에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지만 공간이 아주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서로 나를 조금 버리거나 나를 줏어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새는 날아가고/쇠라는 점묘화)
4. 돌아오는 길. 몸이 후끈하도록 가볍게 날아온다. 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