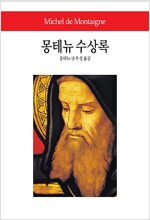간통 같은 독서
간통 같은 독서
"책을 읽으면서 그전에 다른 책을 읽었을 때를 회상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불러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르헨티나의 작가인 에세키엘 마르티네스 에스트라다는 촌평했다. "이런 독서야말로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간통이다." 보르헤스는 체계적인 도서 목록을 불신하고 그런 간통 같은 독서를 권장했다.
- 알베르토 망겔, 『독서의 역사』중에서
* * *
몽테뉴가 쓴 에세이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용문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는 보르도 시장과 고위 법관까지 지냈지만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일'을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불과 서른여덟 살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바쁜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몽테뉴 성'에 틀어박혀 지내며,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나 더 흥미로운 '책 속 인물들'을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던 셈이다.
그가 책을 통해 만났던 숱한 인물들과 작품들을 어떻게 일일이 나열할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와 작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가 좋아한 작가는 누가 뭐래도 플루타르코스였고, 그가 쓴 <영웅전>과 <윤리론집>은 그가 가장 즐겨 읽는 애독서였다.
나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먼저 읽은 뒤에 한참이나 있다가 뒤늦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선집)과 <윤리론집>(선집)을 읽는 바람에, 그 두 인물이 책을 통해 서로 주고 받았던 영향을 이제서야 좀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사실 몽테뉴가 쓴 <수상록>의 목차만 살펴보더라도 그가 플루타르코스로부터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가령, <작은 카토에 대하여>, <키케로에 대한 고찰>, <카이사르의 말 한마다>,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담긴 '영웅들'에 대한 '몽테뉴의 생각'을 따로 풀어낸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아예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의 변호>라는 에세이도 <수상록>에 포함시켰다. 물론 그 에세이는 세네카보다는 플루타르코스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하고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내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품는 친밀감과, 그들이 내 노령기에 그리고 순수히 그들에게서 약탈해 온 재료로 엮어 내는 내 작품에게 주는 도움 때문에 , 나는 그들의 영광을 예찬하지 않을 수 없다.
- 몽테뉴, 『몽테뉴 수상록』,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의 변호> 중에서
뒤늦게 플루타르코스의 <윤리론집>(선집)을 읽으면서 <몽테뉴 수상록>이 겹쳐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묘한 일이다. 왜냐하면 <윤리론집>은 대략 1,900년 전의 저작이고, <몽테뉴 수상록>은 대략 400년 저작이기 때문이다. 1,500년이나 앞서 나온 책을 읽다가, 그 책 보다 1,500년 뒤에 나온 책 속의 여러 구절들을 떠올린다는 게 너무나 묘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어쨌든 나는 플루타르코스의 <윤리론집>에 나오는 '이웃에게 불씨를 얻으러 간 이야기'를 읽다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왔던 바로 그 똑같은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두 인용문을 비교해 보라. 나는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저 얘기가 여태까지도 몽테뉴가 최초로 지어낸 '독창적인 비유'인 줄로만 알았다.
지식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을 받아 담는다. 그것뿐이다. 지식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불이 필요해서 이웃집에 불을 얻으러 가서는, 거기서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불을 보고 멈춰서 쬐다가 얻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배 속에 음식을 잔뜩 채워 보았자,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우리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또 우리들을 더 키워 주고 힘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학식이 많아서 경험이 없이도 그렇게 위대한 장수가 되었던 루쿨루스는 우리들의 방식으로 지식을 섭취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너무 심하게 남의 팔에 매달려 다니다가 결국 우리 자신의 힘마저 없애고 만다. 내가 죽음의 공포에 대비할 생각을 가지면? 나는 겨우 세네카의 사상에서 꺼내올 뿐이다. 내가 자신이나 또는 남을 위해서 위안의 말을 찾아보고 싶으면? 나는 그 말을 키케로에게서 빌려온다. 사람들이 나를 그 지식으로 단련시켜 주었던들, 나는 그것을 자신에게서 찾아 가졌을 것이다.
- 몽테뉴, 『몽테뉴 수상록』, <학식이 있음을 자랑함에 대하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불씨를 얻어 큰불을 지피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머무른다고 상상해 보게
지력(智力)은 병처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목재와 같다고나 할까. 그것은 단지 나무에 불을 붙여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고 진리를 참구하려는 열망을 창출하면 되는 것이기에 말이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불씨를 얻어 큰불을 지피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며 머무른다고 상상해 보게. 그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득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가 강의에서 그 자신과 그의 사고를 계발하기 위해 불씨를 지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강의 내용을 즐기며 황홀경에 빠져 앉아 있는 거나 같은 것이지. 말하자면 그는 강의 내용으로 그에게 전달된 의견의 형태로 밝고 벌겋게 달아오른 불을 얻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곰팡냄새와 암흑을 뜨거운 철학의 열기로 없애거나 추방하지는 못하는 것이네.
- 플루타르코스,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철학자들의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중에서
이쯤 되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몽테뉴 플루타르코스'를 입력해서 뭔가를 더 찾아볼 생각을 억누르기 어렵다. 클릭하자 말자 금세 '책 본문 검색'이 눈 앞에 떠오른다. 이번 기회에 우연히 발견한『몽테뉴의 엣세』라는 책에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대목은 다음 구절이다.
그의 독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고대와의 만남이다. 우리는 그가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익혔고 모국어와도 같은 라틴어를 통해 고대와 친숙해졌었다는 것을 보아 왔지만 실로 라틴 세계는 그의 정신적 고향이었다. 물론 그는 고대 사가들, 전기 작가들도 만났지만 더 많이 시인들, 철학자들과 교류했다. 그중에는 비르길리우스Virgile, 루크레시우스Lucrèce, 카툴루스Catulle, 호라티우스Horace, 루카누스Lucian가 있는가 하면 플라우투스Plaute, 테렌티우스Tèrence와 같은 극작가도 있다. 한때 그는 오비디우스Ovide에 심취했었지만 그 후에는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듯 시기적으로 독서의 경향이 바뀌기도 했는데, 가령 1571년에서 1572년에 걸쳐 세네카Sénèque에 열중했던 그는『루실리우스 서한Lettres a Lucilius』을 탐독했다. 또한 라틴어는 그에게 고대 그리스를 발견하게 했다. 이 무렵 그리스 작가들의 라틴어 번역이 속속 출간됨으로써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Diogenes Laerce, 크세노폰Xénophon, 플라톤Platon 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어 번역도 선보였다. 몽테뉴는 시실의 디오도로스Diodore de Sicile의 역사물, 특히 아미요Amyot에 의해 번역된(1572년) 플루타르코스Plutarque의 『영웅전Vies』과『윤리서 Oeuvres Morales』를 애독했다. 그는 아미요를 프랑스 작가 중 최고의 인물로 치켜세우면서, "만약 이 책이 우리를 수렁에서 일으켜 세우지 않았더라면 무식한 우리들은 영영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는 1578년경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의 변론'이라는 제목의 장을 쓰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플루타르코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존경과 찬양의 마음은 『엣세』를 쓰는 동안 줄곧 변함이 없었다.
-이환, 『몽테뉴의 엣세』(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총서 서양문학 22) 중에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다. 사실 플루타르코스의 『윤리론집』전체 작품들 가운데 고작 6편과 5편의 에세이만 골라 번역한 두 권의 책(천병희 번역 『수다에 관하여』와 허승일 번역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을 최근에 읽으면서 새삼스레 느꼈던 건 '양대 서사시를 쓴 호메로스'와 '고대 그리스 희비극 작품들을 쓴 시인들'의 위대성이다. 두 권의 『윤리론집』 번역본에 붙은 수많은 주석들은 거의 대부분 '호메로스' 아니면 '소포클레스, 아이스퀼로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들에 대한 '원전 출처와 약간의 부연 설명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플라톤의 『국가』를 비롯한 수많은『대화편들』 또한 작품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어쨌든 소위 텍스트 간의 관련성(intertextuality)은 독특한 양면성을 지닌 듯하다. 알면 알수록 더욱 재미있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영 재미가 없다는 점이다. 책을 읽는 특별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도리어 책을 쉽게 읽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꼴이다.
베르길리우스 시의 묘미를 느끼려면 호메로스의 시를 알아야 하듯,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도 그의 선배 시인들의 시를 알고 있으면 그 깊은 맛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비롯한 그리스 라틴문학의 읽는 재미를 극대화하려면 텍스트 간의 관련성(intertextuality)을 파악할 것을 권한다. 앞서 말했듯이 네스토르는 젊은 나이에 칼뤼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하지만 멧돼지가 덤벼들자 당장 이를 피해 마치 장대높이뛰기 하듯 창자루를 짚고 나무 위로 도망치는데(8권 260∼546행 참조), 이 장면은 그가 『일리아스 』에서 그리스 장수들의 회의석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는 젊었을 때 아무리 강한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다른 장수들을 나무라는 장면들을 알고 있어야만 더 재미있게 읽히는 것이다.
- 오비디우스, 『원전으로 읽는 변신 이야기』, <옮긴이 해제> 중에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