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로 몰려다니는 여행을 하고와서 기록하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쳐지나가는 여행만큼이나 기억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아쉽고 아깝다. 아깝다는 생각에 조금 정리해본다.
잘츠부르크를 다녀왔다. 다녀왔다? 내 스스로 찾아가서 길을 묻고 거리를 헤맸다면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4~5시간 버스로 이동한 후 1~2시간 잠깐 가본 것을 가지고 '다녀왔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잠깐 눈치만 살피고 왔다, 가 더 어울리겠다. 하여튼.

잘츠부르크 야경.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자물쇠가 좀 징글징글하다. 다리에 하중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지 가이드를 따라다니다 의도치 않게 모차르트와 마주쳤다. 아, 그렇지. 잘츠부르크가 음악 축제로 유명한 곳이었지. 예습없이 수업에 임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느닷없이 맞닥뜨리면 곤란한데...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가이드 말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위 사진은 모차르트 생가. 5층 불켜진 방 밑에 있는 방이 모차르트 가족이 살던 곳이란다.

출입문 옆에 붙어있는 안내판.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모차르트가 드나들었던 계단이라 그런지 남달라보인다.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것처럼 잠깐 눈으로 보고, 사진 두어 장 찍고나면 그것으로 끝.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끝나버린다. 자세한 것은 돌아와서야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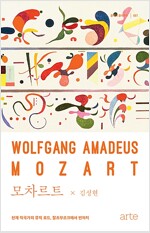
이 책에 인용된 글을 다시 인용한다.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데 9번가 모차르트의 생가를 개조한 박물관 1층 벽면에 있다는 글이다.
모차르트는 평생 17차례 여행했다. 여행 기간은 3,720일로, 환산하면 10년 2개월 2일이다. 이 기간은 모차르트 일생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한다. 모차르트는 6세 때인 1762년 뮌헨으로 처음 여행을 떠났고, 1791년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을 초연하기 위해 프라하로 마지막 여행을 갔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3개월 전이었다. -64쪽
일생의 3분의 1을 여행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삶이 단순하지 않았겠구나 싶었다.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게트라이데 거리의 철제 간판들. 문맹이 많았던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간판이라고 한다. 위는 줄자와 가위가 있으니 양복점, 아래는 거리 분위기에 맞게 겸손해진 맥도날드 간판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M이라나....

키가 작아서, 그림자나마 잔뜩 키워 키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이 양반은 누구일까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등을 이끌면서 평생 1,200여 장의 음반을 남겼으며 총 음반 판매고도 2억 장에 이르렀다'는 분.....바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이 분의 키가 173cm쯤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그런데 왜 여기서 키가 중요하지?
모차르트에 대한 나의 관심은 딱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