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에 앞서 고토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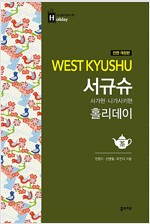
p.342
고토는 기도의 섬이라 불린다. 가톨릭의 역사가 깊은 고토 열도에 자리 잡은 교회만 55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숫자다. 모진 종교 탄압 속에서 250년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신앙의 역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역사의 모범이라 치켜세웠던 바, 육지에서 100km나 떨어진 이 섬으로 순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 자연을 간직한 고토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비견되기도 한다. (중략) 이국적인 성당과 천혜의 절경이 쪽빛 바다에 젖어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작년 9월까지 나가사키 앞바다에 고토(五島)라는 섬이 있는 줄도 몰랐다. 막부 시대의 쇄국정책 일환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상관을 유일하게 허락한 곳인 데지마. 오천여 평의 자그마한 인공섬인 데지마에서 할일없이 두리번거리다 홍보 문구가 쓰인 띠를 가슴에 두른 한무리의 일본 중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관광지에서 얘네들은 뭐하나 싶어 살펴보았다. 3인 1조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설문지가 완성되면 답례품으로 포장된 국수(아마도 우동)를 건네주고 있었다. 우리(남편과 나)에게 다가와서 요청하기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하얗게 센 머리 때문이리라고 짐작. 좁은 데지마에서 이들과 절대로 멀어질 수 없었던 우리는 기다리다못해 한 무리의 남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고토에서 온 학생들로 고토라는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었다. 건네받은 전단지에는 고토의 관광지, 식당, 호텔, 먹거리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중학생들의 활동은 우리로 치면 체험학습쯤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이런 걸 시켜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기에서도 지역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했다.
2월 초 두번 째 나가사키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궁금했던 고토를 일정에 넣었다. 배편은 두 가지가 있다. 1시간 30분이 걸리면서 왕복 요금이 3인분에 53,400엔(약 50만 원)인 것과 4시간이 걸리면서 요금이 24,000엔(약 25만 원)인 것. 빠른 것으로 가자던 친구들의 호기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조용히 안도의 숨을 쉬면서 4시간이 걸려도 좋아,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고토 후쿠에 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에어비엔비 숙소를 예약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해서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으나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문틈으로 사정없이 웃풍이 들어왔다. 문짝이 몇개였냐고 묻지 마시길. 전면과 후면이 모두 목재로 짠 전통 미닫이 문으로 미관에 역점을 두었을 뿐, 오랜 살림살이 냄새가 배어있는 살림집의 아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사진을 올린 이유. 대문 역할을 하는 저 무너진 성벽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

동네 한 구역을 차지한 부케야시키도리, 무사들이 살았던 곳으로 담장 위에 층층이 쌓아올린 달걀 모양의 돌들이 독특하다. 적이 침입했을 때 땅으로 떨어져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계병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손에 쥔 게 많았다는 흔적일 터. 무사의 집을 흉내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는 의미가 있었다.
섭섭한대로 하루에 몇차례밖에 운행하지 않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국제면허증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몹시 아쉬워했지만, 운전면허증조차 없는 나는 아쉬운 마음조차 없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텅텅 빈 시골버스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도자키 성당까지는 갔다. 그래도 성당 하나는 보고 가야지 싶었다.
** 도자키 성당(堂崎天主堂): 1873년 금교령 해제 후 고토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지역 기독교 신앙의 요람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고토의 기독교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자료관 역할을 하고 있다. 붉은 벽돌로 지은 고딕 양식의 교회와 앞마당까지 들어온 바다가 어우러져 서정시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위의 책 p.348)
버스에서 내려 눈보라치는 길을 1km 가량 힘들게 걸어왔건만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기분은 들지 않았다. 바다를 오른편에 끼고 걸어온 길과 바다의 풍광이 가슴저리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옥색과 푸른색의 맑은 바다와 그 바다 위로 몰아치는 바람이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저 바다 위의 눈보라는 이름이 뭐냐고. 포말은 아닌 건 확실한데 그냥 포말이라고 답했다. 모르니까. 나중에 AI한테 물어보니 비산 또는 포운이라고 한단다.
**비산(Sea Spray): 강한 바람이 해수면의 꼭대기를 직접 쓸고 지나가면서 물방울을 공중으로 비산시키는 현상을 전문적으로 비산(Sea Spray)또는 포운(Spindrift)이라고 부릅니다.
비전문적으로는 그냥 '눈보라'. 바다에 홀린다면 아마도 뿌옇게 뿌려대는 저 비산 또는 포운에 포위되어 눈을 멀게 될 것 같았다. 하여튼 영화 속 한 장면같은 풍광을 옆에 끼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두어 시간 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냥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가느냐. 고민이 길지 않았다. 걷기로 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옷깃을 여며도 추웠고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눈을 뜨기도 힘들었지만 언제 이런 길 걸어보겠는가. 총길이 9km로 이미 1km는 왔으니 천천히 걷다보면 도착하지 싶었다. 지나가는 차량도 사람도 없는 적막강산의 길, 강한 눈보라 때문에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서 우리 옆으로 낡은 소형승용차가 한대 섰다. 선택의 여지 없이 차량에 올랐다. 선량한 얼굴의 50대 아저씨는 연신 웃으며 말을 붙였으나 서로 말이 통할 리 없었다. 이내 조용해진 분위기. 15분 정도 달려서 숙소가 있는 동네에 하차했다. 허전했다. 아저씨가 너무 일찍 나타났다. 좀더 고생스럽게 걸었어야 했는데, 눈보라에 눈썹이 하얗게 얼어붙었어야 했는데, 저 스프레이 뿌리는 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 허위적허위적 걸었어야 했는데....정말 아쉬웠다. 친구들에게는 말을 아꼈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약간 아쉬워한 눈치였다.


이것은 도자키 성당의 반대편 노선 버스와 정리권. 1번 정거장에서 종점까지 요금은 1490엔. 1490엔 * 3명 * 2회(왕복)=8940엔(약 83500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전세내다시피한 버스로 종점까지 찍고 왔다. 렌터카는 하루에 5만 원이라는데...친구의 말을 흘려 듣는다. 날은 잔뜩 흐려서 비바람 불고, 버스에는 고작 현지인 두세 분. 온통 동백나무가 촘촘히 자리잡은 울창한 숲과 숨바꼭질하듯 나타나는 바다를 내내 바라보는데 전혀 질리지 않았다. 자고로 여행과 예술은 심심해야 하는 법. 심심해야 그것도 매우 심심해야 기억에 남고 작품이 싹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