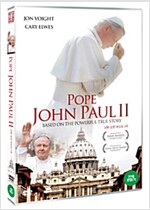문학기행 6일차 일정이 종료되었다. 폴란드 시간으로는 저녁 7시가 되어가는 즈음이니까 한국이라면 퇴근길이거나 저녁을 먹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넘으면 해가 지는 터라(이즈음 아침 7시반에 해가 뜨고 4시10분에 해가 진다) 오후 5시만 돼도 한밤중의 느낌이다.
아침에 시에 적은 대로 오늘은 쉼보르스카의 날이었고 크라쿠프 도심을 둘러보는 게 핵심일정이었다. 다른 때보다 여유 있는 일정. 숙소를 나선 지 10분도 되지 않아 일행은 쉼보르스카의 집에 이르렀다. 현판에는 쉼보르스카가 1929년부터 1948년까지 살았던 집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어 번역에 실린 연보에는 8살 때인 1931년부터 크라쿠프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착오인 듯싶다.
쉼보르스카는 1948년에, 자신의 시를 처음 실어준 잡지의 편집자 아담 브워데크와 결혼하여 크루프니차 22번지 다락방에 신혼집을 차린다(1954년 이혼). 하여 우리가 찾은 곳은 처음 크라쿠프로 이사와서 그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현판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라 쉼보르스카의 집 앞에서 일행은 단체사진을 찍었다. 나머지 쉼보르스카의 장소들(자주 다닌 서점과 카페, 그리고 무덤까지)은 자유시간에 관심사에 맞게 가보기로 했다.
오늘 일정의 두번째 장소는 구시가지 광장이었다. 당연히 중심부에는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고 구청사와 시장이 있는 식이다. 문학기행에서는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아담 미츠키세비츠 동상이 주목거리. 민족서사시 <판 타데우시>에 대해선 이번 문학기행출발 전에 인용해놓기도 했었다. 바르샤바의 문학박물관에 가서 한번더 언급할 예정이다.
점심을 먹기 전, 세번째로 찾은 곳은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야기엘론스키대학(야기에우워대학)이다. 당연히 폴란드에서도 가장 오래된(14세기에 설립) 대학이면서 명사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교정에 동상이 서 있다)와 인류학의 말리노프스키,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한 쉼보르스카가 바로 이 대학 출신이다(쉼보르스카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졸업은 하지 못한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작가 스타니스와프 렘도 동문이다. 이들이 다녔던 대학 건물은 현재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일요일이라 휴관이었다.
점심식사를 예약한 곳이 과거 유대인 게토 구역(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촬영지였다고)의 이스라엘식당이어서 이동하다가 가이드의 안내로 한 성당과 주교관을 지났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동상이 서 있었다. 교황이 주교로 봉직했던 성당이고 머물렀던 주교관이라고.
난생 처음 이스라엘 음식을 먹고 가진 자유시간의 일은 졸음이 몰려와서 따로 적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