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이지만 점심을 먹고 막간을 이용해 페이퍼 하나를 적어둔다. 오전에 배송된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랑수아 라뤼엘의 <철학이 끝난 시대의 투쟁과 유토피아>(2012, 불어본은 2004)인데, 주간경향에 실린 이택광 교수의 서평을 읽고 흥미가 생겨서 주문했던 책이다(서평은 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211271518391&pt=nv 참조). 서평에서는 저자 이름을 '프랑수아 라루엘'이라고 적었다. 영어권에 한창 소개/번역되고 있는 철학자인데, 핵심은 '비철학'이란 개념이다. 아예 라뤼엘은 '비철학 프로젝트'란 말을 쓴다.



비철학은 일반적으로 운위되는 반철학(anti-philosophy)과 다른 개념이다. 반철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론가는 자크 라캉이었고, 그 개념을 알랭 바디우가 받아서 발전시켰다. 라루엘이 말하는 비철학은 반철학과 다른 것이다. 반철학이 철학 자체에 내재한 체계화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비철학은 그것 자체도 일종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라루엘에 따르면, 모든 철학의 형식들은 선행하는 전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까닭에 이 전제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행하는 전제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철학의 담론에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선행하는 전제를 라루엘은 “변증법적으로 분할된 세계”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세계의 운동과 관계없이 철학의 논리는 자율적으로 자체의 변증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철학의 바깥, 말하자면 비철학적인 사유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철학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라루엘의 주장이다. 비철학의 범주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비철학의 범주는 단순하게 메타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이 브라시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철학은 메타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메타철학의 차원도 벗어나야 철학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철학'적 작업인지는 나도 읽어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종언 이후의 철학'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를 끄는 철학자다. 아쉬운 것은 그가 알랭 바디우와 동년배라는 점이다. '젊은 피'가 아니라는 애기다. 철학이 종언에 도달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슬라보예 지젝도 이제 예순이 훌쩍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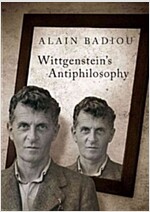


비철학은 다소 생소하지만 반철학이란 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반철학으로서의 철학>(지성의샘, 1994)이란 앤솔로지도 나온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바디우의 <비트겐슈타인의 반철학>, 그리고 보리스 그로이스의 <반철학 입문> 같은 책을 작년에 구입해놓았다. 그로이스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철학자이자 미술비평가로 국내에서는 <아방가르드와 현대성>(문예마당, 1995)으로 처음 소개된 바 있다. <유토피아의 환영>(한울, 2010)에도 그의 글 '아방가르드 정신으로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탄생'이 수록돼 있다. 짐작에 바디우의 책은 국내에도 조만간 소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친 김에 그로이스의 책도 번역되면 좋겠다...
13.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