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주문하고 돌아와서 펼쳐본 책의 하나는 역사학자 토니 주트의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플래닛, 2011)이다. 전후 유럽사를 다룬 <포스트워>(플래닛, 2008)의 저자라는 것만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물론 제목과 부제는 보고) 주문한 책이었다. 작년 8월에 세상을 떠난 저자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도 인상적이다(그는 구술로 이 책을 썼다). 소개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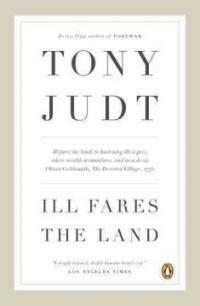
한국일보(11. 02. 19) "복지의 숭고한 기원 새겨라" 죽은 역사학자의 마지막 당부
"우리는 경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적 병폐를 줄이는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번영과 특권은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슬프게도,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한다."
영국 출신 역사학자 토니 주트(1948~2010)는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에서 이렇게 단언하면서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평등의 완화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전후 유럽에 관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포스트워 1945-2005>의 저자인 주트가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고통 속에서 쓴 마지막 저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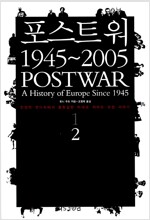

주트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역사가답게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20세기 역사를 되돌아볼 것을 권한다. 특히 복지국가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불안의 시대로 들어섰는지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함몰돼 있는 서구 사회에 각성을 촉구한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그 참담한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탄생했다. 시장은 규제되었고,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됐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2차대전 이후 수십 년간 전례 없는 번영과 평등의 확산을 누렸다.
복지국가가 퇴색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에 태어나 복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1960년대 세대들이 정의나 기회균등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싹텄다는 지적이 예리하다. 신좌파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는 의식의 퇴조를 가져왔고 이는 우파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트는 이런 태도들이 보수주의의 귀환을 불러왔다고 본다. "사회 따위는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있을 뿐이다"고 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이 이 같은 사조를 대변한다.
주트는 돈벌이에 대한 강박, 민영화와 민간 부문에 대한 숭배, 점증하는 빈부 격차 등 서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들로 보이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특성은 인간 조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또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퍼트린 것은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한 영미권 경제학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나치의 지배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오스트리아 출신 학자들이라고 추적해 들어간다. 그러면서 서구사회가 세계 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건설한 복지국가라는 위대한 유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물질적 사리사욕의 추구를 미덕으로 살아 왔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나 의회 법안이 좋은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묻는 법이 없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주트의 지적은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신자유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한국 사회에도 경종을 울린다. 주트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공동 행동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남경욱기자)
11. 0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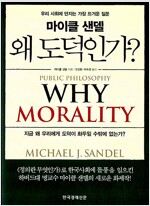

P.S.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주트의 책은 '공공철학'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야마와키 나오시의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이학사, 2011)를 보면, 일본에서는 이 단어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공공철학 강좌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내가 '공공철학'이란 말을 접한 건, 적어도 기억엔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한국경제신문, 2010)가 처음이다. 이 책의 원제가 'Public Philsophy'였고, 직역하면 '공공철학'이 될 터이다. 공공철학에 대한 관심은 또한 '공화주의'나 '공화국'과 분리될 수 없는데(샌델은 물론 '절차적 공화국(procedual republic)'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번역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옮겨진 단어다), 박명림/김상봉 교수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웅진지식하우스, 2011)가 연이어 떠오른다. 나란히 읽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