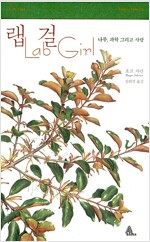


내가 조금만 더 과학, 수학을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늘 생각한다.
인생 전반적으로.
늘 '감성' 아닌 '감정'이 앞서고 이성과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가끔이라도 과학 에세이 정도는 봐주어야 한다.
<랩걸>,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월에 걸쳐서 약간씩 보고 있는 책이다.
유시민 님이 추천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랩걸>
역시 명성에 걸맞게 좋구나.
일단, 초반이라서 작가의 가계도와 성장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P.52 : 인간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이 작은 씨앗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틴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작은 식물의 열망이 어느 실험실 안에서 활짝 피었다. 그 연꽃은 지금 어디 있을까.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내가 특히 저 구절에 주목한 것은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 때문이다.
동생이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상견례를 하고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한파에 결혼하기까지 (내 사정이 아니라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었다. 한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도 좋은가 싶은 일이 많았다. 물론 그 곁에서 나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도 동생의 결혼식으로 모두 보상받았다.
가족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울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
간혹 하객석에서 친구들이 눈물 짓기도 하는 걸 봤지만 다 동생이 제대로 살아왔다 증거이고 친구들 심성이 곱다는 징표이니, 뭐.
정말 눈에 넣으면 많이 아플 푸우를 닮은 커다란 제부는 신부를 위한 축가를 부르다 핸드폰을 컨닝하기도 하면서 큰 웃음을 주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를 부르다 끝에 나랑 결혼해 줄 거니? 하고 유머러스하게 마무리하며 하객들을 미소짓게 했다.
이런 모든 노력이 편찮으신 엄마의 표정도 풀어드린 듯해 더욱 고마웠다.
*
<나무 위 나의 인생>은 오래 전에 읽은 책인데 <랩걸>과 겹쳐진다. 인생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성과학자의 분투기.
그중 압권은 과학자판 며느라기라는 것이다.
시가에서는 여자의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라지만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찾아 중심을 잡고 연구를 계속한다.
이 값진 책의 번역은 유시민 님 동생이 하셨다.


동생 결혼식만 하고 나서 책도 보고 집도 정리하고 하려 했는데 한동안 허탈해서 멍하니만 있었다.
책이 정말 눈에 안 들어와 이 책 저 책 늘어만 놓았는데 < 그 겨울의 일주일 >을 단번에 읽었다. 오래 전 아일랜드 이야기인데 가족간의 갈등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애증이 뭔가 한국적 정서와 맞닿아 있어 신기해 하며 읽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진리.
남자들은 허황되게 사랑을 약속하곤 떠나버리고 남겨진 여자들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힘겹게 꾸려간다.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각자의 사연을 지닌 호텔 투숙객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얽혀든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은 부유한 독신 세 자매, 열정적인 사랑은 해봤지만 아이는 없는 여자, 열정적인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생긴 여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과 살고 싶은 여자 그밖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 모두가 마음 아픈 사연을 지녔지만 엄마의 불륜을 목격하고 아빠에게 말해서 가정이 해체된 후 마음의 문을 닫은 여교장이 제일 가여웠다.
다 읽고 나서 허황되게도 역시 유산을 많이 받은 미혼 여성들이 제일 평탄하게 살다가는군, 하고 웃었다면 지나친 오독일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보편의 경험이 아닌 세대가 되어갔고
피, 이런 이야기는 관두고
내가 지금 양가 부모 봉양과 양육으로 인한 감정 소모에 지쳐서 그런가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혼자 자립하기까지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한데 가족, 특히 엄마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 사회에서 여성은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없다.
좀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 하면 늙거나 병들거나 생의 끝자락에 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엄마같이.
명절 연휴에 조금씩 읽은
유명한 <이상한 정상가족>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시가
체념한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이제 가끔은 정 힘들면 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도 집에 오면 정말 하고픈 이야기는 남아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부장 제도 밖의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겪어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정상 가족' 범주에 있다는 게 참 안도되는
정말로 괴상한 자기 분열을 겪고 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안하다고 최면을 걸고 있다.
엄청 사소하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무게에 짓눌린다.
남들처럼 쇼핑이나 수다로도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내 쉴 자리가 필요하다.
*
어린이집 체벌에는 게거품을 물며 집에서는 아이들 엉덩이나 등짝 정도는 때리는 게 어때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가족 동반 자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시선보다는 가족 몰살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맞는 표현이다.
또 예전이 좋았다고들 하는데 박정희 정권 시대 자살률이 훨씬 높았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은 그냥 압축된 근대화로 인해 내내 자살률이 높았다는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꽂힌다.
복지나 사회안정망의 부재로 인해서 질병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나락에 떨어진 가정은 언제나 해체와 소멸이라는 길을 가게 된다.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아동학대 부분은 정말 보기 힘들었다.
*
여러 일로 나에게는 참 춥고 긴 겨울이었다.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책도 보고 미사도 드릴 수 있으니
천천히 나가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