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는 11시 정도에 잠들어 5시에 일어났다. 딱 좋구나.
중간에 한번 깼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엄마가 어느 정도이실지 염려되었고 동생 결혼식이 다가와 할일들을 점검해보았다. 이사갈 집 평면도를 주면 세탁기 둘 곳도 보고 세탁기를 사주기로 해서 틈나면 세탁기를 구경하고 있다.
어제 도서관에 딸아이 방학독서교실을 신청해둔 게 있어서 거기 들여보내고 아들이랑 책을 읽었다.
우연히 집어든 <내가 내일 죽는다면>은 흔한 미니멀리즘 책인 줄 알았는데 '데스클리닝'에 대한 책이었다. '데스클리닝'은 죽음을 염두에 둔 정돈이다. 이사라든가 사별 등으로 집 규모를 줄여갈 때에도 적용된다.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손수 하기도 하고 미처 이것을 못하고 떠난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해당된다.
학교 다닐 때 사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으셨던 어떤 선생님이 몸이 아파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아침에 입은 팬티가 너무 낡아 어쩌지 하고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혼술남녀>라는 드라마에서 노량진 학원강사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옷이 낡은 걸 보고 슬퍼하는 장면도 떠오르네.
남은 사람들 슬프지 않게 매일 쓰는 물건이나 옷은 멀쩡하고 정결한 걸로 남기고 자주자주 버려야겠다.
정리하기 제일 쉬운 품목은 역시 옷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무척 힘들 수 있다. 뭔가 세련되고 나아진 내가 되는 듯한 느낌에서 옷을 충동구매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옷을 정리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것이다. 옷을 사느라 들인 품과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속은 좀 쓰리겠지만.
책 역시 마찬가지.
뭔가 이것만 더 읽으면 좀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자꾸 사들이는데 결국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세월 보내기 좋아 읽는 것이지.
어제는 아이들 교과서와 문제집을 한참 정리했다. 교과서는 정말 학교에 비치해두고 게다가 잘 쓰지도 않아 국어, 수학, 수학익힘을 제외하고는 1년을 써도 새 책 같다. 우리나라 교과서 질이 너무 좋다. 거의 워크북 개념으로 해서 질을 좀더 낮추어도 될듯하다. 디지털교과서에는 아직 호의적이지 않다.
문제집도 부끄럽지만 안 푼 것도 많고 게다가 겨우 2년 터울인데 개정되어 거의 다 버려야 한다.
추억에 젖어 전과도 사고 그랬는데 학습지 사이트에 가면 교과서 본문을 제공하는 데도 있으니 고만 사야겠다. (아이스크림 홈@-유료회원 아니어도 교과서 보임)
기록물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사후에 가족들이 봐서 좋을 게 없는 기록이나 민망한 내용의 물건이나 책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여기저기 노트에 힘들었던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잔뜩 적어두고 보란듯이 펼쳐두고 가는 건 좋지 않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모두 다 말하지 않고 묻어두고 조용히 가는 것도 필요하다.
잠시 이런저런 공상 중에 약속한 시간이 되어 나가보니 딸아이가 울고 있다. 11시에 약속해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는 바람에 울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12시에 마치는 데 중간에 나온다는 말을 하기 힘들어 내가 빨리 들렀어야 했는데.
피아노학원 시간과도 안 맞고 같은 학교도 아닌 다른 학교 애들과 있는 것도 어색했고 여러가지로 안 맞았는지 울고만 있어서 내일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2학년이니 중간에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른인 나도 그런 상황이면 말할 타이밍 잡기 힘든 것이다.
그보다 일단 독서교실 학생이 너무 많고 낯설었다는 게 소심한 딸아이는 제일 힘들었던 듯하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야 진정이 되었다. 마성의 짜느님, 탕슈느님.
울다가 웃다가.
탕슉 취향마저 부먹 찍먹으로 갈리는 아들 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힘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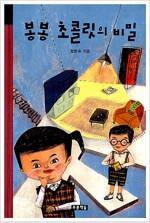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아들은 <용선생 만화 한국사>를 보고 딸은 <봉봉 초콜릿의 비밀>을 보았다.
<용선생한국사>도 있고 한국사 책만 거의 한 줄인데 이 책도 사고 싶어 했다. 많다고 고만 사자고 했다. 원래 초급 한국사 시험을 보려다 관두기로 했다. 한자급수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인증되는 시험은 그게 진짜 인증이 필요할 때 보려고 한다. 진짜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독서교실 소동으로 피아노학원 가는 게 늦어졌지만 덕분에 나는 오후에 애들 학원 간 사이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혼자 있게 되었다. 이제 손이 많이 가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동네산책을 하며 딸아이가 교실 장터에서 사온 '꾀돌이' 찾아 삼만리.
집에서 좀 떨어진 문구점에서 찾아내 열 봉지나 사오니 정말 좋아한다.
아들은 베이블레이드 팽이를 무려 배틀씩이나 한다고 멀리 친구네로 원정을 나가고 딸이랑 이런저런 정리하고 저녁하다보면 오후도 흘러가버린다. 저녁 먹고 책보다 뒹굴하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씻고 하다보면 잘 시간이다.
이제 애들도 초등 고학년이니 열 시 정도에 자도 될듯하다. 어제는 거의 열 시 반에야 잤지만
방학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수면시간이나 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역시 돌아다니고 일을 많이 한 것이 꿀잠의 비결.
운동은 하고 싶은데 뭔가 어디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해야 하는 운동도 번거롭고 두렵다.
체육관 알레르기, 짐GYM 공포증이 있다.
아이들과 집에서 운동 (보통 홈트라 하죠? 얼마 전에 누가 말하는 데 네에 홀트요? 홀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라고 함) 하거나 봄 되면 배드민턴을 꾸준히 치든가 해야겠다.
오늘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도서관에 가서 <아우스터리츠>를 좀 읽고 싶다. 빌려만 두고 통 펴보질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