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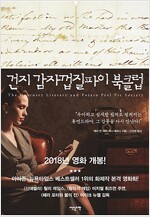

<섬에 있는 서점>은 사두고 계속 안 읽다가 독서 모임 선정 책이 되면서 읽게 되었다. 한 달마다 책이 선정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책이 선정되면 무지 편하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읽지 않은 책이 선정되면 더 좋은듯.
“때로는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진 책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119쪽
<섬에 있는 서점>이 막 나왔을 때 사들이고 중간 정도 읽다 두었다. 초반의 뭔가 엉성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아침 드라마같은 분위기.
소설이 전개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결국은 신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좋아졌다.
떠나간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해피엔딩인듯.
내가 이제는 아이 엄마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행복하고 잘 자랐으면 그만인 건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책을 그래도 조금은 더 읽는 사람으로서 잘 읽었던 책들이 나오거나 모르는 책이 나와도 무지 반갑고 한번 더 눈여겨 보게 되어 좋았다.
일주일 중 제일 한가한 요일에 좋아하는 카페에서 밀크티와 플랫화이트를 마시며 읽어서 더더 좋았던 듯.

<섬에 있는 서점>에 소개된 책 중에서
특히 반가운 책이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혼자라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301쪽
결국 우리는 단편집이야. 수록된 작품 하나하나가 다 완벽한 단편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만큼 읽었다. 성공작이 있으면 실패작도 있다. 운이 좋으면 뛰어난 작품도 하나쯤 있겠지. 결국 사람들은 그 뛰어난 것들만 겨우 기억할 뿐이고, 그 기억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302쪽
책에 훌륭한 단편과 장편들이 소개되어 앞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아지니
그것 또한 하나의 소득이다.
*
<건지감자껍질파이북클럽>이나 <그런 책은 없는데요> 역시 북클럽과 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이 책과 엮어서 읽기 좋다.
<진짜 그런 책은 없는데요>도 나왔구나.
이번엔 어떤 진상님들이 소개될지.


소설가들의 소설이라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거의 다 읽었고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앞으로 읽을 예정이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서 어느 편이 가장 좋았는지 말하기 어렵다. 실은 이 소설집을 감히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무신경하게 흘려 넘어갈 부분들까지 집요하게 관찰하여 그에 맞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오래오래 공들인 느낌이 난다.
끝없이 내가 지나온 생의 어느 단면을 비추어 때로는 아주 환하게 밝히고 때로는 아주 어둡게 가라앉힌다.

어제 기후가 불안정한 날
도서관에서 순식간에 읽었다.
아이랑 도서관에 가면 몰입도가 높은 일본 사회파 추리소설류를 보는듯하다. 약간의 길티 플레저를 품고.
아이는 문제집을 가져가더니만(내가 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옆에서 줄곧 출간된 웹툰만 보고 있었다. ㅋ
<고백>은 명성대로 진짜 숨도 안 쉬어지게 사람을 몰아간다. 구명보트에 몇 명만 탈 수 있는데 누굴 태울거냐 라는 식의 질문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소설은 내내 이런 식이다.
읽으면서 으으으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 이미 사회면 기사에서도 이런 흉측한 일들을 자주 보는데 왜 자꾸 보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내 안 어딘가에 이런 음습함이 있는 건가 ㅋ


갈루아의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를 아들이 진짜 재미있게 보아서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도 주문했다.
<세뿔돼지>라는 단편이 딸려 와서 먼저 보았는데 병맛 코드. 사춘기 남자애는 참 좋아한다.
*
딸아이는 내가 여기 한데 모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책을 즐겨 읽고 있다.
반면에 아들의 독서는 진짜 빈약하다. 웹툰 모음에 치우쳐 있다. 예능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인가보다 하고 그냥 두고 있다.
이제 내 책을 읽느라 따로 아이들 책을 봐줄 여력이 없다.
그냥 언젠가 또 자신들 페이스를 찾을 날이 오리라 믿어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