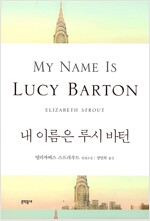

어제는 잠이 드는 게 어쩐지 아까워서 이런저런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연예인이 일반인 가정에 방문해 함께 밥을 먹는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장충동'
어릴 때 서울에서 남산은 자주 갔지만 장충동은 기억에 없다. 밝은 빛이 없는 엄마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가끔 등장하는 동네.
엄마 아빠의 연애 시절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고 한다. 좋은 기억으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대화에 질릴 대로 질려서 과거 회상은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다.
어제는 나가는 학교 공개수업을 나름대로 무사히 마치고
엄마에게 안부를 물었다.
최근 일주일간의 근황만.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라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천천히 읽었다.
읽다가 흐름을 놓쳐 다시 읽기를 여러 차례.
어쩐지 그 장면이 그 장면 같기도 한 회상들.
시가로부터 출신이랄 것도 없는 출신의 아이라는 평을 받는 루시 바턴은 이제는 작가로 성장해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그래도 아플 때는 원 가정이 생각나기도 할 것이다.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전 이야기라는 것들은 거의 전에 알던 사람들이나 함께한 아주 오래전의 시공간에 대한 단편들일 뿐이다. 대화는 자주 어긋난다. '나' (루시 바턴)는 엄마가 나의 삶에 대해 물어봐주기를 바라지만 엄마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다.
사람은 지치게 마련이라는 것을. 마음, 영혼, 혹은 몸이 아닌 뭔가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이건 그것은 지치게 마련이다. 100쪽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보다 스스로를 더 우월하게 느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지가 내게는 흥미롭다.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어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건, 나는 그것이, 내리누를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하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저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11쪽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을 것임을. 138쪽
"자기가 하게 되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일 거예요.""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이야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니까요." 169쪽
작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의 부침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다들 이런저런 일을 겪고 그래도 살아남았다. 엄마나 이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집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더라, 혹은 이렇게 잘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일어난 사건은 명확하지만, 여러 입을 거치며 조금씩 변주된다. 자신이 현재 처한 처지에 맞게 그 상황이 변주되는 것을 듣는 것이 흥미롭다.
<한 여자>도 아껴가며 잘 읽었다.
앞으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여자가 된 지금의 나와 아이였던 과거의 나를 이어 줬던 것은 바로 어머니, 그녀의 말, 그녀의 손, 그녀의 몸짓, 그녀만의 웃는 방식, 걷는 방식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잃어버렸다. 1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