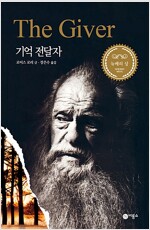


어제 휴일이라 아이들과 있는 중에 <페인트>를 다 읽었다.
"부모를 선택한다면...."이라는 도발적인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어디에선가 본 듯한 설정이면서도 뻔하지만은 않은 결말을 보여주어서 좋았다.
<페인트> 초반부를 읽는데 오래 전에 본 <기억 전달자>, 영화로 <더 기버>도 떠올랐다. <더 기버>는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그 흑백 화면이 주제를 잘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튀지 않고 색을 가질 수 없는 동질성의 사회라면 구성원들은 행복할까?
<기억 전달자>에서는 국가가 재생산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아닌 기능에 집중하여 합리적으로? 사회를 운용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일정 나이에 이르면 능력과 성향에 맞는 직업을 부여받고 누구나 이것에 순응한다.
<기억 전달자>에서는 차별과 사회적 병폐, 전쟁과 갈등,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감정을 거세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
<페인트>에서는 혈연에 기반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과연 온전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것인지에 대하며 묻고 있다.
'혈연'은 '운명'이라는 말로 필연인 듯 강조되지만 실은 '우연'에 기반한 제비 뽑기일 뿐이고 이 우연한 제비 뽑기로 평생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버려지는 것보다 더 최악인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현실에는 부모나 자녀를 우연한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을 보면 제발 부모 자격 좀 심사해야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국가는 NC 센터를 운영하여 여러 가지 연유로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이들이 직접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NC 센터 아이들의 부모로 뽑힌 사람은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회 보장 제도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 국가가 엄격하게 개입하여 꾸준히 감시한다.
주인공 제누 301, 출생달과 고유번호가 부여된 아이들, 최, 박이라는 성으로만 불리는 가디(양육자)들이 부모를 면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서로 각자의 속셈이 있어 '면접'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키같이 부모를 선택하기 전부터 새로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마음을 품고 있는 순한 성정의 아이도 있다.
"형, 나는 사랑도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36쪽
제누 301은 부모 면접에 대해 냉소를 품고 있고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한 아이이다. 성인기까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NC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지만,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NC 출신이라는 꼬리표...어디에서 많이 본듯하다.
현재의 보육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가톨릭 제단의 성 00의 집이라는 보육원이 있다. 이쪽 아이들을 어떤 엄마들은 형제원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멋대로 독재정권 시대나 볼 법한 이름인 형제원이라 부르는데 충격을 받았고 대놓고 다른 초등학교도 거리는 비슷한데 왜 우리 애들 학교에만 형제원 애들이 배정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는 엄마를 보고 2차 충격.
다시 소설로 돌아가 영유아기 양육의 고됨, 시간의 결이 쌓이지 않은 관계는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았다.
어떤 끈끈함?이나 상처 없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관계라면 더 합리적이고 담백할 수 있을까? 제누 301과 하나 부부의 만남과 같이.
그리고 혈연에 기반한 부모는 아니지만 실질적 양육자인 가디 '박'과 제누 301은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해간다. 서로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감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관계.
이것이 이상적인 가족 관계와 가깝지 않은가!
원칙과 규율을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 힘든 것은 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일이었다. 113쪽
가디의 이 고민은 현재 내가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의 말처럼, 어쩌면 부모 역시 자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몰랐다. 자녀가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녀로부터의 진정한 부모 독립 말이다. 160쪽
*
내가 선택한 색깔로 칠하는 미래, 라는 소설 말미의 이 구절이 좋다.
수저 계급론에도 신물이 나고
공동체의 '돌봄'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성찰하고 각종 제도가 보완되면 좋겠다.
양육과 노후보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모두가 짓눌리지 않았으면.
*
<페인트>도 영화 <기생충>같이 읽다보면
혹은 읽고 나서
오만 생각이 들게 한다.
*
참, 중간에 도서실 열람실에서 휘리릭
배우 봉태규 님 에세이를 읽었는데
이런 분이 가디를 한다면 참 좋을듯하다.
(하시시 박이 아이가 있어 스케줄이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 못 미더워하는 현실)
"... 이런 현실에 분개하는 나와 달리 원지는 의연했다. 세상의 모든 여자 엄마들이 그렇듯이 원지도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겨우겨우, 그러나 꿋꿋하게 이겨냈다. 내 눈에 비친 하시시 박은 그랬다. 이런 일은 바다에 넘실대는 파도처럼 당연하게 다가오는 걸 아는 듯. 그 모습은 담대함을 넘어 황당해 보일 정도였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파도의 높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똑같은 바다잖아, 라는 태도랄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다. 직장에서 엄마의 태도란, 직업 없는 여성처럼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일해야 한다고. 지금도 원지에게는 파도가 치고 있다. 어떤 크기의 파도가 그녀를 때리고 있을지 짐작만 갈 뿐 나는 알지 못한다. 태풍이 지나갔다 해도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엄마 여자인 원지에게는 그냥 바다일 뿐이니까." 130-1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