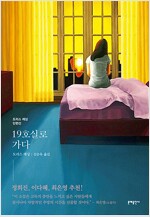어제 떡볶이를 먹었더니만 더부룩해 깼나보다.
<베를린 일기>에서 최민석 작가는 이제는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을 나이라고 했지만
40대라면 그건 좀 과장이다!
(사실 안 부러져봐서 잘 모른다.)
그냥 이제는 떡볶이 같은 걸 먹으면 잘 소화시키지도 못할 나이라고 우겨본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처자의 사정이 궁금하기도 했고 나도 어려서부터 워낙 떡볶이를 좋아해 무려 사서 읽었는데 실망스럽게도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기분부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힘들다는 건 아는데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은 뭔가 모범적으로 흘러가고 내가 그 시기를 건너와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요즘 독립 출판물들도 다 소소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이 에세이도 어떤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난 아마도 이런 에세이를 읽어야 했나?


도서관에서 대강 훑어봤는데 내 상황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주부라 해도 상황이 다 너무나 다르다.
남편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떤지, 본가와 시가가 어떤지, 하는 일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생활이 다르고 감정의 결이 달라진다.
그냥 가끔씩 글 한편 써서 혼자 조용히 간직해야겠다.
요즘도 너무 힘들 때면 보안 걸어서 뭔가 끄적이기도 한다.
농담 삼아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비번 줄 테니
출간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비번을 잊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불가능하다.
대개는 그런 파일들을 얼마 지나서 삭제한다.
남아 있다고 해도 어디 출간할 수준도 아니고.
한바탕 수다 떨 친구나 지인? (아줌마 용어인데 이 지인이라는 말이 내게는 낯설고 별로다. 뭔가 아줌마 수다에서 자신만의 써클임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 이 단어에 대한 나만의 느낌이다, 물론)이 없어 이 방식이 그나마 낫다.
흠흠....
그나저나 <죽고 싶지만...>
아, 진짜 나중에 살걸,
포크를 왜 이제 주냐고.
<언젠가...>는 엄청나게 기대를 한 탓인지 초반에는 잘 읽히지 않았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읽고 있다.
<나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제 오전에 애들 도서관 데려다주려다가 미사도 빠지고 읽게 된 책이다.
막돼먹은 영애 씨 작가인 저자는 '영혼결혼식'이라도 열어 그간의 축의금을 회수받고 싶을 정도이며 엄마가 혼자 살아도 되지 하고 슬며시 내려놓는 말을 하면 엄마라도 포기 안 했으면 한다고!
결혼은 했지만 뭔가 정신적으로는 싱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 그런지 공감이 간다.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더라도 비슷했겠지.
저자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더구나 일을 관둔다면
진짜 나에게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늘어간다.
올해 내 다이어리?를 봐도 본가, 시가 행사들, 아이들 건사할 일들, 부업으로 꽉 채워져 있다.
<잘 돼가? 무엇이든>은 보고 싶기는 한데 실망할까봐 두렵다.
한국에 얼마 안 되는 여성감독은 어떻게 살았고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하다.
감독님의 부모님이 나이 들면 좋은 일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
신체나이가 젊은이 못지 않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소수라 해도 나이가 들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안녕, 헤이즐>은 못 봤으나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를 지난 주 내내 애들이랑 다니며 누더기 시간에 봤다.
'아만자'들의 사랑은 더 특별한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시니컬하면서도 나긋나긋한 이 이야기는 내 메마른 감수성 우물 밑바닥을 잠시 적셔 주었다.
그래도 나는 뭔가 이런 성장소설 같은 이야기를 읽어주어야 조금은 힘이 난다.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죽어가면서 한 뼘 더 자라는 이야기라고 할까?
남부의 폭염에 지쳐 더위먹은 소리인가?
사실이 그렇다. 몸의 소멸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헤이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뭔가 <원더>의 어기의 부모님과 같다.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분들은.
있겠지,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자주 가는 청소년 도서관 한 벽이 웹튼 코너가 되자 도서관이 중고생으로 붐빈다.
열람실도 아니고 서가 테이블마다 중고생 아이들이 문제집을 펼쳐두고 웹툰 단행본을 보고 있다.
열살, 열두살 초등 고학년 우리 아이들 자기들도 십대라고 이 대열에 합류 무진장 웹툰을 보고 있다.
특히 <신과 함께>를 둘 다 너무나 좋아해서 1편은 뒤늦게 집에서 2편은 극장에서 같이 보았다.
원작을 너무 망쳤다는 이야기가 자자해서 안 보려다 봤는데 그냥 재창작 수준이고 캐릭터 성격도 변해서 아이들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어느새 이만큼 커서 같이 12세 관람가도 보러 다니고
차원 높은 얘기도 하고 감격 ㅜ.ㅠ
(그래봐야 그렇게 거짓말 하면 거짓 지옥에 가서 혀가 쑤욱 이런 수준이지만)
아이들이 미취학 꼬꼬마를 벗어나니 물리적인 에너지는 덜 드는? 대신 정신적 소모가 상당하다.
여전히 톰과 제리 수준인 남매 사이를 중재하다가 (그 와중에 서로 니가 톰이네 하고 우긴다)
폭발하기 일쑤다.
나와서 외식 메뉴 하나 통일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짜장에 밥이나 비벼먹어, 가 되버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호실...> 읽다가 답답해져서 일단 두었다.
책도, 떡볶이도 아니고
나에게도 '19호실'이 필요하다.
이 폭염이, 방학이, 이런저런 행사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가을에 차분히 읽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