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 [지금, 사랑해도 될까요?] 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상의 친구'가 존재한다. '상상의 친구'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들이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는 보이지 않되,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존재. 그들은 어른의 형태로 아이들의 옆에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적절한 때, 그들은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준다. 다정한 우정과 보호도 함께준다.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슬프다거나 외로워할 때, 그들은 아이들의 옆에서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시의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쯤 극복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더이상 그들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자랐을 때, 아이들의 곁을 떠난다.
이 '상상의 친구'란 존재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들의 옆에서 아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 어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들이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다정한 존재. 그러나 말 그대로 이 존재는 '상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없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어른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만 하는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앨리시어와 그의 동생에게는.
그럼 세라, 그녀는 말했고 앨리시어와 그의 동생이 셈을 시작한다. 하나를 세고 둘을 세고 셋을 세고 넷을 세고 다섯을 세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세고 열로 넘어갔다가 잊어버렸다.
안 세? 앨리시어의 어머니가 말한다.
내가 세라고 했지? 세라고 했는데 왜 세지 않냐 몇 대까지 맞았는지 세지도 못하냐 잊어버렸냐 너는 그 정도 머리도 없는 짐승이고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면 되겠네? 잊어버린 네가 순전하게 잘못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겠다 세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씨발 십이 십삼 사 오 육 칠 팔 다음이 뭐냐 응? 다음이 뭐야?
앨리시어의 어머니가 짐승을 다스린다. 씨발 상태가 되어 씨발년이 된 그녀는 그녀가 가진 짐승의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를 다룬다. 짐승을 향해 팔을 휘두를 때 그녀는 관절을 어깨 뒤쪽까지 젖혀 완전한 힘을 싣는다. 어개를 움켜잡을 때는 엄지로 쇄골을 쑤시고 배를 때릴 때는 불시를 노리고 짐승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는 정수리에 돋은 머리칼을 쥐고 당긴다. 귀를 꼬집고 뺩을 때리다가 엉뚱한 모서리에 빗맞아 손가락을 비고 악 소리를 지르며 누웠다가 발딱 일어나 짐승의 목을 쥐고 흔든다. 때리는 쪽도 맞는 쪽도 구토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고 그럴 때 그녀의 검은 눈은 쇠구슬처럼 작고 단단하다. 땀이 고인 얇은 턱은 악다불어 터질듯하고 귀는 창백하다. (pp.64-65)

앨리시어와 동생이 엄마에게 얻어터질동안, 그들이 맞는걸 말리는 어른은 아무도 없다. 뒷짐지고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가 있을뿐. 앨리시어와 동생은 엄마에게 허구헌날 얻어터지고 온 몸이 아프고 쑤셔 잠도 안 올지경이 되어 방안에 누웠을 때, 욱씬거리는 몸에 약을 발라줄 어른도 없다. 상상의 친구? 허. 어림도 없는 소리다. 상상의 친구를 상상조차 할 여력이 앨리시어와 동생에겐 없다. 이런 앨리시어와 동생에게 가정폭력상담...따위?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상담을 한 번 받고 앨리시어는 생각한다. 여긴 괜히왔다, 좆됐다, 고. 그래, 앨리시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도 모시고와요. 어머니도 모시고와서 같이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나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나는, 앨리시어가 그런 마음을 먹는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앨리시어가 내내 생각하고 있는 '복수'를 응원했다. 앨리시어의 키가 어서자라, 힘이 더 커져, 얼른 엄마에게 맞짱을 뜰 수 있기를,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손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얼른 자라, 얼른. 얼른 자라라고. 앨리시어는 엄마를 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폭력이 또 이어지면 안되는 거라고 내 의식은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폭력은 한 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리란 사실을. 앨리시어의 엄마가 폭력을 멈추기를, 상담을 받아 새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랄 수가 없었다. 그건 멀고도 멀어 보였다. 멀고도 멀고 끝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길에 있는 것 같았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길을 가라고 누가, 아니 내가, 어떻게 말해. 두 눈 질끈 감고, 그래 앨리시어, 니가 하고 싶은대로 해, 끝내버려. 이를 악물고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겨버려, 한 방에 이겨버려! 그러는게, 온당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웅덩이를 바라보며 드문드문 앉은 다른 낚시꾼들처럼 긴 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앉아 있다가 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활기차게 줄을 감아올렸다. 마침내 흙바닥에 내던져진 물고기는 단단하고 맑은 살집을 꿰고 있는 척삭의 강한 힘이 느껴지도록 몸부림쳤다. 그것을 주워 양동이에 담는 것은 대부분 앨리시어가 할일이었다. 손바닥 속에서 빳빳하게 요동하는 그 힘이 징그럽고 두려워 앨리시어가 움찔거리면 앨리시어의 아버지는 그 모습이 재미나다는 듯 하핫 웃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을 웅덩이에 도로 놓아주었다. 집에서는 별다르게 말하는 법도 없다가 웅덩이 부근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알어?
느긋하게 그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목숨은 모두 가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가치가 있단 말이다.
(중략)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고 보니 그렇더라. 사람이 그렇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어미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귀하고 불쌍한 거지. 세상 나고 자란 목숨 가운데 가치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알어? 가느다랗게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보란듯 웅덩이를 향해 양동이를 엎었다. 낚싯바늘에 주둥이를 찢긴 물고기들이 피로 탁해진 물과 함께 웅덩이로 주르륵 흘러들었다.
(중략)
알아?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는 식으로 그는 말하고 그게 그의 입버릇이지만 앨리시어가 보기에 그는 미개하다. 입을 찢었으면 먹든가 죽이든가. 입을 찢어놓고 도로 놓아주며 가치 있는 목숨 운운하는 인간은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pp.50-53)
어휴, 힘들어. 어젯밤, 뒤에 조금 남은 이 책을 읽고 잘까 하다가, 몇 년전 '송은일'의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던 때가 생각나, 그만두었다. 그 때, 온 몸이 두드려맞은듯, 내가 아팠던 기억 때문에, 황정은의 [야만적인 앨리스씨]를 읽으면 그 밤처럼, 내가 또 얻어맞은듯 욱씬거리는 느낌에 잠을 설칠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출근길로 넘겼다. 넘겼는데, 아침에 읽었다고 더 나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지하철안에서 인상 빡 쓰고 읽으면서, 이 책은, 밤에도 아침에도 읽기에 적절한 때란 게 없다, 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못자는 것을 선택하느냐, 온전히 깨어있어 이 불편하고 아픈 느낌을 감당하느냐, 선택이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대체 이 둘 중에 뭐가 더 낫단 말인가. 휴-
그러니까, '제임스 패터슨' 과 '가브리엘 샤보네트'가 말한 [지금 사랑해도 될까요?]의 상상의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 상상의 친구는, 제임스 패터슨과 가브리엘 샤보네트가 있는, 미국에만 존재하는가 보다. 확실히 여기, 대한민국엔 없다. 확실하다.
어제 알라딘 트윗과 오늘 나에게로 온 이메일을 통해, [폴리나]가 반값이란 걸 알게됐다. ㄴㄲ 님은 나에게 [나도 편식할거야]란 책을 '강력추천' 해주었다. 오늘 아침은, 이 두 책을 가뿐하게 지르고 시작해야겠다. 지금, 지르러 갑니다. (라고 써놓고 지금 주문하려니(AM10:51) 폴리나 반값할인 끝났다. 멘붕..)


그리고, 헌사.
어제 '줌파 라히리'의 신간 [THE LOWLAND]의 책장을 살포시 넘겨보다가, 거기에 적힌 헌사를 읽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헌사'만' 읽었다. 그 뒤는 다음으로 미루고..여튼, 그 헌사가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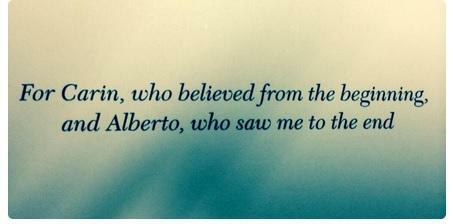
시작부터 나를 믿어준 카린에게,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봐준 알베르토에게, 뭐 이런거 아닌가. 아.....근사해......멋져 ♡
빨리 번역되어 나왔으면..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