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을 읽고 있다. 몽테뉴가 스스로의 게으름에 괴로워하는 대목이 재미있다. 다 이러고 살았구나. 생활 전반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고단해하고 도피하고도 싶어하고. 서른여덟에 자신만의 서재 안으로 들어와 은거하려 했던 그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장면도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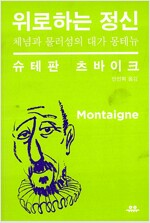
갑자기 읽고 싶은 책들이 마구 출간되는 중이다.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은 시를 잘 모르는 내가 시를 시작하게 해 준 시집이다. 시인은 평범한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을 간파하고 우리가 멈추는 지점에서 더 극한까지 밀고 나가서 어쩌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그것들에 찔리는 천형을 지닌 선택된 자들인 듯하다. 그래서 시어에는 어떤 존귀함이 있다.


반드시 또 시가 읽히고 시를 쓰는 일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기를 올 것임을 믿고 싶다. 시를 포기하고 남는 자리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밀려온다.

파스칼 키냐르를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형형한 눈빛의 노작가의 인터뷰 내용은 꼭 알고 싶다. 생각해 보면 그런 작가들이 많다. 정작 그 사람이 낸 책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 자체에만 관심이 가는... 아마 폴 오스터도 그럴 거다. 김영하가 팟캐스트에서 전문을 읽어 준 그의 단편 하나만이라도 읽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머리숱이 많아 머리를 다 늘어뜨리면 붕 뜨곤 해서 항상 묶고 다녔었다. 머리숱 좀 줄었으면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느새 내 앞에 와 있다. 이제 반묶음을 하지 않아도 머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 머리숱이 줄어버렸다. 지금 생각하는 일년이 어린 시절 생각하던 일년의 무게의 십분지 일도 되지 않는다. 한 달은 하루 같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달라진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절절하다. 영원히 읽을 수도 없다. 다 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이제서야 좀 어른이 되어가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