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두 개의 이름 ㅣ 푸른숲 어린이 문학 32
크리스티 조던 펜턴.마거릿 포키악 펜턴 지음, 김경희 옮김, 리즈 아미니 홈즈 그림 / 푸른숲주니어 / 2013년 9월
평점 :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 가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누이트 뿐만이 아니라 아만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외 오지에서 자신들만의 방식과 역사 문화 전통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점점 현대 문명이라는 침범아래 점점 그 터전을 잃어가기도 하지만 현대 문명에 물들어 가 더이상 그들만의 고유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다. 그렇다고 그들이 현대 문명에 발을 들여 놓고 잘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과 현대 문명 사이에서 방황하듯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이누이트족의 이중적인 삶을 다룬 다큐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누이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켜 나가고 싶지만 환경이 또한 예전과 같지 않다. 점점 환경은 파괴되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대 문명인들이 그들의 삶으로 침범하여 두 문화가 충돌하기도 하는 현장의 아픔을 보고는 먹먹하던 순간이 '올레마운 포키악' 의 삶의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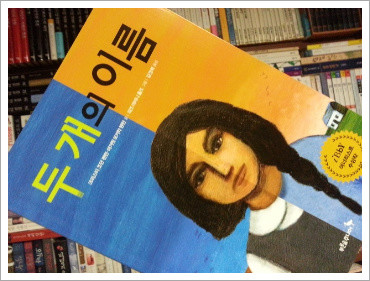
원래 땅의 주인이며 그곳에 역사를 두고 있는 이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원주민 기숙학교를 짓기도 하고 상점을 짓기도 하고 원주민의 삶을 흔들어 놓은 외지인들, 그곳에 올레마운은 2년여 동안 부모와 동생들과 떨어져 이누이트 언어가 아니고 생황방식이 아닌 영어와 수녀들에 노동을 강요당하고 완전히 원주민이 아닌 문명인처럼 바꾸어 나가기도 했지만 이년이란 세월동안 몸과 마음은 이누이트족이 아니라 외지인이 다 되어버렸고 적응을 해 버렸다.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강요당하였기에 이누이트들의 말을 다 잊었고 음식 또한 그들의 부드러운 음식에 길들여졌는가 하면 옷과 신발 또한 거칠고 추위를 막아주는 옷과 신발이 아닌 스타킹과 캔버스화에 어느새 길들여져서 그녀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 왔지만 엄마도 그녀의 동생들도 낯설어 하는가 하면 같은 동네 사람들도 낯설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마음을 아빠만은 알아 주면서 그녀를 다독인다. 그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빠는 그들의 삶이 침범 당하는 가운데에 적응해 살면서도 자신들의 고유의 삶과 문화를 잊지 않게 올레마운에게 가르친다. 그들은 뼈 속 깊숙히 '이누이트' 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아무리 겉치레로 외지인의 언어와 음식 옷을 걸친다고 이누이트가 외지인으로 변하지는 않다는 것를 딸에게 가르친다.
올레마운에게 2년이란 기숙학교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친구도 빼앗아 갔지만 이누이트족에게도 섞이지 못하고 겉돌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아픔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깊숙히 자리하고 들어오는 외지인의 삶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란 것,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상점에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살아 남기 위해서 선택이란 어쩔 수 없다. 이누이트는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삶을 하지만 올레마운의 아빠는 변화에 적응하듯 천막과 통나무로 통나무 집을 짓고 정착의 삶을 선택한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 옆에서 힘을 보태며 다시금 이누이트 삶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고 언어를 다시 배우고 다시 이누이트로 돌아 온 올레마운,이제는 2여년전의 기숙학교에서 돌아 왔을 때의 나약한 올레마운이 아니다.아빠가 선물해 준 올레마운의 개인 개썰매도 자신 있게 끌고 아빠의 일을 돕기도 하는 그야말로 당당하고 강인한 이누이트로 우뚝 성장을 한 가운데 다시금 정부의 뜻에 따라 동생들과 함께 원주민 기숙학교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젠 강인해졌기에 동생들도 책임질 수 있는 여성이 된 것이다.
이누이트는 그야말로 거친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삶에서 현대 문명에 갇혀 부드러운 것에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나이가 어려도 그들은 뼈 속 깊이 이누이트다.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기숙학교 생활은 부모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큐에서도 보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었다. 야생에서의 그들의 삶이 도시의 각박한 삶에 깃들여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21세기및 그 이후의 삶을 고집한다는 것은 글쎄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너무 침범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그들의 슬픈 역사를 조명한 이야기 이기에 더욱 맘이 아프다. 뒷이야기와 [올레마운의 사진첩] 에는 이야기의 맞는 사진들이 있다. 올레마운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외지의 문화가 그들의 삶 깊숙히 침투하여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이 있어 참고로 본다면 더 이해가 빠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일제 강점기를 생각했다. 우리의 말과 글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시간,그 잔재는 아직도 우리 삶에 뿌리를 깊숙히 내리고 있다. 이누이트의 삶과 역사 또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현대인의 욕심만 내새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고 지킬 것은 지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