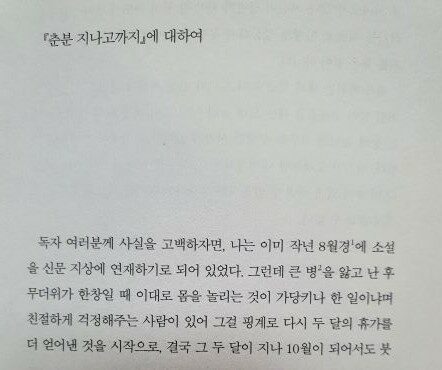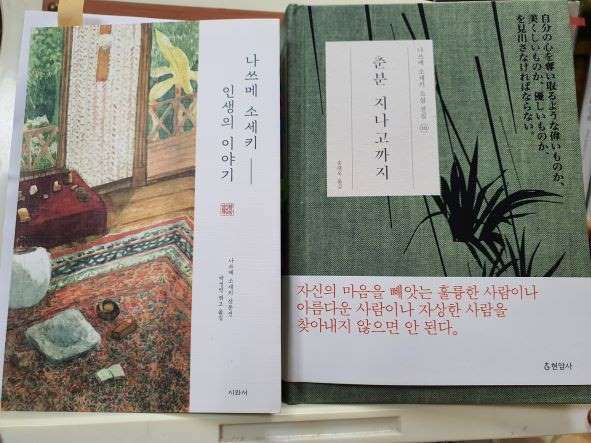죽음을 멀리서 보는 것과 그 경계 가까이 가본 경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죽음 앞에까지 갔던 나쓰메 소세키는 침상에서
“생사란 완급(緩急), 대소(大小), 한서(寒暑)와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것들의 연상(聯想)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한 쌍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 생사라는 말이 같은 종류의 연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떨어진 두 면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연이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나는 이 동떨어진 두 면을 어떻게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고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77p)
하고 자문한다.
갑작스레 죽었다가(거의 죽었다가) 갑작스레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는 오싹해질 뿐, 그 마음을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모른다.
“힘을 겨루는 스모 선수가 서로 맞부딪힐 때, 모래판 한가운데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의외로 고요히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뱃살은 무시무시한 파도처럼 위아래로 출렁일 것이다. 뜨거운 땀방울이 몇 줄기씩이나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79p)
탁월한 비유다. 뱃살이 출렁이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고요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스모선수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침상에 누워 있는 자를 바라보는 것, 또는 멀리 있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스모의 처음 고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시무시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남아 있는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공평하지만 냉혹한 적인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자기 힘으로 버텨야 할 스모선수처럼 괴로운 존재다. 승부가 나야 모래판을 내려 올 테니까. 그는 이 냉혹한죽음에 대한 소름 돋는 체험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따뜻한 감상을 써내려 간다.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도스토예프스키를 기억한다. 사형장에서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기 직전 살아난 러시아 작가의 오싹한 체험, 살아난 행복을 소환한다. “죽음과 삶에 따르는 두려움과 기쁨이 마치 종이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었기에 내 상상의 끝에는 언제나 도스토옙스키가 떠올랐다”(85p)고 한다.
피를 토한 그는 모래판에 쓰러진 스모선수와 다름이 없었다. 병에 밀려 쓰러진 그를 따뜻이 감싸준 것은 오히려 그 병이었다. 아니 그를 치료하는 의사, 간병하는 간호사들, 그를 찾아오는 지인들의 호의로 둘러싸였다. 죽음 앞에서 용기를 잃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그의 두려움과 차가운 마음을 감싸주었다. 손뼉을 쳐서 부르지 않으면 하녀조차 얼씬 않던 그에게, 의사가 다가오고, 회사직원이 다가오고, 아내가 다가오고,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들에게서 의무가 아닌 호의를 느꼈다.
“나는 호의가 메마른 사회에 존재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다.”(86p)
호의가 메마른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색했던 그가 병상에서 호의를 경험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의 그와 현재의 그 사이에 대조가 또렷해서, 퇴원 후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러니’라는 말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의 수필 <생각나는 것들>은 1910년 위궤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위독했던 ‘슈젠지의 대환’을 겪고 쓴 수필이다. 이 수필은 강연, 수필, 편지글들을 함께 엮은 『나쓰메 소세키-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다.
『춘분 지나고까지』를 연재하며 나쓰메 소세키는 머리말에 이 작품을 쓰기 2년 전 아팠던 사실을 언급한다. 그 후에도 계속 쓰는 것을 미뤄왔던 건강상태에 대해 언급한다. 오랜 만에 쓰는 작품이니 독자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싶었다는 말과, 생각처럼 오래 쉰 기간을 벌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고백하고 있다.
죽음 앞에까지 다녀온 작가, 그가 들여다본 인간의 마음은 관조적이고, 삶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춘분 지나고까지』의 머리말을 보며 이 수필이 떠올라 다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