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흰 - 한강 소설
한강 지음, 차미혜 사진 / 난다 / 2016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원문: http://blog.naver.com/kelly110/220937284261
작년에 소설가 한강씨의 수상 소식을 듣고 두 권의 소설을 읽었다.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보다 ‘소년이 온다’가 좋았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보다는 우리의 암울한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의미 있게 다가왔나 보다. 그 때도 이 책이 인기였는데 다음에 읽어야지, 하고 미루다 도서관에 꽂힌 걸 보고 빌려와 읽었다.
시도 아닌 것이, 에세이도 아닌 것이, 소설도 아닌 것이 묘하게 섞인 책이었다. 주제는 단 하나 ‘흰’으로 연상되는 것들이다. 실제로 흰 것도 있고, 희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다. 책의 주제로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걸 골랐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자로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 태어난지 두 시간만에 죽었다는 언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 얼마나 크게 자리잡은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두 형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그녀와 남동생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읽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오묘하게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흰색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소금, 눈, 각설탕과 같은 보기에도 흰색인 것 말고도, 배내옷, 파도, 재, 은하수, 당의정, 백야, 넋과 같은 연상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경험이 녹아 있는 소재를 골라 서로 조금씩 연결되게 적어 내려갔다.
약간의 어두움과 멋진 문장, 그리고 작가만의 경험들이 만나 좋은 책이 되었다. 이 책을 보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책 나도 쓰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보고 ‘너는 쓰지 않았잖아.’하고 말하겠지. 중요한 건 생각한 것을 써서 책으로 냈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나도 쓰고 싶다.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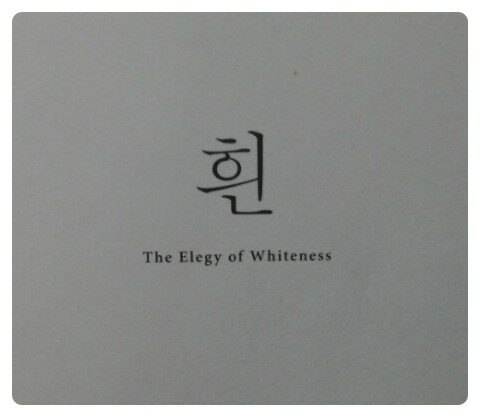
- 활로 철현을 켜면 슬프거나 기이하거나 새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거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 (10쪽)
-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지만, 이따금 각설탕이 쌓여있는 접시를 보면 귀한 무엇인가를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된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는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게 모든 걸 물들이고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83쪽)
- 길었던 하루가 끝나면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 난롯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듯, 침묵의 미미한 온기를 향해 굳은 손을 뻗어 펼칠 시간이. (126쪽)
- 언니, 라고 부르는 발음은 아기들의 아랫니를 닮았다. 내 아이의 연한 잇몸에서 돋아나던, 첫 잎 같은 두 개의 조그만 이. 이제 내 아이는 자라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열세 살 그 아이의 목까지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준 뒤, 고른 숨소리에 잠시 귀기울이다 텅 빈 책상으로 돌아온다. (12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