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랑 ㅣ 시작시인선 123
오봉옥 지음 / 천년의시작 / 2010년 11월
평점 :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강의 중 문예창작의 첫걸음이라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교재인 이 책을 미루다 이제야 구입했다. 강의 도중 인용하실 때 들었던 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이 시집에 담긴 시들의 특징이라면 정겹다는 것이다. 전라도 사투리가 간간히 섞인 시들은 우리의 삶을 재미나게 보여준다. 시인은 압류 딱지 붙이는 사람이 되었다가 노래방 도우미 나간 부인을 기다리는 무능한 남편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미루나무와 구름이 되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시인은 좋겠다.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사는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감정이입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건 시인의 탁월한 재능인 것 같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두음이나 각음이 리듬처럼 등장하기도 한다.‘사진’이라는 시에서‘팡’하는 의성어가 반복되어 소리내어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진다.‘한잔’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앉은뱅이 술'이라는 시도 그 말 때문에 더 재미있다.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시집을 읽으며 시인의 눈을 통해 나를 보게 되었다. 연륜이 묻어 나오는 시집은 젊은이들의 고뇌와는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 같은 면도 있다는 것이다. 시인들은 언제나 청춘인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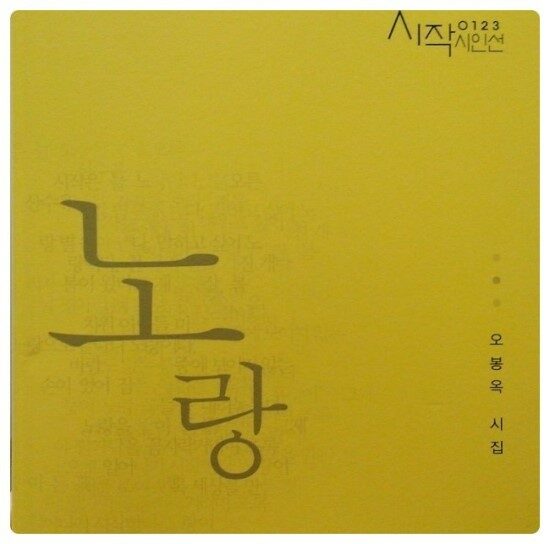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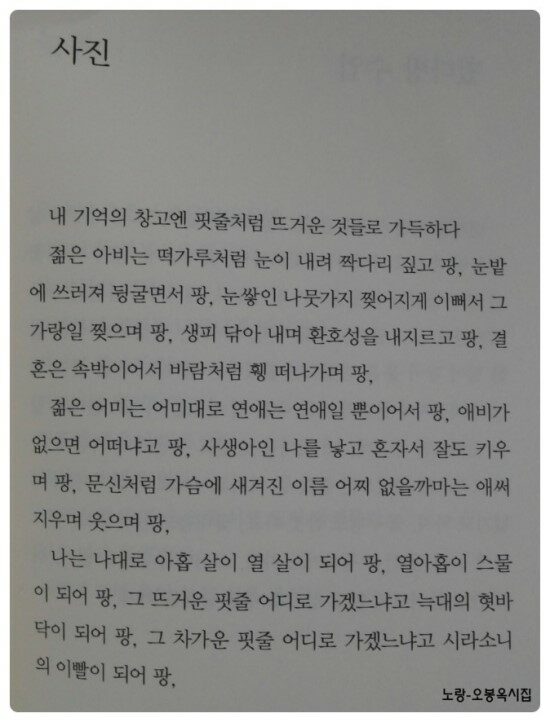
원문: http://blog.naver.com/kelly110/220334026239
- 노랑 (30쪽)
시작은 늘 노랑이다. 물오른 산수유나무 가지를 보라. 겨울잠 자는 세상을 깨우고 싶어 노랑 별 쏟아 낸다. 말하고 싶어 노랑이다. 천 개의 입을 가진 개나리가 봄이 왔다고 재잘재잘, 봄날 병아리 떼 마냥 종알종알, 유치원 아이들 마냥 조잘조잘. 노랑은 노랑으로 끝나니 노랑이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잠든 아이를 내려놓듯이 노랑 꽃들을 내려놓는다. 노랑을 받아 든 흙덩이는 그제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초록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노랑이 저를 죽여 초록 세상을 만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