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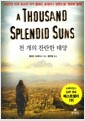
-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 200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미사일 세례로 멀쩡하던 이웃들이 죽어 가고, 도둑질만 해도 손을 자르는 무시무시한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수십 년 동안 겪은 일이다.
마리암의 어린 시절. 부인이 세 명이나 있는데도 하인으로 있던 마리암의 어머니에게 임신을 시킨 마리암의 아버지 잘릴은 쫓겨나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고 있는 이들 모녀를 일 주일에 한 번은 찾아왔다. 아버지를 찾아 떠난 마리암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슬픔에 직면한다. 이후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마리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점점 괴팍하게 변해 가는 남편 옆에서 쥐 죽은 듯 살고 있었다.
이웃에 살던 라일라는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친하게 지내던 동네 오빠 타리크도 멀리 보낸 채 마리암의 집에 들어간다. 타리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라일라는 마리암의 남편 라시드의 둘째 부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 첫 아이의 출생에는 비밀이 숨어있기도 했다. 첫 딸과 둘째 아들을 낳은 라일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라시드의 잔인한 폭력에 저항하기도 한다.
라시드에 대항하느라 동지가 되어버린 라일라와 마리암.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생각을 갖는데, 당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라 분위기가 살벌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자와 동행해야 하고,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만 했다. 여자들만 돌아다니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졌다.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라일라와 마리암이 소녀였을 때 그녀들이 가졌던 꿈들은 어른이 되어 산산이 부서지고, 사회적, 가정적 압제에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온몸을 가리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답답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전직 의사이자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았거나 되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담담하게 그려냈다. 억압 속에서 우정을 나누는 마리암과 라일라의 끈끈함에 감동 받았다.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게 되어 좋기도 했다.
원문 출처: http://blog.naver.com/kelly110/220265349870
- 1974년이었다. 라마단이 그해 가을에 찾아왔다. 마리암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초승달이 뜨면서 도시 전체가 탈바꿈하고 리듬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보았다. 그녀는 카불 전체에 졸린 듯한 침묵이 깃드는 걸 보았다. (109쪽)
-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서 이걸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이 축제 속에서 그녀를 보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만족감이라는 것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113쪽)
- 아지자가 깨어나서 울고 라시드가 빨리 와서 아이의 입을 닥치게 하라고 소리를 쳤을 때, 라일라와 마리암은 눈길을 교환했다. 편안하고 뜻있는 눈길. 라일라는 말없이 눈길을 교환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33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