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의 글쟁이들 - 대한민국 대표 작가 18인의 ‘나만의 집필 세계’
구본준 지음 / 한겨레출판 / 2008년 8월
평점 :

절판

18명의 글 써서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한 책이다. 내가 아는 분들은 이 중 30%정도인데 평소에 좋아하던 분들이다. 하지만 18명 중 여자는 단 한 명 한비야씨 뿐이라는 게 안타깝다.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고 대중성을 고려한 책이 아닌 인문서적 또는 건축 과학 등 전문 서적을 쓰는 분들이라는게 존경스럽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물 파기를 계속 해 온 그분들의 인내가 대단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인 메모하는 습관과 자료 정리 기술은 꼭 배워야겠다. 그 외에도 글 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듬뿍 담겨 있어 계속 메모하며 읽게 된다. 그들의 서재가 부럽다.
1. 국문학 저술가 정민
-15쪽: "그는 글쓰기를 샘물과 펌프 물 퍼내기로 비유한다. 샘물은 퍼낼수록 고이니까 아껴 쓸 필요가 없고 쓸수록 생산적이 된다."
-16쪽: "놀라운 글 생산력은 글 쓰는 재미에만 빠져 사는 생활에서 나온다. 그는 '올빼미형' 글쟁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2시까지 글을 쓴다. 낮에는 시간 내기가 불가능하다. 가장 좋아하는 때는 주말이다. 하루 종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밤에만 쓰는 것도 아니다. 가능한 모든 순간 글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 지하철로 통근하던 시절에는 출퇴근 시간도 그에게 중요한 창작 시간이 되었다. 그는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을 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볼펜이 없을 때는 볼펜을 산 뒤 지하철을 탔다고 한다."
-22쪽 글쓰기 팁 "글에서 부사와 형용사를 30%만 줄이면 전달력이 더 강해진다. '~이다.'를 기본으로 '~있다.'와 '~것이다.'를 적절히 사용하라."
-추천도서: 김흥호 [생각 없는 생각]
2. 미술 저술가 이주헌
-저서: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3. 역사 저술가 이덕일
4. NGO 저술가 한비야
-62쪽: "한씨의 일기장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일기장이다. 취재수첩같이 생긴 작은 스프링 노트에 그날 하루 '느끼고 떠올린 모든 것'을 적는다. 일기를 쓴다기보다는 메모를 습관처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날 접한 모든 반짝이는 것들을 소중히 메모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메모를 해댔다. 표현이 좋다 싶으면 바로 받아 적고, 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며 바로 적곤 했다. 누가 누구를 취재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의 책이 특히 생생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수시로 적은 메모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글쟁이에게 메모가 얼마나 소중한가? 실제 글쟁이들 상당수가 메모광이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도 잉크를 따라가지 못한다. 글쟁이에게 메모보다 좋은 무기는 없다."
5. 동양철학 저술가 김용옥
6. 변화 경영 저술가 구본형
-[익숙한 것과의 결별]
7. 만화가 이원복
8. 자기계발 저술가 공병호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 [자기 경영 다이어리], [10년 후 한국]
9. 과학 칼럼니스트 이인식
-[미래 교양 사전]
-135쪽: " 그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 자료를 엄청난 분량으로 쌓아 놓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과학 글쓰기의 재료이며, 널리 있는 자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안목이 중요하지 그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료수집은 필요한 자료들을 잘 찾아내어 '묵히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분야별로 자료를 골라 모아놓고는 기다린다. 분야별로 파일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는데, 이런 노트가 30여권에 이른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료들이 글이 되어 써 달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가온다'고 그는 말한다."
10. 민속문화 저술가 주강현
-[독살], [두레], [관해기]
-146쪽: "주씨 역시 다른 대부분의 저술가들이 그렇듯 '메모광'이다. 그러나 메모를 중시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누구라도 놀랄 정도다. 메모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씨는 온 정성을 바쳐 메모를 관리하고, 보존한다. 우선 어떤 생각이든 아이드어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수첩이든 종이쪽지에든 반드시 적는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에 메모를 입력한다. 그리고 메모 원본을 전용 보관함에 항목별로 넣어 보관한다.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의 느낌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주씨가 꺼내어 보여준 메모들은 가지각색이었다. 책의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각종 카피 글귀, 구성도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메모가 가득했다. 사소한 자기 생각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저술의 시작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11. 만화작가 김세영
-[오! 한강], [타짜]
12. 건축 저술가 임석재
-165쪽: "그야말로 책의 바다였다. 글쟁이의 서재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싶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책들이 압도해 오는 것 같았다. 눈길 닿는 모든 곳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임석재 교수(이화여대 건축학과)의 집필실인 아파트는 개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건축 도서관이었다."
= 나도 교육 서적을 수집하고 읽자. 명색이 교육 전문가인 교사인데 정작 교육
관련 서적이 몇 안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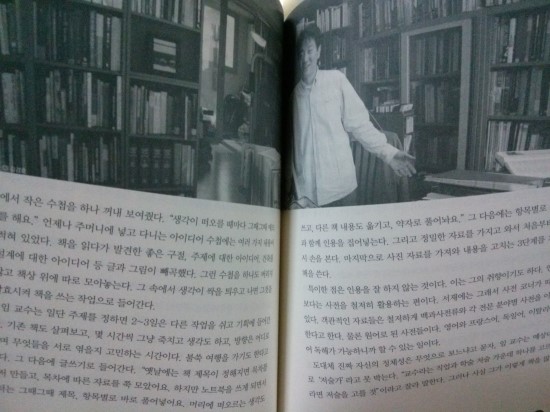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서양 건축사]
-169쪽 "임교수의 일상은 모든 것이 글쓰기에 맞추어져 있다. 방학이면 해외로 취재 가고, 평상시에는 주말을 이용해 전국을 답사한다. 방학이 되면 해외 취재 외의 시간에는 취재모드가 집필모드로 바뀐다. 집중적으로 책을 쓸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오후 6시까지 운동 1시간과 낮잠 20분을 빼고 오로지 글을 쓴다. 대신 글 쓰는 장소를 자주 바꾼다. 노트북을 들고 거리로 나가 카페에서, 다른 대학 구내식당에서,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원고를 쓴다. 오전에는 집에서 써도 오후에는 돌아다니면서 쓴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돌아버릴 일이죠. 트이고 약간 소음이 웅웅거리는 공간이 머리에 더 자극을 줘요.'"
13. 교양미술 저술가 노성두
-[렘브란트], [성화의 미소]
14. 교양과학 저술가 정대승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정대승의 과학 콘서트]
-191쪽: "편집자 김형보-"베스트셀러 작가와 아닌 작가의 차이는 글쓰기 능력보다는 독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 시기에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지 아는 기획적 사고에 달려 있다."
15. 동양학 저술가 조용헌
-[방외지사], [사찰 기행]
-"Facts tell, stories sell"
16. 전통문화 저술가 허균
-[고궁 산책], [나는 오늘 옛 그림을 보았다]
17. 서양사 저술가 주경철
-[문화로 본 세계사]
18. 출판 칼럼니스트 표정훈
-[탐서주의자의 책],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241쪽: "소설이든 아니든 1천매짜리 원고를 책 쓰는 심정으로 먼저 써 보라. 원고지 1천 매는 300쪽 안팎의 책 한 권 분량이다. 책 한 권을 써 보는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 경험의 유무는 글을 쓰는 데 있어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