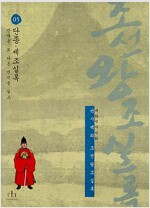청령포를 나온 우리는 장릉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장릉으로 향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후 세조는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 하지만 청령포로 문안을 다니던 호장 엄흥도는 삼족이 멸할 것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둬 지금의 자리에 몰래 모셨다. 그렇게 영월 한 귀퉁이 숲속에서 외로이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봉분이 왕릉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은 중종(1516년) 때로 단종이 돌아가신 지 50여 년이 지난 후다. 후대 임금들도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알기에 중종 이후 임금들은 모두 단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본보기다.
단종으로 복위가 되고 능호를 장릉이라 한 것은 숙종 때(1698년) 때다. 단종(端宗)은 짧게(短 ) 살아서 단종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여기서 끝낸다는 의미에서 끝 단(端) 자를 썼다고 한다.

장릉 올라가는 길. 전날 제주에서 올라온 아들이 엄마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솔밭 사잇길을 걸어 올라가면

장릉이 나온디. 호장 엄흥도가 동강에 버려진 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던 단종 시신을 수습, 관을 지게에 지고 엄씨 선산인 이곳을 오르다가 잠깐 쉰 후 다시 지게를 지고 일어서려는데 지게가 땅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고.
신기하게도 청령포도 장릉도 소나무가 모두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다. 나무들마저 임금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라고 해석하더라. (남편의 말에 의하면 소나무는 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해가 비치는 곳을 향해 뻗게 되어 있단다.)

왕릉의 규모가 단촐하다. 중종 때부터는 왕릉이 소박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라고 한다.


제사를 지내는 곳. 정(丁)자 모양의 정자각 뒤 언덕 위에 왕릉이 있다. 보통 왕릉은 릉과 제사를 지내는곳과 제사 지낼 준비를 하는 재실이 일자로 배치된다고 한다. 하지만 단종은 이런 시설을 나중에 마련했기 때문에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 왕릉 서쪽 언덕 아래에 있다.

영조 때 세워진 단종 비각. 단종의 생애가 새겨져 있다. 조선 왕의 이름은 모두 외자였으나 단종만 유일하게 두 글자 이름이었다고 한다. 홍위(弘暐). 오래 살길 바란 마음과는 달리 가장 단명하는 왕이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를 갖추고 있는 아들.

영천. 단종제를 올릴 때 사용하던 우물로 정조의 명에 의해 만들었다.

배식단.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 환관, 여인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엄흥도 정려각. 단종을 끝까지 모신 엄흥도의 충절을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 영조가 세웠다.

조선 왕릉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임금을 유배 보낼 정도로 첩첩한 동네가 500년이 지나 유배 온 임금 덕분에 이름을 세계에 알렸으니 그 옛날 품어주고 함께 슬퍼해준 보답을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