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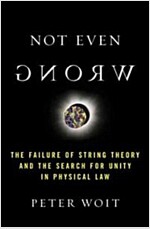
리 스몰린의 <The Trouble with Physics>와 마찬가지로 초끈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책이다.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는데,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마 번역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Introduction 부분이다. (Introduction이 ‘입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내게 특히 감명 깊었던 책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의 <한계를 넘어서Across the Frontier>였다. 이 책은 양자역학의 태동기인 1920년대 하이젠베르크 자신의 경험담을 모아 놓은 일종의 회고록으로, 여기에는 동료들과의 등산길에서 물리적 실체에 대하여 나누었던 긴 토론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때의 이야기들은 슈뢰딩거를 비롯한 몇몇 물리학자들을 크게 자극하여 1925년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독일 상황에 대해 알아 가면 갈수록, 중요한 통찰을 얻으려 오솔길을 산책하는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도반들의 모습이 내 가슴속 깊이 다가왔다. (17페이지, 강조를 위해 밑줄 추가)
<한계를 넘어서Across the Frontier>란 책에 나와 있는 토론 내용은 아마 우리말로 <부분과 전체>로 번역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추측한다[1]. <부분과 전체>에 어린 하이젠베르크가 친구들과 산으로 하이킹을 가서 원자를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이 나온다. 문제는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이다. 이런 10대들의 토론이 “슈뢰딩거를 비롯한 몇몇 물리학자들을 크게 자극하여 1925년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읽는 순간 말이 안 되는 번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다. 원문은 이렇다.
One book that made a strong impression on me was Werner Heisenberg’s memoir Across the Frontiers, in which he tells the story of his experiences during the 1920s, the early days of quantum mechanics. He describes long debates with his friends about the nature of physical reality, held during hikes in the local mountains. The basic ideas at issue were those that soon led him, Erwin Schrödinger and others to the explosion of new ideas about physics that was the birth of quantum mechanics in 1925. Later on, after I had learned more about events in Germany between the wars, the image of Heisenberg and others in his youth group marching around the mountains to attend large inspirational gatherings began to take on more troubling aspects.
“이때의 이야기들은 슈뢰딩거를 비롯한 몇몇 물리학자들을 크게 자극하여 1925년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의 원문은 “The basic ideas at issue were those that soon led him, Erwin Schrödinger and others to the explosion of new ideas about physics that was the birth of quantum mechanics in 1925.”이다. “이때의 이야기들”이 “물리학자들을 크게 자극하여 1925년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때의 문제의식은 이후 하이젠베르크와 슈뢰딩거 등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고 결국 1925년 양자역학의 탄생을 가져온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의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묘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이야기다.
읽다 보면 이 인용문에는 오역이 하나 더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문장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독일 상황에 대해 알아 가면 갈수록, 중요한 통찰을 얻으려 오솔길을 산책하는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도반들의 모습이 내 가슴속 깊이 다가왔다.”이다. 이 문장만 봐서는 오역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원문과 비교를 해봐야 완전한 오역임을 알게 된다. 원문은 “Later on, after I had learned more about events in Germany between the wars, the image of Heisenberg and others in his youth group marching around the mountains to attend large inspirational gatherings began to take on more troubling aspects.”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저자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산을 돌아다니며 행진하는 청년 집단들에 속한 하이젠베르크와 그 친구들의 모습이 우려스럽게 다가왔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청년 집회들은 독일 내에서 일종의 내셔널리즘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이 결국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하이젠베르크의 이러한 모습에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중요한 통찰을 얻으려 오솔길을 산책하는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도반들의 모습”이란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 “inspirational”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통찰”이라고 번역했지만 inspiration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the action or power of moving the intellect or emotions”라는 뜻도 있다. inspirational gathering은 결국 고무된 집회 정도의 뜻이겠다.
원문을 번역문과 대조해 보면 이 외에도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나온다. 위의 문단 이전에 나온 부분이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20세기 물리학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면서 현대물리학의 이정표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한물 간 이론’으로 취급을 받는다. (15페이지)
이 문장도 자체로는 이상하지 않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한물 간 이론’으로 취급을 받는다”는데, 뭐 저자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원문을 보자.
The story of how the discovery of the principles of special relativity and quantum mechanics revolutionised twentieth-century physics is by now a rather old one.
원문을 보면 역자가 저자의 글을 완전히 왜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결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한물 간 이론”이라고 기술한 적이 없다. 특수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원리들의 발견이 20세기 물리학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었는지의 이야기가 이제는 낡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역자의 번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특수 상대론이나 양자역학은 학문적 고전이다. 그 학문이 이미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 더 정확한 이론이 있다고 해도 고전은 여전히 고전이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 고전을 배울 것이다. 뉴턴 역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여전히 고전 음악을 듣고 고전 문학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래됐다고 해서 ‘한물 간 이론’이 아니다. 뉴턴 역학이든, 특수 상대론이든, 1925년의 양자역학이든 여전히 널리 쓰인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오래된 학문이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적용이 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잘 쓰고 있다.
조금 더 읽다 보니 또 하나의 왜곡을 알게 됐다. 그 다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2003년 교토京部[원문 오타(한자)] 학술회의에서 폐회연설을 맡은 이론물리학자, 데이비드 그로스David Gross는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인용하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언을 마쳤다.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29페이지)
그로스가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번역본을 계속 읽어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끈이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문과 대조하여 읽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로스는 책에 이후 인용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설파한 물리학의 원칙이자 꿈—물리상수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완벽히 설명된 이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끈이론은 결국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없고, 인류원리(anthropic principle)에 기대어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그로스가 마치 끈이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역된 부분이다.
그러나 끈이론에서는 ‘가능한 우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유일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래도 끈이론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로스의 연설은 바로 이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31페이지)
끈이론을 포기하지 말라고 번역한 것은 의도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역자의 선입견으로 인한 것일까? 원문은 이렇다.
This abandonment of Einstein’s creed that so worried Gross has taken the form of an announcement by several leading theorists that string theory is compatible with an unimaginably large number of different possible descriptions of the world, ...
원문에서는 그로스가 크게 걱정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믿음—위에서 말한 꿈—의 포기라고 나와 있지만, 역자는 여기에 원문에는 없던 “(그래도 끈이론을)”을 넣어가며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번역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번역하는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맥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 99퍼센트가 올바른 번역이어도 1퍼센트의 오역으로 욕을 먹는 것이 번역자의 숙명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자의 나태함으로 인한 실수나 글의 문맥과 핵심의 왜곡, 특히 그것이 역자의 선입견에 기인한 오역이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도적 오역은 (만약 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1] <Across the Frontiers>란 책을 찾아봤는데, 영미권에서도 이미 절판된 모양이다. 인터넷에 있는 목차로 판단해 볼 때 <부분과 전체>와 동일한 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이젠베르크가 쓴 여러 에세이를 모아 놓은 책이라는데, 여기에 <부분과 전체>에 있는, 친구들과의 토론 내용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