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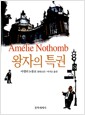
-
왕자의 특권
아멜리 노통브 지음, 허지은 옮김 / 문학세계사 / 2009년 9월
평점 :



<왕자의 특권> 아멜리 노통브 / 허지은 / 문학세계사 (2009) [원제: Le Fait du Prince(2008)]
[My Review MMCXCV / 문학세계사 8번째 리뷰] 고품격 월간 전문리뷰지 <책이 있는 구석방> 스물네 번째 리뷰는 벨기에 국적이지만 '프랑스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으로 취급 받는 아멜리 노통브의 열일곱 번째(공식발표상) 소설인 <왕자의 특권>이다. 그동안 내가 읽은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이 한 십여 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 아닌가 싶다. 왜냐면 그녀의 소설이 특징인 '적(敵)'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막무가내로 미워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답답하고 갑갑스러기만 한 '억지'도 없었다. 그저 두 남녀가 등장했고 아주 비싼 '샴페인'을 홀짝이며 마시며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전개시킬 뿐이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아멜리 팬들은 '그녀만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저 밋밋한 소설이라는 평도 늘어놓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오히려 좋았다.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까지한 '저속한 표현'이 거의 없기에 '로맨스 소설'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감미로운 감상에 젖어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로맨스 소설'도 퍽 좋아하는 편이다. 언젠가 꼭 시간을 할애해서 <로맨스 소설>(특집)을 다뤄야겠다. 조만간 찾아갈 것이다.
<왕자의 특권> 관점 포인트 : 아무리 로맨스 소설 같은 감미로운 느낌을 선사하더라도 아멜리 노통브는 어딜 가지 않는다. 첫 소절부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왕자의 특권>에서는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 심장마비 따위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자신은 곧바로 택시를 불러 '시체'를 싣고 병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한다. 느닷없는 이런 질문에 왜 '경찰'이나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느냐고 반문을 던지니,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경찰'이 신고한 사람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구금을 하거나 수사를 핑계로 '현장'을 통제할 것이고, '용의자'로 지목된 당신은 수사를 빌미로 시달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렇기에 가장 깔끔한 방법은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며칠 뒤, 이 집 앞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며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방문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를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주인공인 밥티스트는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쓰러진 남자를 흔들면서 깨우려 시도했다. 하지만 죽은 것이 분명했다. 심장이 멎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티스트는 침착하게 며칠 전에 한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에 빠졌다. 그러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러진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확인한다. 올라프 질더.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국적은 스웨덴. 그런데 묘하게도 그의 나이와 밥티스트의 나이가 똑같았다. 그러고보니 눈 색깔도, 머리카락 색깔도, 그리고 키도 똑같았다. 다른 것이라곤 '덩치(체격)'뿐이었다. 올라프가 밥티스트보다 더 뚱뚱하고 건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갑에 1000유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주소는 베르사유...이런 걸 확인하다가 그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밥티스트는 뒤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를 부를까 하다가 자신이 너무 늦장을 부린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기에도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신분'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죽은 자의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산 자의 신분'은 이렇게 쓰러져 죽은 이에게 주고서 서로의 삶을 맞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자신의 집에서 썩어버린 시체가 발견된다면 '밥티스트'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될테니 덩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장난 차'가 있다는 곳으로 나가보니 차도 고급 차량이었다. '재규어' 말이다. 밥티스트..아니, 올라프는 그 차를 타고서 '자기 집'인 베르사유로 떠났다.
그러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올라프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이유가 다름 아닌 '자동차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장난 차를 자신이 직접 몰고 있다. 하지만 고장난 차치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만 달렸다. 뭔가 찜찜했지만, 베르사유에 도착해서 올라프의 집을 확인하니 그런 찜찜함도 단박에 사라졌다. 집이 '호텔 별장'만큼이나 호화로웠기 때문이다. 밥티스트..아니 '올라프'는 자신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집주인답게 주방 식탁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자연스럽게 주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주방에 아름다운 금발 미녀가 들어왔다. 올라프는 깜짝 놀랐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음식을 씹었다. 금발 미녀는 그런 올라프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샴페인'을 홀짝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 그 금발 미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던 것이다. 정확히는 '올라프의 아내'였지만 말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으리으리한 집안에서 단 둘만이 거주를 하게 된다. 과연 신분을 바꿔치기한 것은 '신의 한 수'였을까?
나가는 글 : 이야기 설정 자체는 말도 안 된다.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을 턱이 없고, 자신의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동거 생활'이 시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억지로 껴맞춰 넣은 것이 '올라프'가 스파이나 국정원, 또는 범죄조직의 보스급 인물일 거라는 설정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단들의 특징이 바로 '엄청난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밥티스트'가 '올라프'로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며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아멜리 노통브가 '범죄스릴러' 같은 장르의 소설을 써보지 못한 탓에 '치밀함'을 갖추지 못하고 어설프게 흉내만 낸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이런 덜 치밀한 설정이 오히려 나는 좋았다. 아니 어찌 되었든 아리따운 '금발 미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 아닌가. 이보다 더 훌륭한 '로맨스 소설'이 어딨단 말인가? 더구나 올라프는 엄청난 부자였던듯 돈을 쓰고 또 써도 '화수분'마냥 돈이 펑펑 나왔다. 이런 행운이 가득한 곳에서 '밥티스트'와 '지그리드'..금발 미녀의 이름이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이어진다. 하지만 불안한 점이 없지 않다. 지그리드는 왜 '낯선 남자'인 자신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허락하는가 말이다. 거기다 올라프가 죽기 직전에 걸었던 전화가 마음에 걸렸다. 분명 전화기 저 편에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올라프가 스파이나 국정원, 또는 범죄집단의 보스라면 '전화기 속 상대'가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소설은 급작스럽게 '로맨스'에서 '첩보물'로 바뀌며 이야기가 쏜살같이 전개된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전화기 저 편의 목소리'의 주인공과 통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올라프..아니, 밥티스트에게 '죽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다. 가짜 올라프의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이었다. 과연 밥티스트는 올라프의 아내 지그리드와 로맨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