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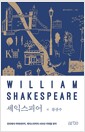
-
셰익스피어 -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셰익스피어의 450년 자취를 찾아 ㅣ 클래식 클라우드 1
황광수 지음 / arte(아르테) / 2018년 4월
평점 :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매력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화려한 색채'에 끌린다고 한다. 모던한 화풍이 포인트인 책표지를 비롯해서 책속을 장식한 수많은 '도감'이 풍족한 것에 만족감을 넘어 '소유욕'을 자극한다면서 말이다. 이렇게나 예쁜 책인데 책내용을 들춰보면, 한 인물에 담겨진 '삶의 정곡'을 찌르는 비밀스런 이야기들이 오롯이 돋을새김하고 있어 다른 책들과 '비교불가'할 정도의 감동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더구나 '기행문' 형식의 글을 통해서 '인물의 발자취'를 더듬어 거슬러오르는 느낌을 받을 때엔, 마치 '여행'을 떠나온 것처럼 생생함이 느껴질 정도다. 물론, 이 책의 글쓴이는 '현지 가이드'가 되어 까막눈과 다를 바 없는 독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말이다. 그래서 '관심인물'이라면 특히 더욱더 이 시리즈의 매력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나, 어찌 매력만 가득한 책일 수 있겠는가. 나처럼 '여행'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기행문'은 더더욱 관심밖인 독자들에겐 '지식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소하기도 전에 '다른 곳', '빠듯한 일정'에 쫓기듯 따라가기 바쁜 여정이 마뜩찮기도 하다. 차라리 '한 곳'에 눌러 앉아 정지된 듯한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에서 '낯선 여행지'가 주는 감상을 충분히 만끽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며 녹초가 되는 '독서'가 피곤한 느낌마저 느껴질 수도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 책만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린 나는 어쩐 일인 걸까?
무엇보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솔깃해졌다.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의 매력이 어디 그가 남긴 글에서만 찾을 수 있겠는가. 그가 살던 동네, 그가 머물던 극장, 그리고 그의 생의 전반에 걸쳐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들과 인물들에게서도 셰익스피어가 겪었던 삶을 관통하는 '멋'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뒤쫓는 '풍문'들의 진위를 글쓴이의 나름의 판단으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즐거움도 또 다른 재미였다. 특히, 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각색했다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와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높았다. 다름 아니라 '앤 해서웨이'라는 아내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작품이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보다 8살이나 연상인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스토리 전개조차 되지 않는 그 작품은 '상상의 산물, 그 잡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단다. 그도 그럴 것이 셰익스피어는 아내인 앤 헤서웨이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해설하고 분석한 내용은 이 책만의 '백미'였다. 누구나 알만 한 '4대 비극'과 '5대 희극'은 물론이고, 수많은 대본과 시까지 열거하며 일일이 '주석'을 달아놓은 점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궁금증에 목마른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햄릿'은 우유부단의 대명사라 부를 수 없다. 왜냐면 복수를 할 때는 우유부단할지 몰라도 비난을 할 때는 신랄하고 열정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말하고, <맥베스>의 주인공은 맥베스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다. 왜냐면 맥베스가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왕의 가슴에 단검을 찌를 때조차 망설이고 머뭇거릴 때,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단검을 내리꽂은 이가 다름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란다. 아직 '문학'에 한해서는 스승도 없고 문외한에 불과한 나로서는 이런 번뜩이는 해석에 더욱 끌릴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만족할 여행객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에 충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날마다 다니는 출근길도 '똑같은 풍경'으로 보이지 않는 법인데, 스치듯 지나친 첫 여행에서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느냔 말이다. 그래서 난 하나의 풍경도 놓치지 않을 '느릿느릿'한 여정을 좋아하고, 갔던 길도 다시 되돌아가는 '반복적인 일상'을 좋아라 한다. 지겨울 것 같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때론 '반복되는 일과'가 늘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물론, 좋아할 경우에만 말이다. 내겐 이 책, 이 시리즈가 그럴 것 같다. 그 여정이 빠르진 않을 테지만, 100권에 다다르는 그 길, 그 끝에 나는 서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반(현재까지 31권 출간)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읽고 또 읽으며, 그 매력을 만끽하고 있을 테다. 물론 그 사이에 '셰익스피어 작품'도 좀 읽고 말이다. 셰익스피어, 좀 읽겠다고 다짐한 것이 재작년이구만,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셰익스피어가 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