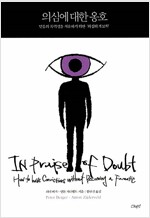
1
<의심에 대한 옹호>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렇다. '의심'보다 필요한 건 '괴롭힘'이라고. "나를 괴롭혀주세요"라는 부탁의 대상은 밀리언셀러클럽의 스릴러 소설이나 끝나기 5분 전 관객의 뒷골을 땡기는 영화만 속하는 건 아니다. '학문'도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출판계를 점령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제스츄어는 무엇인가. "자, 여기 불 따끈따끈하게 피워 놨어. 저기 안락 의자 보이지? 간식도 몇 개 챙겨놓았어. 자. 이 정도면 내 이야기 들을 준비 충분하지?" 권장할만한 자세다. 하지만 그 자세가 정체된 자신의 지식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어선 안 된다. 굳이 긴 이야기로 꾸미지 않아도, 자신이 세운 이념형의 논리적 조각을 잘 맞추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성과로 이 세상에 대한 '열정'을 도모하려는 건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이다'.
2
<의심에 대한 옹호>엔 '의심'의 물질성이 없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열정을 복원하기 위한 실천 윤리로 '의심'을 제안하지만, 여기서 '의심'은 논리적으로 잘 맞춰진 퍼즐 혹은 쌓여진 탑일 뿐이다. 즉, 그 '형식미'에서는 박수를 쳐 줄 만하다. 그러나, 그 '형식미'가 일상 속에 있는 행위자, 사람들에게 더 '친밀한 무엇'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점은 다른 층위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버거와 지터벨트는 내가 이 정도로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으니, 제안한 이 개념, 충분히 쓸모 있지 않아?라고 전달하는 듯하다. 하지만, 의심을 둘러싼 담론의 역학은 거의 보이지 않은 채, '의심'의 대당인 믿음, 그 믿음과 확실성에 가려진 '관성화'된 사고를 고쳐보도록 하자는 '건전송'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3
오래전 버거는 루크만과 함께 <지식형성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로서의 사명을 밝힌 바 있다. (이 구절은 <일상생활의 사회학>에서 가져 왔다)
우리의 목적이 일상생활의 현실 - 더욱 자세히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 있으며,또한 여러가지 이론적 안목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이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이론적 조망으로 비추어지는가에 대하여 오로지 관심이 있으므로, 먼저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의 상식에 이용될 수 있는 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의심에 대한 옹호>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회학자로서 그가 가진 소신의 일관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심에 대한 옹호>에서 나타난 그의 서술 태도를 보면, '상식의 재구성'수준에도 못 나가고 있는 듯하다.(사실 가만히 있던 '의심'이란 개념을 통한 '상식의 재구성' 이것이 저자가 노린 의도였을텐데 말이다)
a란 사고 잘못 되었지? b란 사고 허점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a의 장점만 취하고, b의 단점을 피해서 c란 대안을 일상 속에서 생각해보자구. 그게 바로 내가 '의심'을 통해 추구하고 싶은 '중용의 정치'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엔 오직 '상식의 되풀이'만 남았다. 내가 요즘 가장 우려하는 지식 시장의 종교적 현상, 바로 '반복을 도모하는 예배의 언어'들, 그것의 넘쳐남 말이다.
제대로 된 기독교의 구원은 타락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타락을 반복하는 것이다.-133쪽
슬라보예 지젝은 <죽은 신을 위하여>에서 기독교의 핵심에는 '반복'이 있다고 했다. 고로 기독교에 필요한 건 신자의 순결함이 아니라, 신자의 타락이다. 타락이 없다면 기독교가 갖는 '반복'의 힘. 예배당에 와서 반복적 회개를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화를 획득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 시장에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세게 말해 미안하지만) 피터 버거와 안톤 지터벨트가 책에서 보여주는 사고와 태도는 '나'의 지적 타락을 도모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회학적 개념과 원칙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개념 '의심'에 대한 과감한 계보학적 탐색을 펼쳤어야 했다. 하지만, 이 책에는 '계보학적'탐색이 보이지 않는다. 앨버트 허쉬먼의 <열정과 이해관계>같은 성과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이들이 주창하는 것은 '의심'이라는 개념의 또 다른 '이념형'을 만들어내는 정도다. 고로 이 책은 한창 사회학에 빠져든 한 대학원생의 페이퍼가 갖고 있는 정돈된 열정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정작 그 '열정'에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다.
4
무엇보다 불만스러운 건, 상대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과정 자체다. 상대주의에서 발견되는 니힐리즘을 깨고,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절대성'이라는 광신을 깨기 위한 무엇의 발견. 두 저자는 "우리는 광장의 언어에 무심하지 않아"같은 제스츄어를 드는 사례 및 직접적인 몇몇 구절로 넌지시 표시해두지만, 정작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장'의 복잡다단함이었다. 그들은 학문의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의 건실함을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설명'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일상생활'의 심층적인 부분들에는 '테두리식 접근'에만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자신이 주창하려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는 태도 자체가 자신이 독자들의 세계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의심에 대한 옹호>는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칙의 검토와 확인'만이 있을 뿐, 오히려 자신이 사고하고 밀어붙이는 '원칙'에 대한 믿음이 도리어 강화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들은 의심을 '예찬'하면서, 자신들이 주창하는 그 의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그들이 추구하자고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건실함을 지탱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앞에서 말했다시피, '의심'자체에 대한 물질성, 그것이 사회 세계에서 언어의 물질성을확보하고, 사회를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교류되고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의심'자체의 진공상태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 깔아놓은 논리적 무기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에 더 가깝지, 그것이 그들이 갈구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윤리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터 버거와 안톤 지터벨트가 의심을 제대로 옹호하기 위해선,자신들의 책을 읽는 독자들의 뒷골을 오싹하게 할 공포스러운 '이단적 언어의 창조와 재구성'. 그것이 주는 '괴롭히는 사회학적 태도'의 강화여야 했다.
그들은 '맛난 밥상'의 선결 조건은, 바로 '맛있음'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음식은 어디서 시켜먹든, 밥이야 햇반으로 하든, 일단 친절하게 밥상만 잘 차려보자라는 식의 태도가 불편하다. 정작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보니, 준비한 태도에서 나오는 저자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도덕적 건강함'만이 조금 느껴질 뿐이다. 상식의 재론에 큰 일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학자들과 상식에 너무 과장된 찬사를 보내는 시민들의 신앙 가운데, 점점 크는 건 시민들의 망각을 노리는 '온화하고 건전한 교양 민주주의의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오늘날 보편화된 라이프스타일 양식인 '명강의의 언어'에 들뜨고, 잊어버리면 또 그 명강의의 언어에 은혜를 받고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했던 죄를 씻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