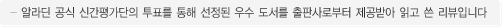[마흔의 서재]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마흔의 서재]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마흔의 서재
장석주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해가 바뀌고 자정을 넘어가는 그 시각이 되면 평소 잘 울리지 않은 문자음도 잠시 요란해진다. 대부분 ‘우리가 언제 이 나이까지 먹어서는’으로 시작되는 친구들의 덕담을 가장한 푸념들이다. 이럴 때마다 나는 좀 유난스러운 짜증이 들곤 해서 ‘이 말은 네가 열아홉 살 때부터 줄곧 해 온 말이다’ 라며 쏴 붙이곤 하는데, 물론 이 말은 사실이다.
또렷한 기억인 것이 열아홉에서 스무 살로 넘어가던 때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십대가 이렇게 가다니, 나도 이제 늙었구나’하며 붙잡고 싶은 나이의 우울을 뼈아프게 토로했다. 그리고 그것은 서른으로 넘어가던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매년 이런 나이에 대한 푸념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한 살을 먹는 것을, 과연 이 정도의 데시벨로 억울해 할 일인가 싶은 것이다. 앞으로 더 늙어갈 날만 남았는데, 평생 왜 똑같은 소릴 해대는지 짜증스럽다. 그러고 보니 나도 좀 유난스러운 사람일까.
물론 나도 늙어가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다거나, 노인이 된 내가 손녀를 무릎에 뉘이고 자장가 불러주는 모습을 행복하게 상상하는 노인 예찬론자도 아니다. 그저 해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민감해하기 보다는 막연히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던 기성세대 속에 영락없이 속하게 됐구나 하는 책임감만을 조금 아쉽게 맞이하는 것, 그 뿐이다. 좀 성가신 일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다가온달까. 늙는다는 건 정말 그렇게 서러운 일일까.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세대를 묶어서 칭하곤 한다. ‘청춘’이라던가 ‘스무 살’ ‘서른’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제언들이 방향을 잃고 주춤하는 이들의 마음에 머무는 모양이다. 지금을 잘 살고 싶은 만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에 ‘나이’가 큰 걸림돌인 반증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것이다. 대부분 내가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 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고 싶어서 책을 사보는걸 텐데, 과연 사람들은 삶의 무엇을 아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걸까.
‘나이’가 삶의 중요한 척도라면 때에 맞는 적기의 언행들을 책을 보며 참고해도 나쁘지는 않을 일이지만, 남의 시선에 옭아 매 산다는 것의 다름 아닌지 그게 우려스럽다. 열풍 밖으로 흐르는 씁쓸한 기운들이 정작 진짜 용기를 주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도 <마흔의 서재>와 같은 책을 만나게 되는 건 영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반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다짐해보는데 이 책이 말해주는 템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나, 이런 삶은 어떨까 하는 기대와 안심을 주는 깊은 여유가 흐른다.
장석주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용한 숲길을 같이 걸어주는 연인과 함께 하는 기분을 선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겠구나 하는 조바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이상적인 말만을 늘어 놓았다거나, 교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여 가슴에 새겨 봄직한 태도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준다 싶다.
이 책의 구성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작가 자신의 삶을 잔잔하게 반추시킨 글이 어우러져 있는데 더불어 몇 권의 책과 함께 소개된다. 그것은 작가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나서야 깨달은 일일 수도 있고, 살면서 터득하게 된 삶의 방편들이 책과 우연히 맞닿아 소개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작가의 솔직한 인생의 서사들이 펼쳐지는 만큼, 많은 책들도 함께 소개되는데, 읽다 보면 문득 시인의 안성 서재에 머물고 싶어지는 생각이 절로 든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 이것들이 지금의 삶으로 오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했구나 깨닫는 시기가 온다. 특히 책 <월든>의 저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야 비로소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초로에 가 산 일화라던가, 고독보다 더 다정한 벗이 없음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책은 정말 인생의 갈피를 도와주는 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평소 갖지 못하는 사유의 깊은 울림과 여운, 정적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원과도 같은 순간을 준다. <월든>을 보며 장석주 시인이 그러했듯, 그야말로 ‘삶의 정수리를 빨아들이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감복의 전이가 <마흔의 서재>에도 역시 흐르고 있다. 물질만을 쫓는 맹목의 태도도 은근한 추앙을 받는 시대에 내면을 가꾸라 말하는 시인의 외침은 결코 크게 들리는 법이 없지만 일단 이 삶을 목도한 사람들의 뇌리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깊음이 있는 것이다.
작가의 서재 귀퉁이를 빌어 앉아 사유의 교감을 하고 나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참을 돌고 돌아 비로소 ‘나’를 돌보게 되는 구나 싶어진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거나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꾸리는 일에 엄청난 방해을 준다. <마흔의 서재>를 보면서 고요하게 해가 지고 뜨는 일이 왜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바람과 직접 가꾼 채소로 한 상을 차려 먹는지에 대한 소박함들을 메워준다. 언제라도 나를 이끌어주는 한 권의 책이 있고 이를 읽으면서 비로소 다른 세상과 만난 작가의 삶이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는 구나 싶다. 결국 사람은 자연으로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리라. 작가가 말하듯이 각자의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인 것이다.
사람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혀 희생을 감수하는 실수를 한다. 이는 마치 세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오류가 나길 바라는 명령을 내리고 굴종하게 하는 일처럼 짓궂은 비극처럼 보인다. 그럴 수록에 우리는 주어진 삶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부리고, 수많은 교차로에 놓여서야 충돌로 빚어진 통로를 만난다. 다치고 부러진 만큼의 고통이 보이지 않던 다른 길로의 모색을 꾸려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는 아닐지.
각자의 꿈으로 삶을 재구성해내는 힘은, 자신의 마음 안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책을 읽을 수록에 그 힘의 비결이 바로 내 방 한 켠 쌓아둔 책 한 권의 힘이란 것도 알겠다. 멋있는 사람을 보고 내 꿈인 냥 콜라주처럼 오려 붙인 그런 가짜 삶 말고, 진짜 나의 삶 말이다. 끊임없이 모방하고 나를 배신한 삶을 살아온 지루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실로 내가 주체가 되어 그야 말로 ‘나의 종합’을 구성해보리라 다짐해 본다.
책숲이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세상을 온감으로 느끼며, 변화할 각자의 몫을 기분 좋게 상상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인생의 반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