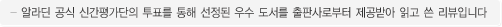[안녕, 다정한 사람]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안녕, 다정한 사람]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안녕 다정한 사람
은희경 외 지음 / 달 / 2012년 11월
평점 :

품절

여행은 낯섦과 마주한 미묘해진 매력을 맛보는 일이 아닐까. 혹은 다녀 온 이후에 더 커져버린 추억의 추를 얼마간의 심적 안락으로 보전받는 일은 아닐지. 그것은 마치 밤 하늘에 잔상만 남은 별의 아름다움을 올려다 보는 일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여운의 잔상들이 내 삶의 곳곳 그 경험치들을 배치시켜서 전에 없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여행은 분명한 우리 삶의 활력소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묘미라면, 그것은 오래 묵힌 질문들에 비로소 답을 찾게 되는 시간들이라고 말할 것 같다. 대부분이 좀 생각하기 꺼려져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묵혀둔 문제들인데, 논리적 실마리로 풀다 그만 지쳐버린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도 여행지에만 오면 스스로 봉인해제 되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활한 세상만큼이나 별 것 아닌 문제들로 흩어져 버리는 신기를 맞이하게 해준다. ‘나는 정말 바보인가’하고 적잖이 황당해하면서 답을 찾았다기 보다는 내려놓을줄 아는 위안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무겁고 낮은 층위의 문제들이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처럼 가장 가볍고 별 것 아닌 층위로까지 올라와 섞여 버리는 것, 그런 것이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조용한 환호를 지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새롭게 보고 먹고 즐기는 낯선 행복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여행이 돈과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에게나 부릴 수 있는 여유 아니겠냐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여행의 핵심을 짚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거창하게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간다거나, 허리가 휘다 못해 몇 번이고 접힐 만큼의 돈을 들고 간다라면 더 큰 기쁨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일까.
진짜 여행은 하다못해 내 집에서 책이나 영화를 보는 행위로서도, 이게 좀 싱겁다면 버스를 타고 처음 가보는 동네에 내려서 골목 곳곳을 누려보는 일에서도 낯선 풍경이 선사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 편에서의 여행은 돈과 시간인 물리적 의미보다 여행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낯섦과 휴식의 감정에 엄청난 비중을 둔 차이가 있긴 하다.
뭐 어쨌든 사람이 이 정도로의 나이를 먹고 보면 자신이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여행을 좋아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 경우는 아마 여행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가 싶은 경우다.
내가 줄곧 가장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공간과 시간들을 회상해보면 서울 어느 동네의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갤러리에 들러 그림을 보고, 향이 좋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러 예쁜 카페를 찾아 보는 일, 그런 소소한 일들이다. 물론 거창한 여행지에서의 추억 따위도 없진 않아서, 눈 앞에 펼쳐진 일몰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던 캄보디아의 어느 날이라든지 일본 어느 골목의 쌀집과 우체국 안을 몰래 들여다보며 길을 잃은 채로도 마냥 좋았던 추억의 한 켠이 소중하게 자리잡고 있긴 하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감흥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에서 조차도 나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화려했던 풍경을 떠올리거나, 유명 음식점에서 비싼 점심을 먹어 봤다거나 하는 일이 떠오르지 않는걸 보면 여행 취향이 일관되긴 한 것 같다. 말하자면 평소 소소하게 느낀 주말의 여행, 어느 나라에서 큰 돈을 썼던 여행들이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격차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책이든 갤러리에서 본 어떤 그림이었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걷고 차를 마시며 단 몇 시간을 누린 여행도 내게는 행복한 시간들이라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낯선 충격, 아니면 그 낯섦 가운데서도 익숙한 것을 본 아늑한 기쁨. 그 어느 쪽이건 여행지에서의 사람들은 평소에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한 원형의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고 정비해보는 다부진 결연들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어쩌면 여행이란 내 안의 무게에 균형을 맞추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살면서 과해진 것들은 덜어내고, 어느새 빈 소리가 부끄러워질 만큼 채우지 못한 게 있다면 주어 담는 일 말이다. 보는 모든 풍경들이 그 자체로서 빛과 에너지로 환원되어 돌아오는 자극 충만한 세상이 내 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인 것이 참 고마운 작용같다.
<안녕, 다정한 사람>을 읽으면서 근본적으로 여행에 대한 의미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글과 여행이다 싶은 게 있었다면 단연 ‘김훈’작가 편이었다. 짧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치측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망망대해를 떠돈 젊은이들의 항해는 김훈작가의 감정에 절로 동조된 기분으로 다가온다. 비글호 같은 배가 없어도 그들과 같은 항해를 바라는 마음에는, 젊은이 못지 않은 생기와 의지가 아름답게 비춰지는듯 했다. 대부분의 작가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일일에는 한 치의 요란함도 없이, 본디 그곳의 원형을 그대로 전해주는 진짜 ‘여행’이 전해져서 좋다.
좋은 의미에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여러 작가들의 각각의 여행지가 그곳을 가보고 싶어지는 매력으로 전해지지는 않는다. 각자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곳이 어디든 나는 이곳을 찾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여행을 계획하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과 다른 이의 안부를 물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내게 주말의 한 틈이고, 가능한 좀 더 많은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움직임들에 전보다 많은 고마움을 느껴야겠구나 다짐하는 그것인 것이다.
다만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여행에는 그동안 ‘사람’이 부재했다는 아쉬움을 반성하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일상과 여행이 주는 충돌이 삶의 넘나듦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오후를 맞이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