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돌이켜보면 올해는, 작품 몇 개를 하다보니 훌쩍 가버린, 내게는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 한 해였다. 그렇게 참으로 정신 없이 흘러간 한 해였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물론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다. 그런 소소한 일상과 비일상들이 모여 '지난 1년'이라는 이름으로 용해되고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제 스스로 어떤 '구체적 추상성'을 띤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이라는 이름의, 자기 자신을 끈임없이 '타자화'해왔던 저 거대한 기억의 장부 속으로, 다시금 허리가 접혀 들어간다. 때로는 고이 포개진 채로, 때로는 격렬히 구겨진 채로. 그러고 보면 기억의 단층들을 하나의 책이 지닌 저 '무수한' 책장들에 비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거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되지도 않는 주억거림을 주억거리게 되는 것, 되는 곳, 되는 때. 이것, 이곳, 이때에 즈음하여, 이른바 '올해의 책들'을 선정해본다. 물론 당연하게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되도록 많이 읽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매겨본 독서 '성적표'의 점수가 별로 신통하지 못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 '올해의 책들'은, 하나의 '완결'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 딱 그 수만큼의, 아니 딱 그 배만큼의 '숙제'만을, 잔인하게 남겨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한 숨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쁜 숨으로 더욱 신발끈을 조일 수밖에. 더구나, 국내 저자의 저서, 외국 저자의 저서, 그리고 번역서라는 세 범주에서 각각 다섯 권씩 선정해놓고 보니, 역시나 이러한 목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편협한 '카테고리'와 '리밋'과 '바운더리'임에야. 뜬금없이, 이제껏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20대와는 영원히 안녕이다. 다음 생애에 또 만나서 멋지게 한 번 더 놀아보자, 나의 20대여(지극히 '랑만적인' 어조로 발음할 것)!
먼저 국내 저자의 저서 다섯 권을 뽑아본다:
1. 이경훈, 『대합실의 추억: 식민지 시대의 근대문학』, 문학동네, 2007.
2. 고지현, 『꿈과 깨어나기: 발터 벤야민 파사주 프로젝트의 역사이론』, 유로, 2007.
3. 신준형, 『천상의 미술과 지상의 투쟁: 가톨릭 개혁의 시각문화』, 사회평론, 2007.
4. 오생근, 『프랑스어 문학과 현대성의 인식』, 문학과지성사, 2007.
5.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7.


▷ 이경훈, 『 대합실의 추억: 식민지 시대의 근대문학 』, 문학동네, 2007.
▷ 이경훈, 『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문학의 풍속사 』, 문학과지성사, 2003.
1) '모던 보이'와 '모던 걸' 시대의 문학에 관한 천착에 있어 이경훈만큼이나 열정적이고 치밀한 자세로 경주하고 있는 '소장학자'를 찾아보기란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대열에 권보드래와 김예림을 추가한다). 『대합실의 추억』은 4년 전에 출간되었던 『오빠의 탄생』의 속편을 이루고 있다(『오빠의 탄생』이 출간되었을 때는 정말 신이 나서 읽어내려갔던 기억이 있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강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던 전작의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문학이면서도 문학이 아닌' 이른바 "콘텍스트 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론'이 본문에서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으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지만, 이 책은 모더니티의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근대문학 연구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평론집이라는 생각이다. 일독을 권한다. 더불어, 문학과지성사에서 몇 년 전부터 연이어 출간되고 있는 한국문학 시리즈 중에서 이경훈이 책임 편집을 맡은 이광수의 소설 『흙』의 일독도 함께 권해본다.



▷ 고지현, 『 꿈과 깨어나기: 발터 벤야민 파사주 프로젝트의 역사이론 』, 유로, 2007.
▷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and V-1. Das Passagen-Werk,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1.
▷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and V-2. Das Passagen-Werk,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1.
2) 얼마 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번역 선집 일차분이 출간된 바도 있거니와, 가히 '벤야민 르네상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최근 출판계의 동향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읽어오고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기에, 이러한 '부흥'에 대한 소회가 없을 수 없겠다. 다만 벤야민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 저자의 연구서를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반갑게도 올해 출간되었던 고지현의 책이 이에 대해 일정 부분 '해갈'을 해줬다는 느낌이다. 특히나 이 책은 벤야민의 역사이론이 마르크스주의와 맺고 있는 관계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 벤야민과 '파사젠-베르크' 읽기를 위한 도입으로서 추천할 만하다. 수잔 벅-모스(Susan Buck-Morss)의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문학동네, 2004)와 그램 질로크(Graeme Gilloch)의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효형출판, 2005)와 함께 읽는다면 '파사젠-베르크'로 들어가는 하나의 훌륭한 '지도책'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일독을 권한다. 그나저나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리저리 측정해보고 있자면, 나는 아마도 2008년 역시 벤야민 '독해'로 한 시절을 보내게 될 게 뻔하다. 개인적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신준형, 『 천상의 미술과 지상의 투쟁: 가톨릭 개혁의 시각문화 』, 사회평론, 2007.
▷ 츠베탕 토도로프, 『 일상 예찬 』(이은진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3.
3) 신준형의 책은 저자의 말마따나 "종교문화의 시각적 분야"에 관한 한 권의 좋은 연구서이다. 이 시기의 서양 회화를 단순히 '종교 미술'로 바라보는 것과 '종교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시각적 체험이자 도전'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미술사'라는 개념을 당연한 듯 전제하게 되지만, 후자는 '인간학적' 혹은 [광의의] '현상학적' 입장에서 바로 그 '미술사'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바로크와 르네상스 미술에 관한 책이 흔히 '양식 분석'이나 '도상 해석'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렇듯 외견상 미술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바로 그 '미술사'라는 개념 자체에 물음을 던질 때 나의 기분은 상쾌해진다. 말하자면, 저 그림들은, 말 그대로, '천상의 미술'을 위한 '지상의 투쟁'인 것(신준형의 이 책이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 곧 같은 시기(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토도로프(Todorov)의 책 『일상 예찬』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권의 '병행 독서' 또한 추천하는 바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열아홉 살 무렵 곰브리치(Gombrich)의 책을 읽고 흘렸던 닭똥 같은 눈물은 바로 저 '천상의 미와 지상의 싸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곰브리치는 복음서의 저자 마태를 묘사한 카라바조(Caravaggio)의 두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마음속에 전혀 새롭게 그려보기 위해 비상한 정열과 주의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과거에 보아온 모든 그림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으며, 아기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고, 목자들이 그를 찬미하러 찾아들고, 한 어부가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당시의 정경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고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오래된 성경을 아주 참신한 안목으로 해독하려는 위대한 미술가들의 그러한 노력이 분별없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분노케 한 경우가 수없이 발생했다. 이러한 물의의 전형적인 예로서 1600년 전후로 작품 활동을 한 매우 대담하고 혁명적인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죠가 있다. 그는 로마의 한 교회 제단을 장식하기 위한 성 마태의 그림을 부탁받았다. 그가 받은 주문은 성 마태가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장면과, 그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그가 글을 쓸 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한 천사를 그려넣는 것이었다.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젊은 화가 까라바죠는 한 늙고 가난한 노동자이며 단순한 세리(稅吏)가 갑자기 책을 저술하려고 쭈그리고 앉은 모습을 그리기 위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대머리에 먼지 낀 맨발로 커다란 책을 어색하게 붙들고 있으며 손에 익지 않은 필기(筆記)를 하기 위해 애써 이마를 찡그리고 있는 <성 마태>를 그렸다. 마태의 옆에 있는 젊은 천사는 방금 천상으로부터 날아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처럼 그 노동자의 손을 우아하게 인도하고 있다. 까라바죠가 이 그림을 제단에 모실 교회로 가져가자 사람들은 이 작품 속에 성 마태에 대한 경의가 들어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까라바죠는 성 마태를 다시 그려야 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는 천사와 성자의 모습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엄격하게 준수했다. 그 결과로 나온 작품은 까라바죠가 생생하고 흥미있게 보이도록 노력했으므로 지금도 명화에 속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작품보다는 첫번째 그림이 더 정직하고 진실해 보인다."
ㅡ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上』, 열화당, 23-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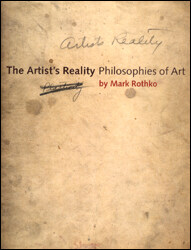
▷ 다니엘 아라스, 『 디테일: 가까이에서 본 미술사를 위하여 』(이윤영 옮김), 숲, 2007.
▷ Mark Rothko, The Artist's Reality: Philosophies of Art,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덧붙여, 다니엘 아라스(Daniel Arasse)의 책 또한 일독을 권한다. 이런 종류의 '정교하고 치밀한' 미술 서적을 보는 즐거움으로 올해는 피서(避暑)를 대신할 수 있었다. 또한 내게 거의 종교적 '신열'에 가까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화가 로스코(Rothko)의 글 또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이 두 권이 함께 떠올랐을까?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이러한 나의 '엉뚱한' 연상(association)에도 해당되는 것이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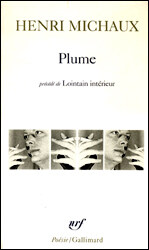
▷ 오생근, 『 프랑스어 문학과 현대성의 인식 』, 문학과지성사, 2007.
▷ Henri Michaux, Lointain intérieur, Plume, Paris: Gallimard(coll. "Poésie"), 1985.
4) 프랑스어 문학의 '세계'는 단순히 프랑스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는, 오생근의 책을 통해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세제르(Césaire)와 상고르(Senghor)의 시들, 또한 그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네그리튀드(négritude)의 존재, 곧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문학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그리튀드에 대한 독립된 국내 연구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의 2부는 실로 반가운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이 책에 수록된 글들 중 사르트르(Sartre)와 바르트(Barthes), 또는 들뢰즈(Deleuze)의 문학비평에 관한 글들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앙리 미쇼(Henri Michaux)에 대한 글이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다. 미쇼의 경우, 그의 시선집이 예전에 한 번 번역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현재로서는 국역본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시의 '번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미쇼 시의 번역에는 조금 욕심이 있다는 고백 한 자락 남겨본다. 그의 『플륌』은 여전히 나를 폭소케 함과 동시에 또한 섬뜩하게 만든다! 미쇼에 대한 '애정'의 글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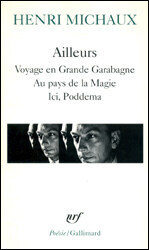
▷ 롤랑 바르트, 『 기호의 제국 』(김주환, 한은경 옮김), 민음사, 1997.
▷ Henri Michaux, Ailleurs, Paris: Gallimard(coll. "Poésie"), 1986.
미쇼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예전에 번역되었던ㅡ세상에, 벌써 10년이 지났군!ㅡ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 국역본이 떠오른다. 이 책의 번역자는 첫 번째 역자 주를ㅡ게다가 이 주석이 역자 주 중에서 가장 긴 것인데ㅡ이렇게 채우고 있었다:
"이 번역 작업 내내 이 <가라바니Garabagne>라는 말만큼 역자들을 괴롭힌 것도 없었다. 출전에 대해 적절한 역주를 달아야겠는데 도무지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분명 어떤 가상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감>만으로 역주를 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역본이나 일역본도 아무런 역주 없이 그냥 말만 옮겨놓고 있다. 온갖 백과 사전과 문학, 어학, 철학 사전까지 뒤져보았지만 <Garabagne>라는 말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바르트의 제자이며 <프랑스 사람>인 다니엘 다이안 교수에게 물어보았으나 그에게도 이는 처음 보는 낯선 단어였다. 다만 그는 혹시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튀아』에 나오는 말이 아닐까 추정했다. 희망에 부풀어 도서관에 가서 라블레의 온갖 책을 뒤졌으나 <가라바니>라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현대 불문학을 가르치는 미셸 리치만Michele Richman 교수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도 모른다.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 벌써 여러 달 전이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마크 포스터 교수 역시 <가라바니>에 대한 대답 대신 자신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엉뚱한(?) 질문만을 보내왔다. 미시간 대학의 에릭 래브킨Eric Rabkin 교수, 제퍼슨 대학의 존 운스워스John Unsworth 교수, 프린스턴 대학의 윌라드 맥카티Willard McCarty 교수 등도 모르겠다는 대답만을 보내왔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가라바니>는 없다. 불문학, 현대 문학,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주제를 다루는 인터넷 전자 우편의 여러 논의 모임에 가라바니에 대한 질문을 보냈지만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어떤 이는 혹시 바르트의 신조어가 아니겠느냐는 추측까지 보내왔다. 역자들은 <가라바니>라는 단어 하나에 그간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라면 자그만한 책 하나를 더 번역할 수 있었으리라 믿고 있다.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서 <가라바니>의 정확한 뜻과 출전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역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ㅡ 롤랑 바르트, 『기호의 제국』, 139-140쪽.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면 문장들은 숫제 일종의 소극(farce)이 되어버린다. 이건 거의 애절하기까지한 어조가 아닌가. 역자 주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마저 던져버리고 하소연할 정도로 역자들의 답답함은 극에 달해 있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자문을 구했던 미국의 교수들이 죄다 바보들이었는지도 모를 일이고, 라블레(Rabelais)의 작품은 그만큼 방대하고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는 세계일 것이며, 또 10년 전의 인터넷이 요즘 같을 수야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해도 결국 앙리 미쇼가 만들어낸 가상의 땅 '가라바뉴(Garabagne)'를 알지 못했던 것! 미쇼의 시 중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곳의 동식물과 풍습, 언어에 관해서까지 상세히 '서술'해가는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이 "다른 곳(Ailleurs)"이라는 표제 하에 처음으로 묶여 나왔던 것만도 이미 때는 1948년이었던 것.


▷ 김덕영, 『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 길, 2007.
▷ 게오르그 짐멜, 『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5) 김덕영의 책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는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에 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서의 '개시'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2005년에 편역 출간했던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된 김덕영의 짐멜 소개는 올해 출간된 짐멜의 번역 선집이 가세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에 최근 많은 이들이 짐멜의 사회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내게는 한때 '글쓰기'라는 하나의 '형식적' 문제에 있어서 벤야민의 '모더니티'와 짐멜의 '모더니티'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김덕영의 책은 내가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짐멜을 새롭게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만만치 않은 두터운 분량이지만, 일독을 권한다.



▷ 게오르그 짐멜, 『 게오르그 짐멜 선집 1: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
(김덕영, 배정희 옮김), 길, 2007.
▷ 게오르그 짐멜, 『 게오르그 짐멜 선집 2: 근대 세계관의 역사 』(김덕영 옮김), 길, 2007.
▷ 게오르그 짐멜, 『 게오르그 짐멜 선집 3: 예술가들이 주조한 근대와 현대 』
(김덕영 옮김), 길, 2007.


▷ Georg Simmel, Gesamtausgabe Band 6.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9.
▷ Georg Simmel, Gesamtausgabe Band 11.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더불어 짐멜의 두 '주저'에 대한 번역, 곧 『돈의 철학』의 재번역과 『사회학』의 초역이 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 한 자락 덧붙여둔다. 여담이지만, 올해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적 체계들(Soziale Systeme)』이 번역 출간되었을 때 루만을 전공하고 있는 한 선배로부터 번역의 몇몇 문제점들을 전해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짐멜이든 루만이든, 사회학의 고전들을 '좋은' 번역으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Garabagne'의 뜻을 애타게 찾았던 10여년 전 어떤 역자의 마음만큼이나, 거의 애절하기까지 하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1: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2: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3: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4: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