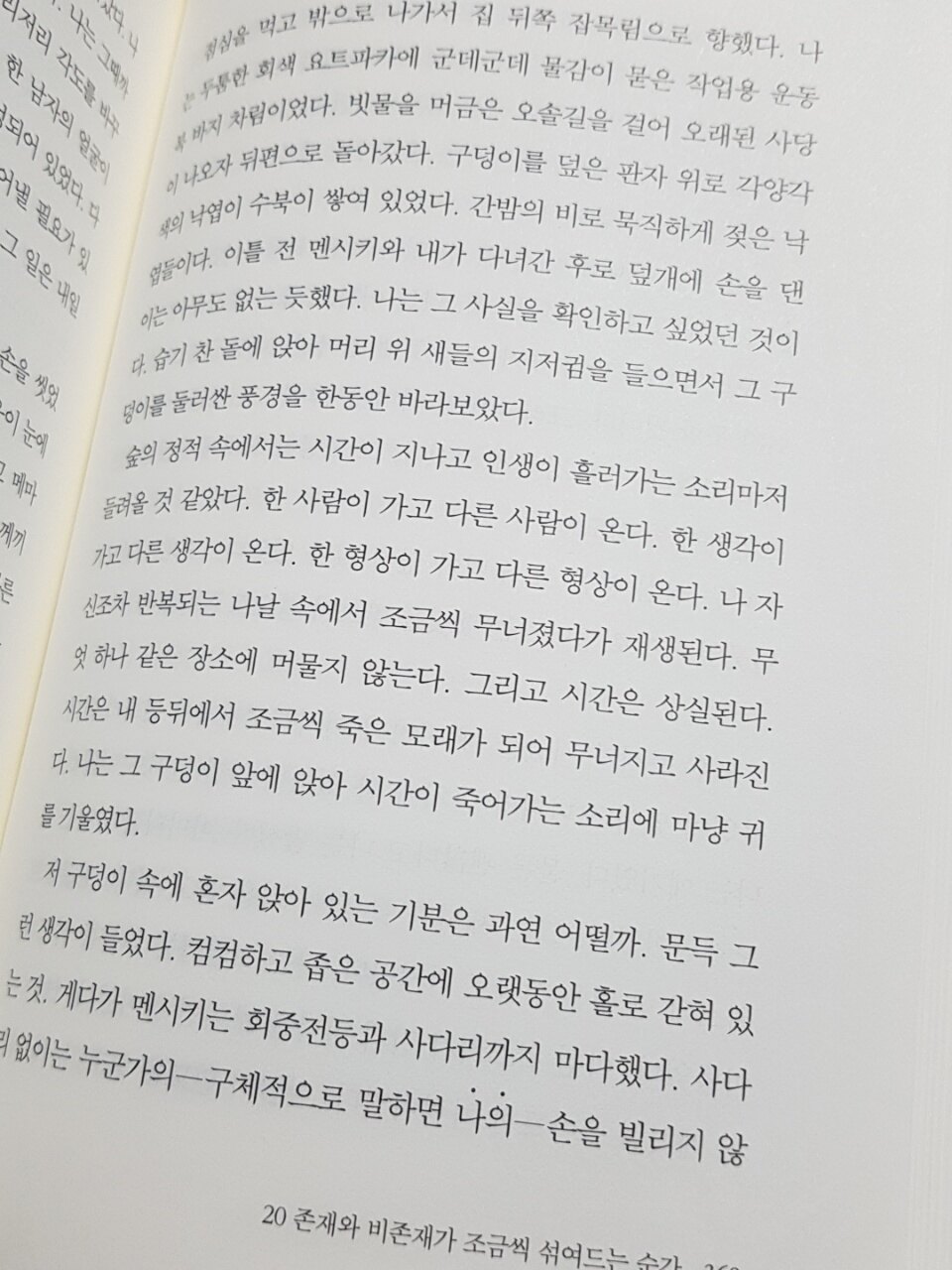기사단장 죽이기를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국어선생님의 휴가로 젊은 기간제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였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을씨년스럽고 유난히 음산했었다.
아이들은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며 예쁘고 젊은 선생님을 졸랐다.
선생님은 웃으며 첫사랑이나 재미난 얘기보다 무서운 얘기를 더 많이 안다며 무서운 얘길 해도 되면 하겠다고 했고, 무서운 이야기도 좋다며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있고 나처럼 잔뜩 겁이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체만으로 오싹한 기분을 느끼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선생님은 먼 동굴 속에서 울려 나올 것 같은 저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나는 정말 점차 겁에 질려갔었다.
정확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의 내용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대한 것이었다.
조용한 밤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 장구소리, 징소리......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환청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그들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한밤중에 어디선가 어떤 소리라도 들려올까봐 겁에 질렸던 순진한 내가 떠올랐다.
한밤중 들려오는 방울소리, 그나마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 궁금중과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호기심을 충독하는 멘시키, 비밀스럽고, 궁금중을 자아내는 그의 정체가 궁금해서 자꾸 책장을 넘긴다.
하루키를 오랜만에 읽는다.
1Q84도 아직 못 읽었는데 벌써 7년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하루키 책이다.
내가 변한 건지, 하도 오랜만이라 잊고 있었던 건지, 이 책을 읽으며 섹스에 관한 세밀한 묘사가 거슬린다.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며,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인물들의 행위에 내가 갖고 있던 하루키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던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방울을 찾아낸 깊은 구덩이, 이 부분의 이미지는 예전에 읽었던 어느 소설 속에서 본 것 같다.
태엽을 감는 새였던가,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였던가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오래된 우물 속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던 남자, 그 남자가 누군지 떠오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장은 휙휙 잘도 넘어가고 궁금해서 자꾸 읽게 되는데도 틈틈이 일이 생겨 아직 다 읽지를 못했다. 얼른 시간을 내서 마저 읽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