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전 오늘 남긴 독서기록을 확인하시고, 추억을 돌아보세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공되는 북플 서비스의 이런 문구를 처음엔 반가워했으나 지금은 좀 괴로운 심정으로 들여다본다. 흠, 내가 고작 요정도 밖에 안 되었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날도 드물지 않다. 어제의 나 보다 오늘의 더 나은 나를 기대하자는 다짐이라도 해야 하나. 몇 권의 책을 읽고 끄적거리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시간도 공간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이다. 그냥 쓰면 될 것을.....
1.

나는 『동물해방』을 읽고 삶의 좌표를 얻었다. 일종의 종교적 안정감을 느꼈다. 무의미한 세상에서 나름의 의미를 설정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가장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69쪽
'삶의 좌표'를 얻은 책이라니. 나는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서 매우 부러웠다. 꼭 읽어봐야겠다, 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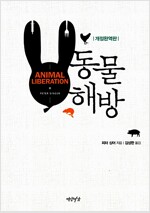
누군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꿈을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닌 부사여야 한다. 나는 '휘뚜루마뚜루' 꿈꾸고 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벌린의 자유는 명사였고 프롬의 자유는 동사였다. 나의 자유는 부사다. 나에게 자유란 얻고 싶은 어떠한 대상도 아니고, 하고 싶은 특정 행동도 아니다. 그런 목적들은 순간순간의 욕망에 따라 바뀌기 십상이다. 나는 그저 '자유롭고' 싶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유로이'살고 싶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 내 삶의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휘뚜루마뚜루 자연발생적인 행위를 이어갈 때 나는 내 본연의 모습에 다가감을 느낀다. -93쪽
'휘뚜루마뚜루'라는 단어는 나의 어머니가 자주 썼던 단어이다. 주로 옷을 몸에 걸칠 때 이 표현을 썼다. 휘뚜루마뚜루 아무렇게나 걸쳐도 좋은, 아주 편한 옷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부사였다. 옷에 묶여 있었던 부사 하나가 해방된 느낌을 받아서 아주 신선했다.
카투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온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다. 카투사는 전쟁 중 존 무초 대사의 요청에 따라 이승만이 구두 합의한 임시 제도였다. 지금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카투사의 업무는 한·미 양국 어학병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어느 나라에도 카투사 같은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존속되는 것은 징집제가 있는 한 카투사로 가는 것이 명백한 이득이기 때문이다. 못 간 사람은 부럽고, 갔다 온 사람은 부끄럽다. 나만 해도 이미 혜택을 본 처지에서 카투사 제도를 비판하기 조심스럽다. -128쪽
카투사를 먼저 다녀오신 많은 분들! 누군가는 이런 말을 진즉에 했어야 했다. (내가 못 들었나?)
'못 간 사람은 부럽고, 갔다 온 사람은 부끄럽다.' 부끄러워 말 못 했나?
2.

1984년 직전에 대학을 졸업한 나는 대학 시절에 이 책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읽지는 않았다. 곧 다가올 1984년이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가득차던 시절에 딴 나라 같은 소설 따위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 (소설 따위라니...이 말버릇 좀 보게나. 명색이 문학 전공이면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젏음의 뒤안길에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보니 이제야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읽다가 만 부분에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겨우 넘고나서야 읽기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 로맨스였네. 미래의 디스토피아 어쩌구 보다 로맨스라는 걸 강조했다면 진즉에 읽었을 것을....
어떤 점에서 당의 세계관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주입되었다. 그들은 잔인무도한 현실 파괴도 감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파악하지 못할뿐더러, 발생하는 공적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지 덕분으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이나 꿀꺽꿀꺽 삼키지만 아무 탈도 없었다. 마치 한 알의 곡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아무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새의 창자를 통과하듯이 말이다. -194~195쪽
대학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No! 허나, 지금이라도 읽어서 다행이다.
3.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영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은 이 소설을 가리켜 '우리 시대 가장 훌륭한 소설'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레이엄 그린 역시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를 끈질기게 물었던 작가였으니 그가 엔도 슈사쿠를 같은 과로 여겼을 터이다. 인간에 대한 연민조차 드러내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나약한 인간들의 간절한 외침. 하느님에게 따지고 싶을 때 읽으면 위안이 좀 되려나....그것보다 일본에서 왜 카톨릭 선교가 실패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P233~234 인용 생략. 너무 길어서요.) 어차피 하느님에게 따져봐야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으니.
4.

"이케아의 모든 디자인은 칼 라르손에서 시작된다!" 스웨덴 국민 화가의 일상 속 작은 행복.
칼 라르손과 그의 아내 카린 이야기, 그들의 자녀들을 그린 그림들을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책. 칼 라르손이 국민 화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화가였던 아내 카린의 내조의 힘이 상당했을 터이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스웨덴 디자인 운동의 뿌리에는 확실히 카린이 있었다.(328쪽)' 부록으로 몇 페이지 할당된 분량만으로는 매우 아쉬웠지만 부지런한 누군가가 책을 내지 않을까....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