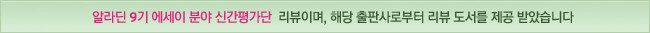[우리가 사랑한 1초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한 1초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가 사랑한 1초들 - 곽재구 산문집
곽재구 지음 / 톨 / 2011년 7월
평점 :



'모든 한 초 한 초들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와 다정하게 인사하고 다시 손을 흔들고 가는 곳', 인도의 산티니케탄. 시인 곽재구가 생의 어느 나날들을 아름답게 보낸 곳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흔적의 기록이다.
나는 이 시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그의 유명한 시집이 <사평역에서>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손에 잡아본 적은 없다. 어떤 책을 읽게 되는 것도 인연이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 나는 이 <우리가 사랑한...>을 읽으면서 이 시인을 지금껏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몹시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난 도대체 이런 시인도 몰라보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았는지, 를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나도 한동안 여행에 빠져 있었고, 인도에 빠져서 수십 계절을 앓고 지냈다. 아, 과거형이 아닌데... 지금도 늘 떠날 궁리를 하고 있고 인도가 늘 그립다. 곽재구 시인이 산티니케탄에서 보낸 시간을 1초 단위로 사랑하는 것의 무게만큼 나도 인도에서 보낸 얼마 안되는 시간들을 되씹고 있으며 그후 인도를 그리워하면서 보낸 숱한 나날들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산티니케탄. 지지난 번 인도 여행에서 콜카타에 머물 때 산티니케탄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을 한나절 일정으로 돌아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보여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 언젠가 기회를 노려보리라, 다짐하면서.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서글퍼지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을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음악이나 시에 빠져서 한 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 일 년, 아니 한 달만이라도 그곳에 머물러 볼 수 있을까? 서러움 같기도 한 서글픔이 이슬비처럼 가슴을 적셔왔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그리워하는 건 내 지병 중의 지병이다.
술도 안 마셨는데 이 글을 쓰고 있자니 취기가 절로 솟는다. 곽재구 시인 때문이다. 산티니케탄 때문이다. 산티니케탄에서 540일 보낸 이야기 때문이다. 시인이 사랑해마지않는 꽃 이야기 때문이다. 열 아홉 번째 생일을 열차 안에서 맞은 어린 여행자의 이야기 때문이다. 인도 여인의 옷, 사리 이야기 때문이다.
19살 어린 여행자....(141쪽) 7월이었습니다. 7월의 인도 슬리퍼 열차 안이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타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같은 열차 칸에 탄 모든 이들에게 짜이를 한 잔씩 돌렸다는군요. 아침에 돌리고 점심에 돌리고 저녁에 돌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위에게 다가와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아홉 살 어린 여행자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한 이 방식에 대해 나는 경탄과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인도 여인의 옷, 사리....(335) 자연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의 또다른 신성한 이유를 말하기 전 인도인들이 선택한 것이 사리의 빛깔 아닌지요.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꿈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살아오면서 눈과 가슴이 이렇게 깊이 함께 뛰고 열락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햇살과 바람 속을 펄럭이며 긴 사리의 행렬이 지나갈 때 나는 잠시 하늘의 음악을 듣습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하늘의 꽃향기를 맡습니다.
첫 인도 여행에서 구입한 빨간 사리 한 벌을 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다. 옷으로 입지 못하면 커튼으로라도 쓰지 뭐, 생각하고 사온 사리는 그 강렬하고도 고혹적인 천상의 색깔 때문에 일상적인 사물들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내내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의 진짜 이야기는 시인이 타고르의 시를 번역하기 위해 산티니케탄에 머물었다는 것이다. 뱅골어를 배우기 위해서이다. 타고르...이 부분은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게 좋을 성싶다. 곽재구 시인도 몰라봤는데 타고르를 어이 알리. 20여 년전 문고판으로 읽은 타고르의 시가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저 곽재구 시인이 번역한 타고르의 시를 접하고 싶을 뿐이다. 그전에 <사평역에서>를 먼저 읽어야겠다. 내가 좀 더 성의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시집 먼저 읽고 이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을텐데...
가슴 떨리게 읽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차분한 시선으로 쓴다는 건 어렵다. 그리고 인도가 아닌가. 그러나 인도인들의 맨발에 대한 다음 부분을 읽고는 나는 드디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297) 처음엔 이 맨발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아낙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길 언저리를 걸어갈 때나 나이 든 이가 감자 자루를 어께에 걸치고 힘들게 걸어갈 때.....나는 인도의 능력 잇는 신들이 저들에게 샌들 하나씩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인도 생활 일 년이 지난 뒤부터 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인의 까만 발은 인도의 자연과 역사가 빚어낸 자연스러운 삶의 문양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나 또한 가능하다면 이들처럼 맨발로 걷고 싶습니다...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는군요. 신발만 벗으면 될 터인데 맨발로 사람들 속을 걷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발만 벗으면 될 터인데'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신발을 벗을 수 없다. 퇴근 길에 생태공원을 맨발로 걷노라면 사람들은 대개가 내 맨발에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한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실은 각 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혁명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감히 말하건대,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인도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심지어 양말도 벗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척이나 낯설고 황당해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듭할수록 묘한 매력 같은 게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쾌감의 경지까지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여행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맨발로 걸어보면 다른 세상을 알게 된다. 맨발로 혹 고질적인 무좀을 완치한 경험이 있다면 세상은 더욱 달리 보인다. 무좀 치료를 하는 피부과의 진료 행위가 사실은, 진실을 은폐한 상업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도인들의 맨발을 우리의 잣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게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책을 읽었다. 산티니케탄이 더욱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