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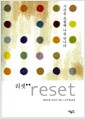
-
리셋 - 시간을 초월해 나를 만나다
기타무라 가오루 지음, 고주영 옮김 / 황매(푸른바람) / 2007년 3월
평점 : 
품절

기타무라 가오루. 작가를 처음 알게된 건 <시간과 사람 3부작> 시리즈 1탄 스킵skip을 선물받으면서였다.
열일곱 살의 여고생이 비가 내리던 날, 잠들었다 깨었을 때 마흔두 살의 아내이자 엄마이며 국어교사로 바뀌어 있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 설정이 당황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내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책을 덮고나서도 한동안 머릿속을 어수선하게 했다.
일본에서 추리소설 작가로 더 유명한 기타무라 가오루가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을 썼다는 게 놀라웠다.
스킵skip을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권의 내용은 어떨지 궁금했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2탄 리셋reset을 만났다. 신비로움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지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책을 펼치고 며칠에 걸쳐 매일 조금씩 넘겨가는 동안 힘들었다. 도통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결국 끝부분 몇 페이지를 남겨두고 다시 첫장부터 읽기 시작했다.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내 어린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읽어나갔다. 사진첩을 들춰보며 사진 속 옛시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과연 내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한동안 잘 이해하며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무라카미 군이 중학생이 되며 '아줌마'네 집에 들렀고 핫케이크 굽는 냄새가 타는 냄새로 바뀌며 나도 혼란스러워졌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한번 더 읽는다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읽는 동안의 느낌 중에 안타까움이 제일 진했다. 전쟁과 사랑과 어린시절과 아픔...
마지막 책- 턴turn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