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떠오른다' 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이른 아침의 나는 하루 중 가장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해보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등, 불과 몇시간후면 스물스물 사라질 생각들이지만 이런 생각들로 머리 속이 채워지는 느낌.
오늘 아침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는데 시선이 딱 박히는 곳에 이 시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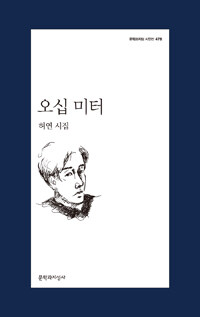
"저는 당연히 카톨릭 신부가 될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냐는 팟캐스트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던 사람이었지.
오랜만에 이 시집을 다시 꺼내들어 읽어보게 되었다.
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생은 그저 가끔씩 끔찍하고,
아주 자주 평범하다는 것을.
(표지, 시인의 말)
끔찍한 날이 가끔씩 오는 생은 나쁘지 않지. 자주가 아니고 가끔씩이라니까.
시인이 그걸 알게 되고서,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서, 삶을 더 긍정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란다. 체념이 아니라 긍정.
"사랑했던 거 맞죠?"
"네"
"그런데 사랑이 식었죠?"
"네"
강물에게 기록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시 '장마의 나날' 중에서)
사랑이 새로 생겨났던 것처럼 사랑은 식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미움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고, 나도 이제 거의 인정한다.
석양에 영웅은 없다. 지친 날개를 꺾는 것도, 핑계처럼 떨어지는 꽃도 다 석양의 일이다.
(시 '석양에 영웅은 없다' 중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 석양의 시간.
한없이 무력에 빠지게 되는 그 잠깐의시간을 빌어 우리는 날개를 꺾기도 하고 변명을 마련하기도 한다.
나 이제 곧 그런 변명을 대대적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니, 이때 석양은 하루의 석양이 아니라 일년의 석양.
불머리를 앓고도 다시 불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시 'Cold Case 2' 중에서)
이제 그런 불장난할 무모함과 용기는 다시 없겠지.
그런 아이가 될 수는 없는거겠지.
아이때에도 막상 그런 불장난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 억울하구나.
어쩌면 인생은 만두다. 파릇한 청춘과 짜내도 계속 나오는 땀이나 눈물, 지친 살과 뼈, 거기에 기억까지 넣고 버무리는 만두는 인생을 닮았다.
하얀 만두피 속에 태생이 다른 것들을 슬쩍 감춰놓은 것도 생을 닮았다. 잘게 부수어지고 갈리고 결국은 뜨거워져야 서로를 이해하는 만두는 생이다.
뒤엉켜 뜨거워지기 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뜨거워진 순간 출신을 묻지 않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만두는 인생을 닮았다.
(시 '만두쟁반' 중에서)
만두를 보고 이렇고 표현할 수 있다니. 이게 어디 후천적인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앞으로 읽고 싶은 책도 많지만 내가 이미 한번 읽은 책 중에 결코 한번 읽고 말게 아닌 책들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생각하니, 새해에는 하루에 한권씩 읽은 책 다시 보기 프로젝트를 해볼까 하는,
연식 드러나는 새 계획이 떠오른 오늘 아침.
역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가면서 스물스물 사라질 확률이 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