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L인가
왜 L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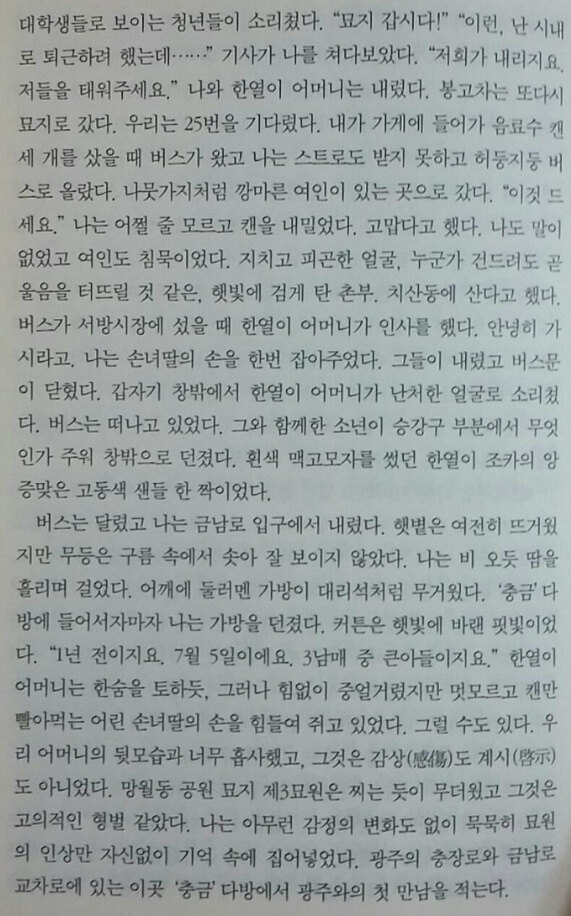
벌써 20년 전이 되었습니다. 한여름 우울 속에서 기형도 《짧은 여행의 기록》을 읽었던 일이. 그 책에서 강렬히 남았던 몇몇 인상 중 하나는 ‘한열이 조카가 잃어버릴 뻔했던 고동색 샌들 한 짝’입니다. 길에 버려진 많은 것들 중 신발은 유독 사람을 애잔하게 합니다. 머리끈이나 볼펜을 발견할 때와는 분명 다른 기분입니다. 맨발로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길에서 꼭 필요한 신발이 ‘이젠 쓸모없음’을 나타내는 걸 보는 당혹 때문입니다. 낡은 신발이면 서글픔으로 갈무리 되지만 멀쩡한 신발을 볼 때엔 ‘사고’를 떠올리게 되고, 아이 신발을 볼 땐 ‘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을 알기에 사연을 생각하게 되고, 안팎으로 혹시나 다치지 않았을까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끈이 떨어져 질질 끌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어느 새벽을 떠올리며, 신발 한 짝이 없이 혹은 신발을 모두 잃은 채 걷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공감이 아니라 참담함이 밀려옵니다. 살해당해 버려진 사람들은 거의 신발 없이 발견되지요. 그때 신발은 살아 있을 때의 품위가 아니라 인격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짧은 여행의 기록》 속 저 문장마다 속속들이 녹아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묘, 우리들의 사진,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땀,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뜨거움, 우리들의 꽃, 우리들의 술병, 우리들의 변기, 우리들의 구더기, 누구나 청년이었던 우리,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딸,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손녀딸, 우리들의 뒷모습, 우리들의 가방, 우리들의 교차로, 우리들의 햇빛, 우리들의 첫 만남,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상(感傷)과 계시(啓示)에 대해서.
저는 망월동 공원묘지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팽목항에도 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영원히 되살아날 토포스(topos)라는 건 잊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 순간 잊지 않으려 하는 것과 나란한 추(錘)입니다. 당신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친구. 태풍 속과 촛불 속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