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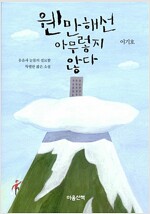

이기호의 신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에서 <최민진은 어디로>,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한정희와 나>를 읽었다. 이기호의 책은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를 읽었고, 『김 박사는 누구인가』를 대출해 놓았다.
표제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는 제목이 스포일러다. 교회 오빠 강민호는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친절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모른 채, 누군가를 돕겠다며 여전히 친절한 태도로 나타나는 교회 오빠의 무심함이 얄밉다. 잘못했다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한정희와 나>는 “현재 가장 절실한 문학의 윤리”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는 평을 받으며 제17회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한정희와 나’가 맺고 있는 복잡한 가족관계는 장치에 불과하다. ‘한정희’를 ‘나’에게서 조금 떨어뜨려 놓음으로 해서 갈등의 면면을 더 세세하게 그리려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한정희에게 한 말은, 상대방에게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럼에도 가끔 해 버리고 마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후회를 부르는 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
첫번째 수록작 <최민진은 어디로>가 좋았다. ‘나’는 중고나라에서 자신의 장편소설에 대한 야박한 평가와 함께 그의 책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판매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직거래를 제안하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나’. 화자가 ‘나’라고 쓸 때마다 이 이야기의 어디까지가 소설가 ‘이기호’의 이야기인지, 어디까지가 ‘소설가’ 이기호의 상상인지 궁금해진다.
그의 소설집에서는 ‘후회’가 보인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뜻모를 오기. 도망쳤던 상대방에게서 듣는 말, “… 꼭 그 말을 들으려고”가 마음을 때린다.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조금도 통쾌하지 않다. ‘나’에 대한 모욕은 옅어졌겠지만 오히려 ‘나’는 더 부끄러워진다.
절망에 대해, 절망의 크기에 대해 생각한다. 찌질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모멸감은 참을 수가 없다. 근근하게 살아내는 가난은 감당할 수 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은 감당할 수 없다. 내 삶을 지나쳐 갈 절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평생 내 삶을 떠나지 않을 절망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되새기는 후회는 얼마만큼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절망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은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