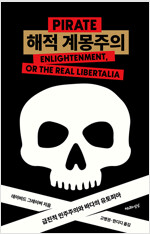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유작 해적 계몽주의가 한글로 번역되었다.
작년 부산 비엔날레(어둠에서 보기)의 유럽인 큐레이터 베라 메이와 필립 피로트가 영감을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물론 초기의 의도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관객으로서 의문이다. 한국의 행정과 규제를 겪고 나면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건축물 조감도처럼.
역자는 고병권 선생. 12만원짜리 1280쪽짜리 희대의 대작 자본 강의를 쓴 저자다. 책에 하이라이트 잘 안 치는 내게는 굉장히 드물게도 한 페이지에 한 번 꼴로 줄을 그으며 읽었다. 그리고 그 잘 읽히는 대작을 쓰기까지 12권짜리 북클럽 자본 전질을 쓴 경험이 있어야했다. 단 한 권을 쓰기 위해 습작(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높은) 12권을 쓰며 자신 안에 내공을 찬찬히 축적해야했던 것. 물론 그 책을 쓰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궁리가 있었겠다. 오랜 생각의 실타래가 꾸준한 습작을 거쳐 다듬어진 후에야 정련된 결과물 한 권이 나오는 것이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팬데믹 초반에 necrotic pancreatitis, 그러니까 괴사성 췌장염으로 환갑 전에 명을 달리했다. 예일대를 거쳐 런던정경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인류학자인데 탄탄한 이론과 활동가로서 현장성을 겸비한 보기 드문 지성인이었다. 그의 글은 특별하다.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데이비드 그레이버만 쓸 수 있는 글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하냐?
일단 명료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녔고, 급진적 이론(아나키즘)을 인류학적 증거로 뒷받침해 실제 경험적 사례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상아탑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이론적 정밀함을 유지한다. 나아가 피카소급으로 기존 역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능하며 아나키즘을 사상으로서뿐 아니라 지적 형식이자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그레이버의 저서는 빌브라이슨이나 신형철처럼 어느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안의 유머와 해학과 풍자적 요소를 제대로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있지만 팬이 되면 그만큼 또 재밌는 책이 없다. 그가 요리조리 구사하는 재치있는 반어법이라든지 일상에서 발견해낸 철학적 직관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 <헛소리 직업(쓸모없는 일자리)>의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rmally, when you challenge the conventional wisdom—that the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s the only possible one—the first reaction you are likely to get is a demand for a detailed architectural blueprint... Historically, this is ridiculous."– Bullshit Jobs: A Theory
그레이버는 이 인용문이 언급된 책에서 관료주의 서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시시한 일을 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꼬집는데 마치 SNS에 올리는 냉소 섞인 농담같다. 그런 농담섞인 말과 학술언어 사이의 오솔길을 더듬어가던 어느 순간 독자는 깨닫는다. 우스운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속한 체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레이버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왜 쓸모 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고 물으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한다.
"지옥이란 자신이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Hell is a collection of individuals who are spending the bulk of their time working on a task they don’t like and are not especially good at."– Bullshit Jobs: A Theory
또 다른 재밌는 예시는 규칙의 유토피아에서 찾을 수 있다.
"The ultimate, hidden truth of the world is that it is something that we make, and could just as easily make differently."– The Utopia of Rules
"세상의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를 만들었고, 원한다면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시스템 등의 기존 질서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은 유발 하라리 등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대부분의 지성인이 공유하는 논점이지만, 그레이버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위 인용문에서처럼 얼마든지 사회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관찰적 비판자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이 대안을 꿈꾸는 사상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레이버는 사회변화를 말하면서 무의미한 청사진과 보여주기식 매뉴얼을 내놓는 식의 정치적 상상력에 회의적이다. "사회 변화가 언제 누군가의 청사진에 따라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구상하고, 언젠가 주식 거래소와 공장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설계한 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겼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상상하게 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When has social change ever happened according to someone’s blueprint? It’s not as if a small circle of visionaries in Renaissance Florence conceived of something they called “capitalism,” figured out the details of how the stock exchange and factories would someday work, and then put in place a program to bring their visions into reality. In fact, the idea is so absurd we might well ask ourselves how it ever occurred to us to imagine this is how change happens to begin."
그레이버는 혁명을 일상의 행위로 본다. 약자의 무기나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을 쓴 제임스 스콧과 비슷한 입장이다. 학내정치로 인해 2005년에 테뉴어에 임용되지 않았을 때 같은 예일대에 몸담고 있던 제임스 스콧은 그레이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우연의 일이 아니다. 둘의 학문적 방향성은 비슷했고 상호 존중하는 사이였다. 그 둘의 입장의 고갱이는 곧, 거대한 서사 대신 함께 규칙을 만들고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진짜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레이버는 사유하는 시인라고 할 수도 있겠다. 논리와 이성을 가능성과 이상으로 버무리고, 제도와 함께 관계를 접목시키고, 전환과 동시에 실천에 주목했던 시인. 임마뉴얼 월레스틴이나 칼 폴라니, 니클라스 루만이 메타적으로 거대관계에만 다루어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레이버는 현장에 뛰어들어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구조적 분석과 미시적 예시가 돋보이는 정치한 글을 빚어냈다.
그레이버 사후의 독서는 어떠해야하는가? 그레이버를 읽는다는 것 좌파적 상상력을 익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세상을 향한 어떤 우회적인 신뢰를 되찾는 일에 가깝다고 본다. 인간이 아직 계산하지 않.을.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인간이 불교의 무주상보시와 모스의 증여론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레이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다르게 상상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레이버는 새로운 상상력을 증언하는 글쓰기를 새로운 언어를 통해 증거했다. 그래서 많은 카우치 인류학자들과는 달리 탁상공론이 아니라 가능성 그 자체였고 그의 책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레이버의 레거시를 좇는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글쓰면서 다른 세계를 도모하며 살아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