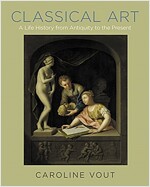

2018년 프린스턴대 출판부에서 나온 캐롤라인 부트 캠브릿지대 고전학과 교수의 책이다. 기원전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로마→15-16c르네상스→18-19c신고전주의→박물관과 오늘날에 시사점으로 이어지는 챕터다
.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읽었는데
챕터9의 이 부분은 인상깊어 함께 공유하고자
채선생에게 번역해달라해서 복붙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왜곡(warping)”이 감탄, 수집, 발굴, 연구와 함께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 유물에 집착하고 다른 것들―혹은 사회, 사회의 일부―을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와 아탈리드 왕조의 페르가몬에서 르네상스 이탈리아,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문화”로 전환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이미지를 다듬고, 계승하고, 전해주었다. 이것은 분열적이기도 하고, 분명히 과장되었지만동시에 우연히도 유익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산”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원한다면 그리스와 로마를 분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 “예술,” “유물,” 혹은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것들을 단지 현재의 그리스 땅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야기만 전할 뿐이며 여전히 거짓된 동질성을 만들어낸다. 공화정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지중해 전역에서 생산된 방대한 물질문화―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처럼 가까운 곳에서조차―는 “그리스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올림피아나 델포이 현장에서는 아테네인 봉헌물은 아테네적으로, 낙시아인 봉헌물은 낙시아적으로 보였다. 후자는 심지어 낙시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스적”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비잔틴이나 근세 유럽에서, 그리고 다시 그리스 독립 이후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다.
로마 미술에 관한 책에서 “그리스적” 내용을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고전주의”나 “제2소피스트기의 고전주의”로 한정하는 것 역시 단순화이다. 하드리아누스 별장에서 발견된 모작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복제품은 단순히 “특유의 고대풍”이나 “그리스 문화의 부흥”의 상징이 아니라, 로마의 웅변과 문학 속에 뿌리내린 것이었다. 그것들은 원재료이자 완성품이었으며, 로마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적이었고, “제국적” 이미지와 “해방 노예 예술”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은 후기 고대 예술을 형성했고, 끊임없는 전시와 점점 더 노골적인 투자 속에서 서구의 조각과 회화, 심지어 중국의 그것과도 연결되었다. 만약 그리스 조각과 회화를 “예술”이라 한다면, 로마에서 그 예술은 인기와 위신을 더해갔고, 로마의 제단, 기둥, 초상화, 보석, 주화 같은 생산물을 그 궤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로마인들이 문학 속에서 예술을 논할 때, 그들은 매우 자주 그랬는데, ‘예술’은 곧 그리스 예술을 의미했다.” 오늘날 오직 그리스 예술만을 수집하려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그들은 키츠적인 위상에 이끌린다.
수집가들은 적이 아니다. 예술이 적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개인 수집가들과 후원,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 드러나는 수집 활동은, 그리스 성소에서 로마 공화정 사원으로, 로마에서 파리로, 아테네·바세·보드룸에서 런던으로 조각이 옮겨졌던 더 넓은 차원의 전유, 거부, 반응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이 조각을 복원하고 스케치하면서 자신의 창작의 기초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모형에 충실했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도 정교해 구매자를 속이고 진품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속성을 덧붙여 고대 대리석을 헤라클레스나 가니메데로 변모시키는 것과, 약탈된 유물을 두드려 부수거나 잘라서 세관의 눈을 피하고 대서양을 건너 보내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없다. 그것들을 스티로폼, 혹은 유리 구체나 마오 수트로 재현하는 것―다브셔, 제프 쿤스, 쉬지앙궈 같은 이들이 해온 것―은 비교하자면 오히려 경건한 행위이다.
그리스와 로마 유물을 향한 감탄과 수집은 언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노골적인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그러한 논쟁들은 형성적 역할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