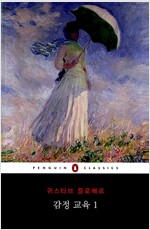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이 없었다. 책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물리적 시간이 없지는 않았는데, 중요한건 역시 정신적 시간이었다. 뭔가에 쫓기면서 급하게 살다보니 책을 볼 생각이 안들었다. 그래도 좀 읽기는 읽었다....
1월에 읽은 책을 간략히 정히하자면,
N24001 감정교육 1 : 귀스타프 플로베르
N24002 감정교육 2 : 귀스타프 플로베르
<보바리부인>, <세가지 이야기> 에 이어서 내가 읽은 플로베르의 세번째 작품인데, 기대가 너무 컸는지 많이 아쉬웠다. 뭔가 불필요하게 분량만 길었다. 좀 더 짧게 한권으로 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시기의 대의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위선적인 인물들과, 이러한 혼란속에서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주인공 ‘프레드릭‘의 이야기인데, 어느 것 하나에도 공감하기 힘들었다. 당시 시대를 잘 그린것 같긴한데...도대체 ‘프레드릭‘은 왜 ‘아르노 부인‘에게 그렇게 집착한 걸까?
명작이라고 하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24년 첫 책부터 힘들었다.
N24003 가벼운 마음 : 크리스티앙 보뱅
24년 첫 책의 선택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고른 책은 보뱅이었다. 역시 보뱅이었다. 감탄 그자체였다. 처음에는 늑대가 나오고 서커스단이 나오고 집시가 나오길래 무슨 상징인가? 이랬는데,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냥 이야기 자체가 순수 그 자체였다. 보뱅은 에세이만 잘 쓰는게 아니었다. 소설도 완벽했다. 소설도 에세이처럼 착했다. 너무 착해서 나같은 사람(?)이 이런 깨끗한 책을 읽어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나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사실 무엇이 되느냐는 중요 하지 않으며, 나를 기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 내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삶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내가 그것을 잊으려는 찰나에 나를 만나러 온다. 그러니 무엇하러 인생을 걱정하겠는가?] P.162
N24004 상실 : 조앤 디디온
아 그러나 <상실> 이라는 어두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마음은 다시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작가인 ‘조앤 디디온‘이 남편을 급작스럽게 잃고 경험하고 느낀 회고록 성격의 작품인 <상실>은 그냥 우울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비애라는게 이런거구나 하는 간접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비애는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장소였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만(알지만), 상상한 죽음 직후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다음의 삶이 어떠할지는 생각하지 않다. 사실 그 며칠이나 몇 주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죽음이 급작스레 닥친다면 충격을 받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이 충격이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리라는 건 모른다. 탈진하고 슬픔에 잠기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리라고는 예상한다. 우리는 실제로 미쳐 버릴 것으로는 예상치 않는다] P.249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이렇게 해볼걸, 원하는 걸 더 해줄걸, 못다해준 것들을 후회한다. 사람과 사람은 결국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실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 하루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중에 해야지, 미래를 위해야지 하면서 미루면 안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니까.
N24005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 최은영
역시 최은영 작가였다. 한국의 윌리엄 트레버, 한국의 앤드류 포터라고 칭하고 싶다. 확실히 최은영 작가의 장편보다는 단편이 더 끌린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이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은 인물들의 모습에서 잔인한 현실과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년>이 가장 좋았다. 누군가에게 친해지고, 자상하고 싶었지만 타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미숙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었다. 왜 타인을 그렇게 의식했던걸까? 왜 타인이 잘못됐다고 말해지 못했을까? 지금은 안그럴수 있을 것 같다만...
[아무리 누추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마주볼 때면 더는 누추한 채로만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둘의 이야기들은 서로를 비췄다. 다희에게도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빛이 되어주었기를 그녀는 잠잠히 바랐다.] P. 123. 일년
N24006 빌라 아말리아 : 파스칼 키냐르
어렵지만 계속 찾아서 읽게되는 ˝파스칼 키냐르˝의 장편소설이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고,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다. 내용은 간단하다. 어느날 주인공 ˝안˝이 지금까지의 나와 주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이다. 내가 늘상 하는 말로만 새롭게 태어나는게 아니라, 진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남편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팔고 고향도 떠나고.
책을 읽다보면, 어 그럴듯한데? 어 나도 가능할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다만 돈이 없을뿐...) 다른 분들의 평가처럼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 치고 서사가 확실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올해는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 완독을 목표로~!!
[만일 운명이란 것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장소에서 생겨난 충동이라면, 그래서 한 존재를 사로잡고, 그 존재가 충동의 본성을 한순간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면, 그녀에겐 운명이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자각한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연히 그곳으로 달 려간다. 어떤 것이 내게 결여된 그곳에서 내가 헤매고 싶어지리라는 느낌이 든다.˝] P.123
N24007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 메리 올리버
24년 ‘마음산책‘ 북클럽을 가입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은 책이 메리 올리버의 시집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었다. 회사에서 바쁜 와중에 책상위에 놓고 조금씩 읽다보니 다 읽었다. 작년에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를 읽었던 터라 그녀의 작품이 참 좋다는 건 알았는데, 이 작품도 좋았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잠깐씩 느낄수 있는 자연, 그리고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메리 올리버˝의 애정어린 시선이 위안이 되었다.
시라는 장르가 어렵고 특히 외국시는 우리나라의 시에 비해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메리 올리버˝의 시는 괜찮았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소설은 중간에 멈추면서 읽기 힘든데, 시는 쉬엄쉬엄 읽으면서 생각할수 있어서 좋은것 같다.
[중국의 옛 시인 이태백은
밤에 배를 타고 나가 술 마시고 꿈꾸고 노래하다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지.
글쎄, 우리도 대개는 어느 순간, 그렇게 필사적이 되지.
달은 안 그렇지만.] P.31.이태백과 달
2월부터는 리뷰도 쓰고 북플도 부지런히 하고 그래야겠다.
Ps. 오늘 아침에 다읽은 ‘앤드류 포터‘의 <사라진 것들>은 정말 완벽한 작품이었다...!!! 이작품은 리뷰를 꼭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