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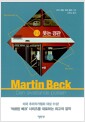
-
웃는 경관 ㅣ 마르틴 베크 시리즈 4
마이 셰발.페르 발뢰 지음, 김명남 옮김 / 엘릭시르 / 2017년 11월
평점 :



작가커플이 사이좋게 회의를 한다.
“목을 조를까?”
“아니야...토막?”
“그것도 식상하지..총기 난사?”
다정한 커플이 어떤 살인범을, 어떤 살인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상을 해본다. 다정한데 살벌하다.
책표지 날개에 나온 작가 소개, 스웨덴의 작가 커플인 마이 셰발과 페르 발뢰가 함께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집필했다니 한번 상상해봤다.
스웨덴하면 최고의 복지국가, 금발과 파란 눈의 거구들, 창백한 피부 등이 떠오른다.
피가 낭자한 사건의 현장, 그들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문장을 나열해간다. 마치 피가 아닌 물감을 본 듯, 시신이 아닌 분해된 사물을 보는 듯.
그것이 또한 매력이기도 하다.
경찰이 되면 안 될 사람이 경찰이 되어, 범죄자쪽으로 향해야 할 공권력과 에너지를 내부에 돌리기도 한다.
시간을 떼우기 위해 외곽을 돌면서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 번거로운 일이 벌어질까 본분을 잊은 방만한 경찰들의 모습.
기본적인 숙지도 못해서, 살인현장을 온통 자신들의 족적으로 오염시키는 무능한 경찰.
그와 반대로 너무나 살인범을 잡고 싶어, 위험한 미행을 선택한 경찰.
가끔 범죄자의 심리를 알 수 없어, 그 행동을 모방하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기도 한다. 거기다 오로지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며, 타인의 고통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는 냉혈한 살인마에겐, 동기를 알아낼 이유따윈 없다. 그저 내 앞길을 가로막은 그들이기에 죽였을 뿐, 일말의 가책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막아선 그들이 잘못했을 뿐, 그들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수고를 한 자신이 억울할 뿐이다.
실마리가 없어 헤매는 사건, 실제론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힌트, 그래서 경관은 웃고만다.
죄책감 대신 타인을 탓하는 가해자를 향해 또 한 번 웃지 않았을까.
쓴웃음, 인간에 대한 경멸, 그리고 쓰레기같은 놈.
엉망인 체계, 경찰을 믿지 않는 시민들, 그 속에서 정의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형사들.
비 오는 거리, 축축함과 끈적임, 기분 나쁜 습기까지 느껴진다.
범죄들, 시니컬한 농담들, 사건보고서들이 비가 오는 거리를 메운다.
깨끗하게 잘 정돈된 책상위, 역시 잘 깎인 연필로 사각사각, 범죄행각을 써내려가며 왠지 <웃는 경관>이란 제목과 달리 경관이 아닌 작가가 웃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의 허탈함에 당황할 독자들을 상상하며.
( 미미님 추천으로 읽게 된 책 , 재미있는 스릴러 만나서 무지 신남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