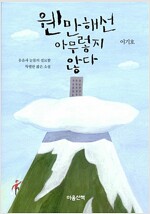
마흔 편의 짧은 소설 모음집이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는 유쾌한 소설이 있는가하면, 현대인들의 팍팍한 현실을 드러낸 가슴 아픈 소설도 있었다. 약간은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웃음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이야기들도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을 건드리는 몇 편의 이야기라도 만난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싶다.
어떤 책이든 내 상황에 맞닿아있는 부분에 시선이 가게 마련인가보다.
불 켜지는 순간들
검은 양복 사내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304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저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한데 제발 불 좀......"
"아, 그거요......"
검은 양복 사내는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은 어머님께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까? 딱 그 주기에 한 번씩 선생 어머님 마음에도 불이 켜졌겠지요. 여기도 이승과 똑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 p108~109
다행이다. 내 방은 어둡지 않겠다.
봄비
아무 말 없이 계속 그의 머리 위를 누비 점퍼로 가려주고 있던 노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 아무래도 감기 들것소."
그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p201
엄마는 병원에 계시면서도 병원인 것을 자꾸 잊고, 다른 할머니들이 계신 것을 보고 나에게 밥을 하라고 하신다. 나눠 먹어야한다고. 그런 말씀 정도는 이제 웃어넘기고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으니 가족들의 얼굴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 시간이 늦게 오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