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쥘과의 하루
디아너 브룩호번 지음, 이진영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4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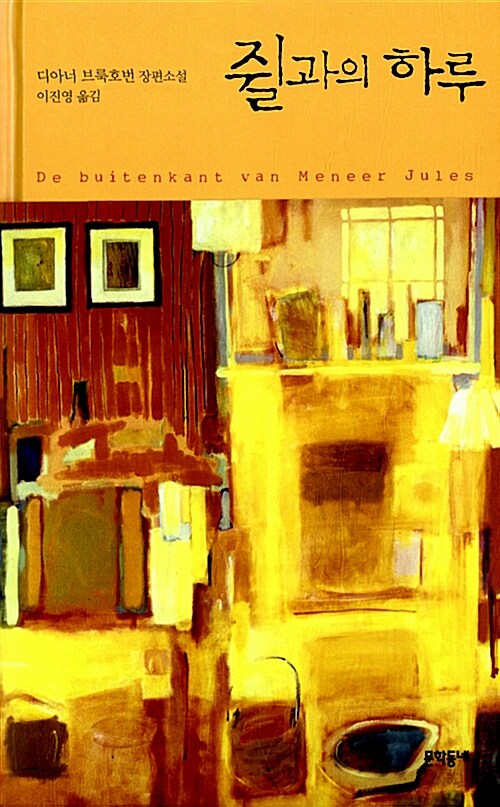
고양이를 그리는 유명한 작가의 고양이가 몇 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의 일이다. 반려인들은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대부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키웠던 고양이의 죽음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아늑한 담요에 누워 있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 빗질을 해 줄 수 없으니 고양이를 안아주고 빗질을 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반려 동물 장례식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고 예쁜 구슬로 만들어 왔다. 그때 그 모습이 나에겐 너무 생소했다. 나에겐 죽음이란 장례식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함께 했던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그 태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 할 것인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었다.
[쥘과의 하루]는 그 작가의 추모와 비슷한 경우였다. 매일 아침의 루틴으로 시작되는 하루 중 그 시작의 끝은 커피를 내리는 일이었다. 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쥘의 죽음이 믿어지지는 않고 당황스럽지만 알리스는 쥘이 향기 가득 내려놓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쥘과 함께 하기로 했다. 우선은 쥘의 죽음을 혼자 감당해 보기로 했지만 그녀의 계획에 큰 변수가 생겼다. 매일 아침 열시에 쥘은 다비드와 함께 체스를 두었다. 쥘이 죽은 그날도 다비드는 쥘을 찾아 왔다. 자폐증이 있는 다비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쥘이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알리스가 체스를 두기로 했지만 다비드는 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 그때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궁금했다. 돌방 상황을 싫어하는 다비드와 알리스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낼 것이며 다비드가 인지하게 되는 쥘의 죽음은 또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소설의 중심은 다비드와 쥘의 얘기도 아니고 오로지 알리스와 쥘과의 하루를 중심으로 다룬다. 불륜을 알게 된 후 쥘에게 갖게 된 분노를 감추며 살았던 알리스의 슬픔이 터져 나와 그동안 저 밑에 감춰 놓았던 서러움을 쥘에게 털어 놓았다. 그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와의 이별에서는 감정이 고조되었다. 알리스가 쥘과의 이별하는 방식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스스로 위로 받는 것이었다. 알리스의 추모가 부러워졌다. 함께 한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남겨진 말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남겨진 시간들이 많이 괴롭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발인을 앞두고 있었던 새벽이었다. 해결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로 장례식장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었다. 모든 소음이 꺼지고 지친 몸을 벽에 기대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많이 울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발인이 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 깊은 원망으로 아버지와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걱정하고 답답했고 화가 났다.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 많이 미안하다. 알리스처럼 가슴에 맺힌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일을 막아 놓고 가신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원망으로 한 달을 보냈다. 알리스처럼 쥘이 차려진 아침을 맞을 루틴이 없었던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절망으로 망연자실 했다. 처음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알리스와 나는 많이 달랐다. 알리스처럼 고백할 말이 없었다. 그냥 아버지가 떠난 그 시간이 절망만 있다고 생각했다. 떠난 이를 그리던 따뜻한 그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1년이 지나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렀다. 아, 우리 아버지는…….그렇게 말을 꺼내다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개팅 남과 헤어졌었다. 그때 알았었다. 아버지와 나와의 헤어짐이 이제야 시작 되었다는 것을.
내게도 알리스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었다. 원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와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추모할 있었다면 아버지와 헤어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의 이곳에서 떠나게 되고 또 친한 지인과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번의 경험이 있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온다면 또 다른 추모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 자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날들 서로가 후회 없는 얘기들을 자주 나누며 살다 가고 싶다. 죽음을 한번 생각했었던 어느 여름날, 두렵고 힘들었던 그 단어를 쓰다듬으며 걸어 나왔던 날들을 떠 올리니 매일이 참, 소중한 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