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은교>를 읽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가끔 다 읽어 간다는 사실이 아깝게 느껴지는 책들이 있다. 나에겐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닌가 싶다. 한장 한장 넓길 때마다 자주 "후~"하는 탄성을 지르게 한 책. 내가 왜 박범신이란 작가를 진작에 몰랐을까? 후회될 정도라고나 할까?
지금은 <은교>를 읽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가끔 다 읽어 간다는 사실이 아깝게 느껴지는 책들이 있다. 나에겐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닌가 싶다. 한장 한장 넓길 때마다 자주 "후~"하는 탄성을 지르게 한 책. 내가 왜 박범신이란 작가를 진작에 몰랐을까? 후회될 정도라고나 할까?
결코 비교 대상이 되어선 안 되겠지만 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작가 중 문장에 있어서만큼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다면 김훈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박범신 선생은 또 다른 문장의 경지를 보여준다. 몰랐던만큼 전작에 도전하고 싶은 작가가 한 사람 더 생겨버렸다. 아, 어떻게...ㅜ

 <공무도하>를 읽지 못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 본 김훈 선생의 글 중엔 <남한산성>이 가장 탁월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더불어 숲>은 정말 다 읽기 아까운 책이었고. 신영복 선생한테는 죄송한 일이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 <은교>가 순위를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두 책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공무도하>를 읽지 못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 본 김훈 선생의 글 중엔 <남한산성>이 가장 탁월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더불어 숲>은 정말 다 읽기 아까운 책이었고. 신영복 선생한테는 죄송한 일이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 <은교>가 순위를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두 책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도 밝혀둔다.
 어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요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기까지 하거나 적어도 그 부조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원칙이 없어서이거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뭐 그것이 어니 내 주변의 일만이겠는가? 우리나라 탐관오리들의 행태가 또한 그렇지 않은가? 원칙은 힘있는 것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몸소 지키지 않는 것도 그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분개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 받거나 잡아 가둔다. 빌어먹을 세상이다!
어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요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기까지 하거나 적어도 그 부조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원칙이 없어서이거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뭐 그것이 어니 내 주변의 일만이겠는가? 우리나라 탐관오리들의 행태가 또한 그렇지 않은가? 원칙은 힘있는 것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몸소 지키지 않는 것도 그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분개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 받거나 잡아 가둔다. 빌어먹을 세상이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일까? 원칙을 지키면 고리타분한 인간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원칙이 없을수록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가는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은가? 오지랖 넓으면 그게 리더십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리더들이 흔히 갖는 이 오지랖이란 이불이 그렇다. 모든 사람을 다 덥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추울 것 같아 덥어주면 저 사람의 어깨는 덥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엔 저 사람을 덥어주면 이번엔 이 사람의 어깨가 나오는 형국이다. 난 리더들의 이 어줍지 않은 리더십에 항상 반기를 들었고 그들의 지켜지지 않는 원칙에 저항했었다. 그래서 난 늘 리더들의 걸림돌이었고 대항마였었다. 이젠 나이 먹어 그짓하는 것도 싫다고 초야에 묻혀 살다가 손바닥만한 마당으로 나왔을 뿐인데 그 손바닥만한 마당에도 어줍잖은 잡초들이 나있더라. 이것을 뽑아야 하는지, 그 잡초가 보기 싫어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내면의 평안을 모른다고 했던 헤르타 뮐러가 말은 잘했다.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면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 했다. 예전에 누가 그랬다. 그래봤자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 너만 다치게 될거라고. 그러므로 네가 생각을 바꾸라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난 내면의 평안을 구하려다가 바보가 되기는 싫다. 불평이 힘이 된다고 했던가? 힘이 없으니 고쳐나갈 수는 없다고 해도 불평이라도 하련다. 너는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신의 원칙은 뭐냐고 끊임없이 묻고 다닐 것이다.

어제 내 손에 들어 온 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봐야겠지만 청소년의 자살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제로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본소설이고 한때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방송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내 청소년 자살률이 좀 떨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작가도 비교적 젊다. 단지 자살 억제라는 착한 소재의 책이 있다는 게 반가울 뿐이었다.
 얼마 전, 엄마의 아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아는 지인은 <자유죽음>이란 책이 생각난다며 죽은이의 명복을 대신 빌었다.
얼마 전, 엄마의 아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아는 지인은 <자유죽음>이란 책이 생각난다며 죽은이의 명복을 대신 빌었다.
하지만 이런 책은 내가 추천받고 싶은 책은 아니다.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더구나 자살을 권하는 사회에서 저런 책은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될텐데 관심은 가져 뭐하겠는가? 모르긴 해도 자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선 저 소설처럼 자살 억제를 위한 노력을 어디선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매일 자살에 대한 보도만큼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된다면 참 좋겠다. 이젠 어떻게 사느냐 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는 마이클이 아직 젊었을 때고 그렇게 일찍 단명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엘비스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마이클 잭슨. 그에 관한 책을 어제 새롭게 발견했다. 얼마 전에 본 <디스 이즈 잇>이 생각난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는 마이클이 아직 젊었을 때고 그렇게 일찍 단명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엘비스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마이클 잭슨. 그에 관한 책을 어제 새롭게 발견했다. 얼마 전에 본 <디스 이즈 잇>이 생각난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

 그밖에 관심 가는 책이다. 연애에 관한 책. 하나는 웃기고 하나는 뭔가 특이할 것 같다. 책 표지도 나름 일본스럽고.
그밖에 관심 가는 책이다. 연애에 관한 책. 하나는 웃기고 하나는 뭔가 특이할 것 같다. 책 표지도 나름 일본스럽고.
 제목도 특이하지만 표지 그림이 아름답다. 내용도 읽어보고 싶다.
제목도 특이하지만 표지 그림이 아름답다. 내용도 읽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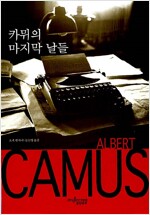

그래도 이번 주 가장 럭셔리한 책의 발견은 이 두책이 아닌가 싶다.
카뮈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우라가 있고 무엇보다 표지 그림이 타자기가 내 마음을 확잡아 끌었다.
 저책을 보다 <헤밍웨이의 글쓰기> 표지 그림 보면 막 욕이 나올 것 같다. 어떻게 타자기를 요따구로 밖에 못 그리는 거냐? 카뮈나 헤밍웨이나 얼마나 타자기가 잘 어울리는 작가더란 말인가? 팽~
저책을 보다 <헤밍웨이의 글쓰기> 표지 그림 보면 막 욕이 나올 것 같다. 어떻게 타자기를 요따구로 밖에 못 그리는 거냐? 카뮈나 헤밍웨이나 얼마나 타자기가 잘 어울리는 작가더란 말인가? 팽~
저 긴 이탈리아에 관한 책은 내가 워낙 이탈리아와 그 나라의 음식을 좋아해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더구나 작가가 자국의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라니 이채롭다. 책이 좀 비싼게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