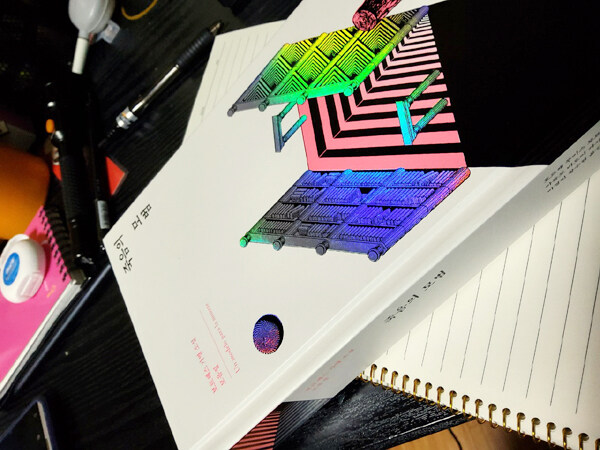
우리 책쟁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그들이 어떤 책을 사는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다.
다만 귀차니즘에 매몰되어 잘 정리하지 않을 뿐.
나는 이달 들어 모두 3권의 책들을 샀다. 그나마 있는 사진은 달랑 보르헤스 선생님의 <죽음의 모범> 뿐이다. 12월 1빠로 사들인 <체벤구르>는 어디에 두었나 그래.
책을 하도 읽다가 실명을 할 정도였다는 대가 앞에서 감히 책쟁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도 하셨다지 아마. 그야말로 책쟁이 업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될 진 모르겠지만, 설마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력 보호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간유구라도 먹어야 하나. 사실 아직까지도 난 간유구가 무언지 모른다. 아주 오래 전부터 눈이 좋아지려면 간유구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 뭐 그렇다고 한다.
<죽음의 모범>은 보르헤스 선생님이 가명으로 발표한 소설들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동네 중고서점에 떠서 당장 달려 가서 사들였다. 아직 책 표지도 펴보지는 못했다. 그냥 일단 나중에 언제고 읽을 거라는 신념에 사들인다. 산 책은 십년이 지나고 몇 년도 지나도 언젠가는 읽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책을 사댄다.
어제 그놈의 적립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른 윌리엄 트레버 샘의 <밀회>가 곧 도착한다는 문자와 알림이 수시로 나의 핸드폰 액정에 뜬다. 오늘 마침 읽을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요건 오는 대로 읽어볼 생각이다.
2021년의 마지막 달도 이제 보름 정도 남은 모양이다. 남은 보름 동안 나는 또 어떤 책들을 사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뱀다리] 지난 주말에 인천에 갔다가 오래전에 공연이나 야구장에 가던 시절의 티켓들을 모아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중에서 찾은 게 2003년 8월 10일 포트 애덤스에서 열린 JVC 재즈 페스티벌 티켓이었다. 당시 내가 일하던 샐러드 바 옆 사진관(그랬다, 그 때는 무려 필름 카메라 시절이었다)에서 일하던 브래들리라는 친구와 함께 멀리 로드 아일랜드의 포트 애덤스 요새까지 차를 타고 달려갔다. 110KM 차로 한 시간 반 정도되는 거리구나 그래.
그전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헤롱거리면서 그 뜨거운 여름날에 포트 애덤스로 갔다. 아 그전에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포트 애덤스에는 도미랑 광어 낚시를 하러 자주 갔었는데...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다.
나중에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내 누워 있었다. 사실 자그마치 54달러나 하는 표도 브래들리가 사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하다. 브래들리는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지 싶다. 진짜 대포 사이즈만한 카메라로 무대에 오른 재즈 아티스트들의 사진을 이들이 참 많았다. 브래들리가 찍은 사진도 나한테 주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어딘가에 있겠지 싶다.
그렇게 술과 잠에 취해 비몽사몽 중이어는데 갑자기 익숙한 재즈 넘버 하나가 들리는 게 아닌가. 바로 1959년 데이브 브루벡 쿼텟이 발표한 <Take Five>였다. 세상에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가능한 무대 곁으로 가서 이 위대한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내가 아무리 재즈에 대해 문외한이라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데이브 브루벡 아저씨는 지난 2012년에 91살의 나이로 작고하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9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작년에는 탄생 100주년이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Take Five>는 내가 라이브로 들었을 때, 이미 태어난 지 44년이나 된 그런 노래였구나.
그날 얼굴이 온통 화상 수준으로 타서 근 일주일 동안 탄 얼굴이 쩍쩍 갈라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후로 썬크림을 바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