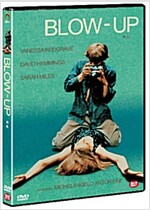
《한국일보》에 <안목 중독>(전문 링크)이란 이야길 해보았습니다. '진부함'에 대해 쉽게 나무라고, 사람을 서문에 비유하며, 서문 몇 쪽만 봐도 감이 온다며 뻔한 자로 규정하는 각박해진 세상을 논했습니다.
글로 먹고 사는 인생에도 안목은 중요한 능력이다. 나 같은 경우 글도 쓰지만, 잡지를 만들면서 다른 이의 글도 꾸준히 읽는다. 괜찮은 필자를 찾다 보면 글에 대한 평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쓰러운 신경전이 벌어진다. 대화 가운데 뻔하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여기서 뻔함은 나름의 방어다. 행여 자신이 진부해 보일까 걱정되어 누군가의 질문과 관점에 대뜸 뻔하다 받아 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익히 알다시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본다. 실컷 글 쓰거나 말한 뒤 이미 이뤄졌던 논의인가 싶어 습관적으로 서두에 ‘익히 알다시피…’로 표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들에게 ‘익히 알다시피…’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좀처럼 접하지 못했으리란 과욕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다. 나중에 가서 타인에게 뻔한 사람으로 취급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신경 쓰는 태도에 가깝다.
안목의 사회적 용법에 의구심을 품지 않으면, 이러한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된다. 사람들의 표현을 금세 식상함과 그렇지 않음으로 지각하는 감정 구조가 굳어진다. 누군가의 언어를 제대로 들으며 헤아리려는 노력 대신, 세상을 오로지 비범함과 평범함으로만 솎아내는 것을 ‘뛰어난 감각’이라 여기는 착시가 생긴다. 그 구조 속에선 진부한 이로 규정될까 걱정되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 감각을 과시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드셀 뿐이다.
이를 ‘안목 중독’이라 부를 수 있다면, 안목 중독의 사회는 각자 나름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이들의 메시지를 곧잘 ‘글러먹음’으로 평가하는 데 스스럼없다. 이러한 태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니, 안목에 중독된 이들은 높을 대로 높아진 기준에 망설임이 없다. 타인이 왜 아직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용납’의 수준으로 사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