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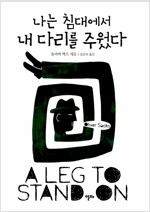
1. 올리버 색스의 유머를 좋아한다. 그는 의사이면서 실인증 환자였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에 구슬퍼 하진 않았다. 외려 자신과 반대 증상을 보이는(올리버 색스가 사람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의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아는 체하는 신경질환에 걸렸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낙천적으로 그려내며 타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의 분량을 세심히 챙길 줄 알았다.
2. 그렇다고 그를 마냥 유머러스한 '의학 에세이스트'로 두기엔 그 공로의 범주가 좁은 듯하다. 나는 갈수록 유머가 더해지고 그 유머에 깔린 인간에 대한 집요함이 돋보이는 후기작도 좋아했지만 《편두통》 같은 다소 건조한 아카데미 스타일의 초기작에 애착이 간다. 흔히 아우라 하면 발터 벤야민을 떠올리지만, 《편두통》에는 올리버 색스식 아우라의 해석 영역이 있다.
3. '언젠가'란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지만 내게 르포르타주를 써보고 싶게 만드는 이는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 그리고 올리버 색스였다. 이 노인의 재치는 생사의 문제에 잠겨 있다. 그래서 더욱 눈여겨보게 된다. 죽는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 깎을 타이밍을 놓친 길이의 손톱으로 노트를 북북 긁어대는? 색스는 부지런히 죽음의 느낌을 살폈고 이를 떠벌리는 전개 방식보다는 논거와 위트로 독자들이 그 느낌에 마냥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왔다.
4. 그는 시각적으로 예민했지만 그 예민함을 과신하지 않았다. 인간의 장점과 매력을 찾아보려 노력했으며 그 노력은 확신이 있는 밝은 곳보다 존재 증명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의 어두운 곳에 가까이 있었다.
5. 비판이론은 사라지고 고통과 상처에 대한 감각적 진단이 그 자리를 꿰차는 시간 속에서, 올리버 색스의 기록을 읽는다는 건 왠지 비판적 지성을 예열하기 위한 휴식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고인을 기리면서 범할 쉬운 무례일 것이다. 올리버 색스는 자신이 처한 싸움을 선명하게 인식했고 미셸 푸코와는 다른 스타일로 의학이 우리 삶의 투쟁 영역임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의 담백한 유머가 그 지점을 잠시 잊게 해준 것은 그의 천성에서 나온 선물이자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안고 가야할 실천의 과제 부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별은 지지만 밤은 아직 있다. 그리고 내일 밤을 기다린다. 하루의 간격을 그렇게 측정하면서 이 연약한 인간은 살아낸다. 올리버 색스가 남긴 '고맙다'는 말에 인간으로서의 믿음을 덧대고 싶은 이유다.올리버 울프 색스
Oliver Wolf Sacks (1933~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