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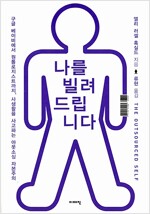
감정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는 그녀의 대표작인 『관리되는 마음』(국내에선 『감정노동』이란 제목) 출간 이후, 찬사도 많이 받았지만 혹독한 비판도 꽤 받았다. 사실 모든 연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만, 혹실드는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상의 부정적인 면에 갇힌 연구 대상자들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사람들로 대부분 그렸다. 『나를 빌려드립니다』 또한 그 아쉬움의 망에 갇혀 있다.
사실 기존 감정사회학자가 그녀의 연구를 비판할 때 나오는 견해, 그녀가 진정한 마음 대 진정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구도로 연구 대상을 양분해 바라보려는 것 또한 『나를 빌려드립니다』 에서 잔존하는 아쉬움이다. 혹실드는 시장의 불순함 대 사적 영역이 지켜야 할 순수함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것이 최신의 자본주의다'라는 인상을 주는 서사의 특색에만 힘을 쏟는다. 그러다보니, 신기방기한 서비스 직종을 알았다는 만족감만큼 그녀가 정작 하고 싶어하는 이 만족감 깨기라는 실천과 그 소산이 썩 훌륭하진 않다(이건 그녀에게 대안의 부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그리고 싶어하는 아웃소싱 자본주의의 첨단성, 그 맛만 맛있을 뿐 이 첨단성이란 환영을 무너뜨려야 할 그녀의 논리적 준비물이 허술하다는 뜻이다).
그녀는 감정사회학자 잭 바바렛이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연구를 빌어 비판했던 지점. 감정 노동에서 중요한 감정 관리라는 것이 왜 꼭 자본주의와만 긴밀한 것처럼 주장하는 걸까란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실드는 감정의 상업화라는 개념을 수호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꼭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권력과의 의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시장의 무적상태를 그려내는 것이 지극히 도덕적인 차원이라는 점도 그녀의 논지를 허술하게 만든다. '서비스' '계량화' '경영' '기업화'라는 그녀가 겨냥하는 용어는 다분히 도덕적인 정서로 설명되는 추상적인 용어일 뿐이다. 뭐라고 할까. 이런 용어들을 겨냥함으로써 뭔가 그녀는 예전부터 실컷 때려서 너덜너덜해진 급 낮은(?) 방어전 상대에만 집중해 과한 에너지를 쏟는 것 같다.
결국 시장의 불순함 대 사적 영역이 지켜야 할 순수함이라는 구도에서 그녀는, '가족이라면 옛부터 가족답게 할 일이 있는 거란다'라는 지점에 안주한다. 그녀가 친밀성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서비스 형태에 대해 그 서비스의 대상자인 대표격인 가족이 극복할 수 있는 지점으로 전통 지향적인 면을 제시하는 건 아이러니하다. 감정사회학자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감정사회학의 한계 중 하나로 보수적 사회과학이 지향했던 세계관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다는 견해를 언급한 점 또한 곱씹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