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 원래 공부를 '독고다이'로 해온 편인데, 이번 학기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공부의 열의가 있는 사람들끼리 '감정사회학'이라는 테마로 모임을 가져볼까 생각 중이다. 사실 김홍중 선생의 책 <마음의 사회학>을 읽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이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나는 이것이 매체 연구에서의 어떤 전환을 야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물론 내 소견이다)
가령, 미디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그 매체를 활용한 사람들이 이런 효과를 얻었다더라,수준에 머무르거나(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론을 이용과 충족 연구라고 한다.국내에서는 1980년대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언론학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좋아라한다) 문화연구의 시선 처리를 배운 게 그나마 수용자의 능동적 해독방식 정도이다( 1990년대부터 미디어 연구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의 절충안으로서, 그나마 더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포장만 번지르르할 뿐.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
난 차라리 일정한 매체의 수용 과정에서 나오는 사랑, 기쁨, 미움, 속물, 진정성 등등 그런 다양한 감정들 하나, 하나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가령 내 졸업논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비디오 시대의 영화광들을 둘러싼 담론에는 속물과 진정성의 대립이 포진되어 있다. (그랬을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과연 영화를 속물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 이 과정은 내 만두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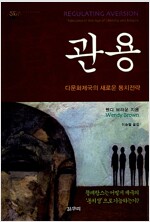



감정의 상품화라는 테마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이 테마에 대해 벌써 식상해져가는 이 학문 소비자들이 두렵다!) 나는 통치성론과 좀 다른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래쉬가 '치료국가'라고 불렀던 개념을 더 깊게 팔 생각이다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에, 나는 래쉬의 치료국가론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의 '문화'와 도덕주의 그리고 정신의 관계가 어떻게 가정에 개입하였는가,의 문제. 특히 문화 소비와 관련하여, 국가와 여성의 도덕주의적 접점이 만들어지는 데 개입한, 지식을 활용하는 연구소들의 담론, 그 문제점을 짚는 작업을 했다)


크리스토퍼 래쉬를 공부하다 보면, 필립 리예프를 알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다시 앤서니 기든스와 지그문트 바우만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시선에서 문화를 진공상태로 만들지 않기다. 에바 일루즈가 말한 것 처럼, 문화 내부의 논리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차원. 그 차원에서 보다 우리를 복잡미묘하게 만드는 감정과 지식, 감정과 경제, 감정과 문화. 이것을 보다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보고 싶다. 무엇보다 나는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미디어/문화연구의 획기적인 기획을 꿈꾸면서, 내 무기를 단련시켜보고자 한다. 이게 내 이번 학기 목표가 아닐까 한다(졸업을 앞두고 이 무슨 짓인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