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에 시간이 나서 어제와 그제 연속해서 알라딘 출간 이벤트를 다녀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놀랐다.
사실 이런 출간 이벤트를 참석해보면 반반이다.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별로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세미나라는 멋진 포장으로 출간 이벤트를 하니, 뭘 좀 얻어가기 위해 참여하는 참여자가 많은 것 같다. 본질은 책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인데, 세미나라는 거창한 이름. 이 같은 사실을 저번 달 김명민 선생께서 아주 멋지게 폭로해 주셨지만...ㅎㅎ
사실 저번달 공부론의 저자 김명민 선생의 강의는 실망 자체였다. 준비를 별로 안하신 거 같아,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드니, 다음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셨다. '이런 자리는 책 팔아먹는 자리라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은 공부론 세미나의 실체였다. 그래서 난 담주 계속된 2부를 기꺼이 참석하지 않았더랬다.
흠, 요즘 인터넷 서점의 대세인 세미나가 저자 출간 기념회란 말이지...라는 정체를 안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이런 류의 세미나에 더 참가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제, 그러니까 18일 목요일에 철학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레비나스 세니마는 '출간 이벤트'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일명 '대박' 강좌였다. 젊은 강사분이 어찌 그리도 알고 싶었던 부분을 잘도 짚어주시는지..아마도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던 참석자들은 모두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강의였다.
물론 적은 시간(한 시간 정도)에 중요한 철학자의 핵심 사상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청자가 듣기에 무척 성공적인 강의였던 것 같다. 레비나스가 그의 전 생애를 걸고 하이데거 철학에 맞서 싸웠다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실로 중요한 정보였다.
어쨌든, 레비나스 세미나는 강사의 준비가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지 강의 속에서 그대로 전달되어 졌다. 그 정도의 강의를 무료로 들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말미에 질문했던 레비나스의 '물질성'에 대한 개념도 쉽게 정리해 줘서 고민이 샥 가셨다~(이 후기는 조만간 올려야 겠다) 앞으로 2, 3, 4강의가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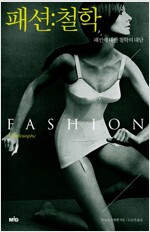
이런 좋은 느낌으로 다음날인 19일 금요일날 참석하게 된 <패션:철학>출간 세미나. 어제의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기대로 이어졌다. 홍대 카톨릭회관 CY시어터 에서 7시에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오프닝 격으로 재즈 기타 라이브 음악도 들려줬다. 장소가 홍대라서 그런지 연인들이 무척 많이 참석했고, 남성들도 꽤 보였다. 그리고 이어진 도승연 강사의 세미나..
1시간 정도 진행된 도승연 강사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말을 어찌나 잘하시는 지 막힘 없는 강의는 파워포인트 시각 정보들과 함께 청중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잘 전달했다. 하지만 역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패션 경향을 덧붙여서 저자가 지나친 우리만의 한국적 상황을 소개해 주었다.
역자인 도승연 교수가 준비를 어찌나 철저히 했는지 파워포인트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책을 사지는 않았지만 서점에서 대충 훑어 보고 갔는데, 강의 내용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해 전달해 주고 있었다. 패션과 언어, 패션과 육체와의 관계, 패션과 예술 그리고 패션과 소비는 이 책의 핵심인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도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패션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 스타의 이미지를 따라가지 말고 패션에 있어서 진정한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다는 도교수의 전언이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강의였지만, 책에 담겨있는 핵심이 붕 떠 있어 패션이 과연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역자는 패션의 탄생을 근대의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보고 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담는 패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곧 타인이란다. 그도그럴것이 무인도에서 아무리 옷을 잘 입어봤자 그건 패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도교수의 논리.
패션은 타인을 전제한다. 타인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의복일 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바라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과연 내 스스로의 순수한 바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은 내 바람이 아니라 타인의 바람 아닐까? 메시즌 이렇게 입으라고 강요하는 미디어의 세뇌를 그냥 내식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을까?
패션이 철학이 되려면 이 문제에 답하여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패션은 근대의 개인의 탄생을 그 시초로 보기 때문이다. 사회가 강요한 시스템의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것. 그럴려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있어야 하는데, 패션이 과연 주체적인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의 지적대로 패션은 '욕망(더 정확히는 욕구)'이기 때문이다. 끝임없이 원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이기에.
패션이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패션이 순수한 내 욕구의 표출이라면(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철학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될 듯도 하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직 철학자들의 단편적인 패션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책을 사지 않은 건 순전히 이 때문이고...도승연 역자도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 걸로 봐서 책의 약점인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뭐, "아담스미스는 패션의 문제를 저술의 형식으로 다루었던 최초의 철학자이다"(p23)라는 정보를 요하는 분들한테는 추천~
어쨌든 유익한 강의였다~ 이런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석한 청중을 위해 하나라도 더 줄려고 노력하는 강사분들에게 박수를~ ^_____^